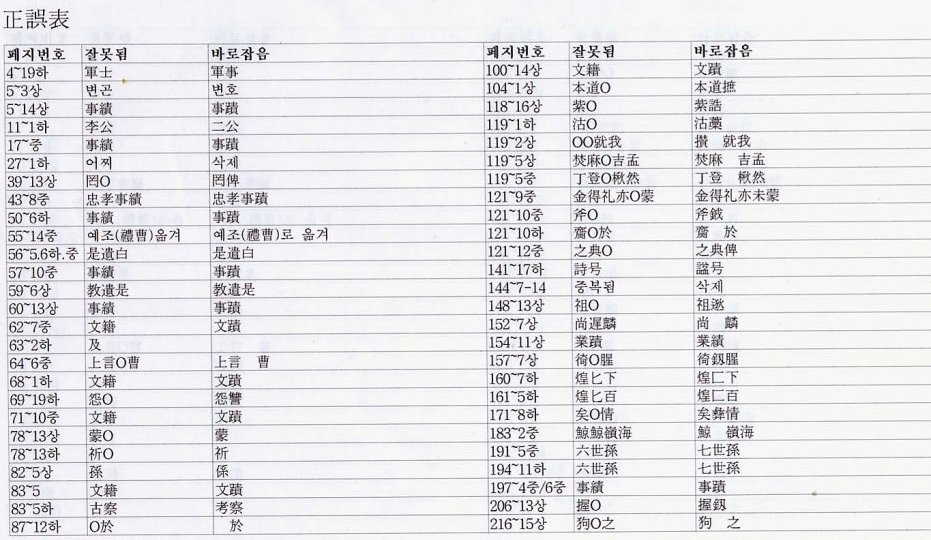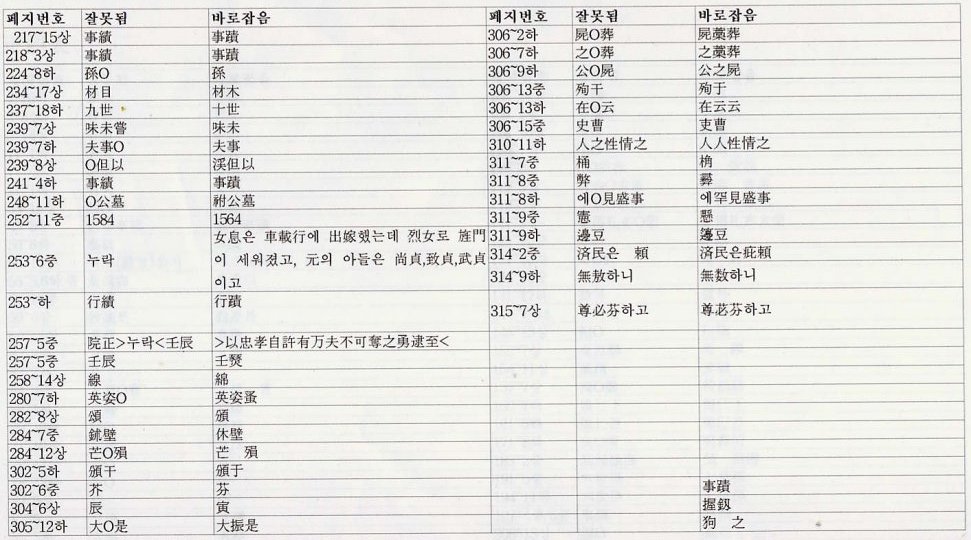충효실록 번역문 읽기
2쪽)
<풀이>
<머릿글 -1>
대저 백성과 사대부의 충효를 실천할려는 기풍을, 평소 나라가 무사할 때 북돋우고 진작 시켜, 갑자기 국가가 난세를 당했을 때 그 성과를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하는일은, 국가의 보존을 위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책무이다.
태조(太祖)가 건국한 이래로, 충효(忠效)로서 잘 교도하고 격려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나라의 군주를 섬기는 의리를 알고, 사대부(士大夫)들이 나라와 군왕(君王)을 위하여 신명을 받치는 충의의 귀중함을 알게된 것은, 평소에 그것을 배양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朝鮮) 선조(宣祖) 25년(1592년 인진년)에 섬 오랑캐가 침입 하여 날뛸 때에는, 조정과 백성들은 태평한 세월을 지나온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을 모르고, 사대부와 군사(軍士)들은 군대를 지휘 하는 군사전력을 몰랐으며, 조정 또한 전승(戰勝)을 위하여 대비하는 노고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고사(故事)에 나오는 항우(項羽)가 진군(秦軍)을 무찌른 생각을 못하여,
어느날 하루 아침에 돌연히 왜적이 침범을 당하여서는, 우리의 백성들은 마치 새가 놀래어 날아 가고 짐승이 숨으려고 도망치듯 흩어졌으니, 그 형세가 그렇게 된 것은 아무런 준비없이 당한 당연한 결과였다.
여러 곳의 성읍(城邑)들이 연달아 무너져 군사(軍士)들은 달아 나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였으며, 임금이 탄 수레가 서울을 떠나 피란 길에 올라서 어가(御駕)를 호위하는 군사(軍士)들이 서(西)쪽으로 나아감에 이르러서는, 온 나라가 겁(劫)에 질려 어찌할바를 몰랐으니 이때야말로 국가를 보존하느냐? 패망하느냐? 하는 질실로 위급한 때라고 할 것 이었다.
적군에 패하여 세력이 꺽인 병졸(兵卒)들이었지만 그래도 끝내 조국을 배반(背叛)할 뜻이 없었고, 충성스러운 지사(志士)들은 멀리 도성(都城) 밖에서 일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으니,
그 당시에 망우당(忘憂堂) 곽 재우(郭再佑), 중봉(重峯) 조헌(趙憲) 과 같이 병란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켜 적군을 쳐부수기도 하고, 건재(健齋) 김 천일(金千鎰),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 과 같이 목숨을 바쳐 대의를 지킨 의병장(義兵將) 및 의사(義士)들이 있었으며, 훈련원 첨정(訓鍊院 僉正)을 지낸 박공(朴公) 언복(彦福)과 그의 아들 훈련원 정(訓鍊院 正) 인립 공(仁立 公)의 양대(兩代)와 같이 충성(忠誠)과 효성(孝誠)으로 순국(殉國)한 의사(義士)도 있었다.
대개 공(公)의 시대를 회상해보면 국가의 명령이 왜적의 침입으로 잘 시행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고, 군사들은 무장할 병기가 없어 쓸모없는 젊은이에 불과했으며, 전략상의 계책도 실제로 시행하는데 잘 맞지 않아, 근본적으로 군사행동(軍事行動)에 활용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박공(朴公) 부자(父子)는 충성(忠誠)스런 지조를 바꾸지 않고, 신명(身命)을 나라위해 버리기를 마치 헌 신짝을 벗어 버리듯 하였으니,
그 충성과 대의를 위하는 붉은 마음은, 한(漢)나라의 첨상(瞻尙)과 진(晋)나라의 변호(卞壺)와 더불어 전후(前後)가 동일한 수레바퀴의 자국처럼 꼭
들어 맞았다. 명성(名聲)과 충절(忠節)은 마땅히 천하에 드날리고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빛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었으니, 앞에 말한 사기((士氣)를 평소 무사할 때 배양하여 그 공효를 난세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어찌 허황된다고 불신하겠는냐?
공(公)의 공적이 국가의 사책(史冊)과 민간에서 엮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세상에 유행된지가 오래되었으나, 다만 그 실적이 빠져서 미비된 것이 오히려 많으며, 지금 세상은 재앙을 만나 도의(道義)가 날로 쇠퇴되어지고 있다.
공(公)의 후손인 기태(基泰), 병근(炳瑾) 씨등이 선대사적(先代事蹟)이 오랜 세월로 없어져 버릴까? 걱정하여 이 책을 중간(重刊) 하기로 하고 나에게 서문을 써 주도록 부탁하였다.
나는 본래 서문을 쓸만한 귀중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감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만한 능력은 없고, 다만 평소에 어른들과 사우(師友)에게 들은바를 순차에 따라 기록하였다.
뒤에 이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필시(必是) 나와 같은 장탄식(長嘆息)과 경모(敬慕)하는 마음이 우러날 것이리라.
임인년 4월 상순(壬寅年 四月 上旬)
통훈대부 행 홍문관 지제고 밀성 박해철 근서(通訓大夫 行 弘文館 知製誥 密城 朴海徹 謹序)
* 주(註) 곽 망우(郭 忘憂) ---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義兵將) 곽 재우(郭 再祐)의 별명인 듯.
* 편집자 주(註) : 박해철(朴海徹) --창초공 해철(滄楚公 海徹) [1868년(高宗5,戌辰) ~ 1934(甲戌)]은 정국군 위(靖國君 葳)의 16대손 이다. 1892년(高宗29, 壬辰)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홍문관 시독(弘文館 侍讀)이 되었을 때 국망(國亡)으로 귀향(歸鄕)하여 추선목조(追先睦旐)하고 주혈빈궁 하였으며, 1927년(丁卯)에 밀양시 무안면에 경덕당(景德堂)과 만운재( 萬雲齋)를 창건(創建)하였다.<박해철 영정>
8쪽)
<풀이>
<머릿글 -2>
옛부터 국가가 환난을 당했을때는 세대를 뛰어넘어 천지기운을 특별히 받은 호걸(豪傑)이 반드시 태어나게 된다. 그 시대에 응하여 일어나서 국가를 내외의 적으로부터 방위하고, 만약 적의 세력을 꺾고 적진을 함락 시킬만한 형세가 되지 못할 때에는, 적군의 창끝과 화살촉 아래 신명을 버려서 국가에 대한 충절(忠節)을 나타내는 충의지사(忠義之士)가 되어 활약하는 사람이 한 둘일까마는, 부자(父子)가 함께 목숨을 바쳐 의병(義兵)을 일으켜 명성을 천하에 드러낸 사람에 이르러서는, 지나간 역사에 그 짝이 될만한 사람을 찾아 보내기가 드물고, 더구나 국가의 변란(變亂)을 당하여 이러한 책무를 완수한 사람은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선조(先祖) 임금의 성대(盛代)에 이르러서는 국내가 평안 하고 조용하여 기쁘게 생활 할 뿐이고, 불의의 환란(患亂)에 대한 방비책이 없었는데, 졸연(猝然)히 섬나라 오랑캐가 침범하여 국경일대에 적군이 가득차니, 각 요새지의 성곽을 지키던 군사들은 왜적의 풍문만 듣고도 싸우지 않고 모두 놀라서 흩어져 달아나니, 국가존망의 운세가 마치 포개어 쌓아 올린 새알과 같이 매우 위험한 시기였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에 학산박공(鶴山朴公) 언복은(彦福) 문장(文章)과 무용(武勇)을 겸비한 인물로서 의분에 북바쳐 뜻을 떨쳐 일어나,
그의 아들 인립공(仁立公)과 더불어 전란을 피하고자 도망하여 숨는 인사들을 타이르고 불러모아 동지로서 결의하여, 의병을 일으킬 굳은 맹서를 하고 장차 화산군(花山君) 권공(權公) 에게로 가서, 서(西)쪽으로 피난 하신 왕의 어가(御駕)를 돌아 오시게 하고 동해상(東海上)에 자욱하게 덮인 요악 스러운 침략자의 기세를 소탕하는 일을 손꼽아 그날을 기약 할수 있을 듯 하였는데, 불의에 소등교(所等橋)에서 적병을 만났다
전력을 다하여 용감히 싸워 적병 수십백인을 무찔렀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순국(殉國)하였다
그의 아들 인립(仁立)이 시신(屍身)을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임시로 매장하고는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를 갈고 피를 내뿜으면서 부공(父公)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하늘을 머리위에 이고 땅을 밟으면서 살수가 없다고 맹서하고 외치면서 적진에 돌격하여 무수히 적병을 찔러 죽였으나,
자신도 삼십여소의 부상을 입어 부공(父公)이 전사한 바와 같이 마침내 또한 순국(殉國)하였다
아 ! 슬프다 !
아비는 나라와 군왕(君王)을 위하여 전사하고 자식은 부공(父公)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니 어찌 장렬하다고 아니할수 있겠느냐? 참으로 고금천지(古今天地)에 드문 한쌍의 고귀한 정신이라 하겠다.
왜란(倭亂)이 평정된 후에 그 지방의 유생(儒生들과 관장(官場)이 서로 이끌고 앞장서 장렬한 행적을 대궐(大闕)에 호소하였더니, 성상(聖上)께서 애도(哀悼)하셔서 부자에게 나란히 정경(正卿)을 증직(贈職)하여, 그 충효(忠孝)를 포창(褒彰)하였으며, 이어서 여러사람의 공론이 크게 일어나,
부자양공(父子兩公)의 위패(爲牌)를 우뚝 솟은 헌산(獻山) 아래의 반곡(盤谷) 사당(祠堂)에 편안히 모시게 되었으니, 사후의 빛나는 영광을 어찌 모두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일전에 공의 후손인 병근(炳瑾) 씨가 그의 조선유적(先祖遺蹟)을 적은 문적(文籍)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면서 서문(序文)을 청하여 말하기를, 우리 선조의 숭고한 공훈과 지극한 효성은 임진공신록(壬辰功臣錄) 및 학성주지(鶴城州誌) 에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발간한 충효록(忠孝錄)에는 아직도 미비한 곳이 있으므로 이제 다시 중간(重刊)할 것을 도모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도록 하고자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 효성이 놀라와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 말하기를, "시전(詩傳)에 효자(孝子)가 대대로 끊어지지 않으니 영원히 그들에게 복록을 주리로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대의 말을 들으니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공(二公)의 의연한 공훈은 임금을 보좌 하는 어진 신하, 이름난 공경(公卿), 큰 선비들이 그에게 합당한 모든 사실을 두루 모아서 명백히 밝혀내지 않음이 없고 공적을 드러내는데 남김이 없으니, 어찌 나같은 견문이 천박(淺薄)한 사람을 기다리겠는가?고 하였으나, 인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니 나의 선조이신 회암공(悔巖公)께서도 또한 동시대에 의병(義兵)을 일으키셨는데, 성현(星峴)의 전역(戰役)에서 순국(殉國) 하셨다.
그 분들이 재세(在世) 하셨을 때의 교분을 끝내 저 버릴 수가 없기에 눈물을 거두고 그 대강을 기록하여 후손들에 대한 책무를 면할까 한다.
만력(萬曆) 순국후(殉國後) 341년 임신(壬信-1932년) 상원일(上元日)
○천(○川) 박종하(朴鍾河) 근서(謹序) <○자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쪽
)
<풀이>
<옛 서문>
내가 일찍이 우리나라 임진왜변사(壬辰倭變史)에 기록되어있는 조 중봉 헌(趙 重峯 憲), 고 제봉 경명(高 霽峯 敬命)같은 현사들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적(事蹟)을 볼 때마다 무릎을 쳐서 탄식하고 눈물을 머금지 않을수 없었다. 그 분들에게 존경의 정을 표시 하기 위하여 말고삐를 잡고 뫼시고자 하지마는 이 또한 할수 없는 일이어서 다만 존숭(尊崇)하는 마음만을 바칠뿐 이었다.
어느날 경주부(慶州府) 사람으로 무과 출신인 박군 한혁(漢赫)이, 그 선조 증 병조판서 휘 언복(贈 兵曹判書 諱 彦福)의 유고(遺稿) 약간편(若干篇)과 본가에 소장 되어있는 문자 수삼장(數三張)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우리 선조의 한결같은 순수한 충성(忠誠)과 높은 절개는 가위 일월과 그 광채를 다 툴만한 공업으로써 그 일을 들어본 사람은 백세가 지난 후라도 어느 누가 분발 하지 않으리요마는 자손들이 도읍(都邑)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窮僻)한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적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는데 미진 한데가 있었고, 못난 이 몸 또한 국가를 지키는 군무를 맡고 있음을 핑계삼아 조상 위하는 사업을 게을리하여 고인이 남기신 원고(原稿)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더러운 티끌 속에 파묻히고 좀벌레의 갉아 먹는바가 되도록 수습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마에 식은 땀이 흐르지 않겠으며 가슴속 깊이 울음을 삼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에 정성을 모아 비용을 거두고 출판할 자료를 수집하여 장차 판목(板木)에 새기고자 하오니 서문(序文)을 써주면 다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수편의 문장(文章)을 읽어보니 문장에 표현된 말들이 뛰어나고 아름다워 기이한 기품이 있어 가히 그의 인품을 알수 있었다. 마침내 뜻을 떨쳐 일으켜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는 시문(詩文)의 대가가 아니므로 그 문장의 우열 여부를 말할 수 없지마는 충의(忠義)를 앙모(仰慕)하는 마음은 무궁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흉중(胸中)을 뭉클하게 하니, 감히 그 공(功)을 받들지 않을수 있겠느냐?
인하여 삼가 살펴 보니 공(公)의 집안은 울산의 세족이고, 유시로부터 학문을 닦았으며 정의로운 일을 보면 몸을 돌보지 않고 분발하니 세상사람들이 기개(氣慨)와 절조(節操)있는 사람이라고 일컫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 때 임진왜란을 당하여서는 전국(全國)이 무너지고 만백성이 사방으로 바람에 날리듯 흩어졌는데, 공(公)은 그의 아들 인립(仁立) 및 동향의 전판관 김득례(前 判官 金得禮) 등과 더불어 의병(義兵)을 일으킬 것을 꾀하여 수백인을 불러 모으고 장차 큰 진영으로 달려갈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본 고을 소등대교(所等大橋) 아래서 적병(賊兵)을 만나게 되었다. 아들을 돌아보고 "이곳이 나의 죽을 곳이다" 하고는 몸을 솟구쳐 단독으로 돌격하여 수백이나 되는 많은 적군을 쳐서 죽이기도 하였으나, 힘이 다하고 세력이 꺽이어 끝내 적의 유탄(流彈)에 맞아 전사(戰死)하였다.
아들 인립(인립)은 그 시신(屍身)을 곧 수습(收拾)하여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이 간략하게 서둘러 임시로 장사(葬事) 지내고 분연히 복수할 결심을 하였다. 익일(翌日)에 그 또한 적진에 달려 들어가 많은 적의 목을 베었으나, 자신도 또한 삼십여 곳이나 부상하여 마침내 부공(父公)이 전사(戰死)한 뒤를 이어 순절(殉節)하였으니, 아아! 장렬하도다! 부공(父公)의 충성(忠誠)과 자식의 효성(孝誠)은 충효(忠孝) 두 가지를 모두 극진(極盡)히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김득례(金得禮) 또한 우리 3인은 생사를 함께 하자고 결의 하였는데, 이미 저 부자(父子)가 목숨을 함께 바쳤으니 내 어찌 차마 홀로 살겠느냐?
하고 달려가 적진에 돌격하여 많은 적을 죽이고 생포 하였으며,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 또한 순국(殉國)하여 공(公)과 함께 충절(充節)을 다하였으니, 이 또한 공(公)이 평소에 지조 높은 선비를 잘 얻을만큼 덕망(德望)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으냐?
아아! 당시에 충절(忠節)로 죽은 사람이 무슨 원통한 일이 있을까마는, 절개(節槪) 곧은 충성(忠誠)과 순수(純粹)한 효성(孝誠)이 공(公)의 부자(父子)만한 분은 드문 일이니, 끝내 그 사적(事蹟)과 칭송(稱頌)이 없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므로 영남의 유생(儒生)들이 공의 사당(祠堂)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조정에 상소(上訴)하기를 몇 차례나 하여, 마침내 공적을 표창하고 증직(贈職)을 내리는 특별한 은전(恩典)을 입게 되어 백세토록 세상을 교화(敎化) 하고 세인의 이목에 환하게 비추게 하여 충효(忠孝)를 깨우치게 하였다.
오늘날에 있어서 시문(詩文)을 짓는 재능같은 것은 공((公)에 있어서는 여가에 하는 일일 뿐이니, 진실로 공(公)의 명성에 손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공의 자손들이 남아있는 글들을 수습간행하여 세상에 널리 펴는 일 또한 어찌 그만둘수 있겠느냐? 내가 그 뜻을 가상(嘉尙)히 여겨서 그 사실을 적고 또한 노래를 지어 찬양(讚揚) 하노라.
울주(蔚州)의 동(東)쪽이여
구름에 싸여 솟아있는
뛰어난 산이 높고도 높아
함부로 올라 갈수 없는 것은
공(公)의 숭고한 충절(忠節) 이라네!
울주(蔚州)의 남(南)쪽이여
강수가 질펀하여 유유(悠悠)히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조국을 위하여
큰 뜻을 다 펴지못한
공(公)의 여한(餘恨)이로다.
공(公)은 비록 저승으로 갔지마는
혼령의 어둡지 않음이여 !
유물을 어루만지고 추모하지만
그가 계신 곳을 알 수 없구나.
그의 시문(詩文)을 읽고 외우니
천세(千歲)라는 오랜세월이 흘러도
마치 의젓한 모습을 보는 것 같으리라.
숭정 기원후 4년(崇禎 紀元後 四年) 계해(癸亥-1863년) 계하하한(季夏下澣-유월하순)
보국숭록대부 겸 병조판서 홍문관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輔國崇祿大夫 兼 兵曹判書 弘文館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知成均館事)
안동(安東) 김병학(金炳學) 서(序)
卷之一(권지일)
25쪽)
<풀이>
<창의일기> - 의병을 모집할 당시의 나라 상황과 학산공(鶴山公) 당신의 심경을 소상하게 적은 일기.
만력 20년, 선조25년 임진 정월 초1일 <1592년>
아침에 하늘은 흐리고 광풍이 불어 일기가 사납고 심기가 불안 하여 금년의 형편이 어떨지 주역(周易)의 점괘(占卦)를 지어보니, 전체가 군사(軍師)를 일으키어 군병을 움직이는 상(象)이기에,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라서 이웃에 사는 김 판관(金 判官) 득례(得禮)와 함께 어찌하면 좋을지 토론을 하다가 날이 저무는줄도 몰랐으나, 끝내 어떤 판단을 내릴수가 없었고 이로부터,
이후(以後)는 김군(金君)과 더불어 활쏘고 말달리는 연습으로 일과(日課)를 삼았다.
2월초5일
새벽에 김군(金君) 득례(得禮)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 와서 손을 잡고 당황하여 말하기를, 『 어제 저녁때 남(南)쪽에서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요망스러운 말과 괴이(傀異)한 풍설(風說)이 말할수 없이 많은데, 남쪽 왜국(倭國)의 침입(侵入)이 조석의 사이에 박두(迫頭) 하다고 하는데,
길거리에 떠도는 말을 꼭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형(兄)의 원조(元朝)에 얻은 점괘(占卦)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음이 매우 당황(唐惶) 스럽습니다. 바라건데 그에 관한 필요한 대책을 모두 세우는 것이 어떨는지? 』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 『군왕의 신하가 된 자가 세상이 만약 어지러우면, 생명을 구차(苟且)히 바둥거리고 유지할려고, 분연(奮然)히 충의(忠義)를 위하여 일어나서 적군(敵軍)을 쳐부수려는 굳센 기개(氣慨)가 없겠느냐? 그대는 경망(輕妄)한 행동을 하지 말고 난세(亂世)의 변고(變故)를 막는 계책(計策)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고하였다.
4월13일
왜구(倭寇)가 갑작스럽게 처들어 와서 동래부성(東萊府城)이 함락(陷落)되고 여러 고을이 패전(敗戰) 하여 흩어지니 온 나라의 참담(慘澹)한 상황을 어찌 차마 말할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수천리의 지역과 산해(山海)가 견고 하지 않음이 아니요, 병사와 군장비(軍裝備) 갑옷이 부족한 것이 아니건마는,
저 왜적(倭賊)들로 하여금 마치 무인지경(無人之境), 아무도 없는 지역 같이 처들어오게 하였으니 이 나라에 쓸모있는 인물이 있다고 하겠느냐?
임금의 신하가 된자가 마땅히 죽어야 할 곳에 생명을 바쳐야 하니 죽음에 또한 무슨 원한이 있겠느냐?
백성들이 모두 도망치고 숨어 버려서 갑자기 거두어 모을 방책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통곡(慟哭)하여도 아무런 묘계(妙計)가 없었다
마침 그 때, 서 몽호(徐夢虎), 박 홍춘(朴弘春), 전 응충(全應忠)이 용사 약간명을 불러 모아 도착하니 용기가 거듭 일어나 넘쳐 흐르고
분연(奮然)히 솟구치는 적개심(敵慨心)이 백배(百倍) 하였다.
곧 김득례(金得禮)와 더불어 의논을 하여 용감하고 건장한 사람을 모으기로 하고, 남방(南坊)골에서 수백인을 얻었다. 아들 인립(仁立)으로하여금 군사들을 영솔(領率)하여, 곧바로 권응수(權應銖) 장군 진영(陣營)으로 향하게 하였는데 졸지(猝地)에 소등대교(所等大橋) 아래에서 적병(敵兵)을 만났다. 아들 인립(仁立)을 돌아 보고 말하기를
『우리집안은 대대(代代)로 나라에서 녹봉(祿俸)을 받아온 명문(名門)의 자손(子孫)이다. 나라가 어지러운 이 때 맹서(盟誓)코 적군(敵軍)과는 도저히 함께 살수 없으니, 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충의(忠義)를 다하는 것은, 신하(臣下)된 몸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오늘이야말로 내가 평소에 축적(蓄積)해 온 충절(忠節)을 발휘(發揮)할 때이다. 너는 경거망동(輕擧妄動)을 하지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처자식(妻子息)을 잘 보전(保全)하여 선조(先祖)의 뜻을 이어받고 제사(祭祀)를 잘 받들도록 하라. 』 하고는
몸을 솟구쳐 돌격(突擊) 하여 나가서 곧바로 적진(敵陣)을 향하여 크게 호령하기를
『작은 벌레 같은 왜놈 오랑캐들아! 속히 나와서 나의 충의(忠義)에 불타는 복수의 칼을 받아라! 나는 전첨정(前僉正) 박언복(朴彦福)이다.
너희들 같은 추악(醜惡)한 도적(盜賊)은 마치 모기나 등에와 같은 작은 벌레들로 본다. 』고 하고, 적진(敵陣)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 좌우(左右)로 찌르고 돌진(突進)하니, 마치 풀줄기를 베는 것 같았으며 수백의 많은 적군(敵軍)을 죽이니, 그 날래고 씩씩한 용기는 더욱 장해지고 사방을 마음대로 달렸다. <적군이 그 날랜 용맹을 보고 바야흐로 흩어져 도망칠려고 할 때>
홀연히 적의 총알을 맞아 즉시 운명(殞命)하니 진중(陣中)이 모두 실성(失聲)하도록 울부짖었다.
그 때 전응충(全應忠), 김흡(金洽), 박손(朴孫)이 병영(兵營)으로 향해 가다가 보니, 인립(仁立)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하늘에 호소하며 땅을 치고 울부짖고 있었다. 탄식(嘆息)하기를 더불어 적군을 무찌르는 일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한탄 하였더니,
뛰어난 충의(忠義)의 선비를 잃었다고 하고, 인립(仁立)으로 더불어 시체를 짚과 거적에 싸서 산 언덕에 임시로 매장을 하고는 병영(兵營)으로 달려갔는데 대천제하(大川堤下)에 이른 것이 곧 7월 11일이었다.
홀연(忽然)히 많은 적병(敵兵)들이 들판을 덮을 듯이 공격(攻擊)해 오는 것을 보고, 인립(仁立)이 삼의사(三義士)에게 말하기를,
『부공(父公)이 나라를 위하여 죽는것과 자식이 아비를 위하여 죽는 것, 곧 충(忠)과 효(孝)는 같은 일이다. 어제 대교(大橋)의 전투(戰鬪)에서 내 어찌 죽음을 겁냈겠느냐?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수습(收拾)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적군이 곧 어제의 적군이다 』 하고는 이어서 몸을 솟구쳐 날려 큰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 나는 어제 대교하(大橋下)에서 충절(忠節)을 위하여 목숨을 받친 사람의 아들이다. 신하(臣下)가 나라를 위하여 죽고 자식(子息)이 부모(父母)를 위하여 죽는 것은 인륜(人倫)의 큰 법도(法度)이다. 너희들은 비록 인륜을 모르는 적군들이나, 나라를 위하여 절개(節介)가 곧고 충성(忠誠)스러운 선비를 몰라보고 감히 죽였느냐? 부공(父公)은 신하(臣下)된 직분(職分)을 다하셨으니 내가 어찌 사람의 자식(子息)이 되어 자식된 직분(職分)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같은 적은 마땅히 모든 무리들을 남김없이 소탕(掃蕩)하고야 말겠다』하고
곧바로 적진에 처들어가 수백의 적을 무찔렀으나 ,자신도 삼십여 군대나 부상을 하여 끝내 순국(殉國)하니 , 전응충(全應忠), 김흡(金洽), 박손(朴孫)이 잇따라 돌진하여, 마침내 도적들은 마편방(馬鞭坊)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때는 선조 25년 7월 11일 이었다.
삼의사(三義士)가 인립(仁立)의 시신을 수습하니, 얼굴 모습은 살아 있는 것 같았고 두 눈은 감지 않았으며 손은 창을 놓지 않고 노기(怒氣)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로 의논하여 죽음을 슬퍼하는 조문(弔文)을 지어 장사(葬事)를 지내니, 그 문사(文辭)를 간략(簡略)히 말하면
『 아아! 슬프고도 장렬(壯烈)하도다! 생각하건데 공(公)의 부자(父子)는 어제 충의(忠義)로 순국(殉國)하고, 오늘은 효(孝)에죽었도다! 두손에 칼을 배어 들고 적군을 처부술 것을 땅에 맹서(盟誓)하며 하늘에 호소(呼訴)하니, 엄숙(嚴肅)하고 용감한 기개(氣慨)는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고 빛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익일(翌日) 삼의사(三義士)가 함께 병영(兵營)에 가서 박인립(朴仁立) 부자(父子)가 적군(敵軍)을 공격하다가 적진(敵陣)에서 전사(戰死)한 상황을 두루 알리니, 장희춘(蔣希春), 윤홍명(尹弘鳴), 류정(柳汀), 이응춘(李應春), 서인충(徐仁忠)등이 듣고 탄복하기를 『우리향토의 의사(義士)가 얼마나 많은가? 』하였고 류백춘(柳伯春), 이눌 (李訥) 등도 또한 탄복칭찬하고 초유사(招諭使)에게 다시 보고(報告)하였다. (끝)
<원문>
朴彦福 壬辰 其子 仁立 糾合義士 誓死討賊 猝遇賊於所等橋邊 累獲戰功 竟爲 賊砲所中而死 追錄 宣武原從三等 官至訓鍊院 僉正
박언복 임진 기자 인립 규합의사 서사토적 졸우적어소등교변 누획전공 경위 적포소중이사 추록 선무원종삼등 관지훈련원 첨정
朴仁立 彦福之子 其父戰死之 翌日 挺湮赴賊呼曰 臣死國 子死父 人倫之大節 斬賊數百亦赴陣而死 追錄 宣武原從一等 官至訓鍊院 正
박인립 언복지자 기부전사지 익일 정인부적호왈 신사국 자사부 인륜지대절 참적수백역부진이사 추록 선무원종일등 관지훈련원 정
31쪽)
<풀이>
학성지충의편
박언복(朴彦福)이 임진(壬辰)년에 그의 아들 인립과 더불어 의사(義士)들을 함께 불러 모으고 단결시켜 적군을 쳐서 멸망 시킬 것을 목숨을 걸고 맹서 하였다. 갑자기 적군을 소등교(所等橋) 부근에서 만나 여러번 전공을 세웠으나 마침내 적의 총탄에 맞아서 전사 하였으므로, 선무원종3등(宣武原從三等)에 추가기록(追加記錄) 되고 관등(官等)은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박인립(朴仁立)은 언복(彦福)의 아들인데, 부공(父公)이 전사한 익일(翌日)에 칼을 빼어들고 적진에 달려가 외치기를"신하(臣下)가 나라를 위해 죽고 자식이 아비를 위해 죽는 것은 인륜의 큰 법도라" 하고 적군을 수백(數百)이나 베어 죽이고, 또한 적진에서 전사하였음으로 선무원종1등(宣武原從一等)에 추가기록(追加記錄) 되고 관등(官等)은 훈련원(訓鍊院) 정(正)에 이르렀다.
<원문>
正朴仁立等乙良宣武原從功臣一等(정박인립등을량선무원종공신일등)
主簿朴彦福等乙良宣武原從功臣三等(주부박언복등을량선무원종공신삼등)
33쪽)
<풀이>
정(正)인 박인립 등은 선무 원종공신 일등이다
주부(主簿) 박언복 등은 선무 원종공신 삼등이다
* 선무원종공신록에 기재되어 있는내용을 초(抄)한 것.
04-本孫 呈 本府狀(본손 정 본부장) <원문보기 ☞ 원문① l > top
35쪽)
<풀이> --본손(本孫)이 경주부(慶州府)에 올린 소장(疏狀)의 내용.
* 편집자 주(註) : 본손들이 양세(兩世) 의사(義士)의 충절과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나라에 증직(贈職)을 청원한 내용 입니다.
삼가 생각하오니 인간의 떳떳한 도리를 굳게 지키는 일에는 충성(忠誠)이 있고 효성(孝誠)이 있는데 부자가 함께 충효(忠孝)를 다한 일은 고금에 드문 일입니다. 이 때를 당하여 바야흐로 성상(聖上)의 빛나는 덕화를 듬뿍 입어 아름다운 좋은 일을 칭찬하고 원통한 일을 가엾게 여겨,
관직을 추증(追贈)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수백년 동안 내려오던 충의(忠義)의 장렬(壯烈)한 공적이 파묻힐 것을 근심하는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어, 그 공적을 밝게 드러내고 사후에라도 관직을 추증하고 있으나,
오직 저희들 선조(先祖) 고(故) 훈련원 첨정 휘 언복(訓鍊院 僉正 諱 彦福)과 기자(其者) 훈련원 정 인립(訓鍊院 正 仁立) 부자(父子)는 임란때 충효의 높은 지조와 기개가 있는 선비 었으나, 홀로 성상(聖上)의 성대한 특별한 은택(恩澤)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저희들은 북받치는 서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성주합하(城主閤下)께 아뢰니특별히 유의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선조 언복(焉福)은 밀성(密城)의 세족(世族)이며 국초(國初)의 의사(義士) 휘(諱) 승봉(承奉)의 후손으로 가정(嘉靖) 경술년(庚戌年-명종 5년 :1550년)에 태어 났습니다. 나이가 약관(弱冠)의 젊은 시절에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두루 읽어 통달하고 겸하여 용력이 과인 하여 말타고 활을 잘 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본부(本府)가 적의 침입하는 첫 길목이 되어서 이 고을 일대의 백성들은 머리를 나란히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해 되거나 도망쳐 숨어 버리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저희들의 선조는 대대로 국록을 받는 공신의 후손으로 분연히 궐기(蹶起)하여 의병(義兵)을 불러 모으고, 그의 아들 인립(仁立)과 함께 생명을 다 받쳐 싸울 것을 의병들과 맹서하고, 적의 형세를 항도에서 엿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천제방(大川堤防) 아래서 적의 기습을 임무로 하는 유격부대 수백명을 만나게 되어 활을 쏘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또한 소등대교에서 공격하여 오는 적을 방어하여 수백의 적군을 사살하고 크게 꾸짖으며 추격하다가 마침내 총탄에 맞아 장렬한 전사를 하니,
그의 아들 인립(仁立)은 시체를 끌어 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가매장(假埋葬)을 하고는 부공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것을 산천에 기약하고서,
곧 바로 몸을 적진에 날려 쳐들어 가서 수백 적군을 참살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또한 적의 창검에 찔린바 되었지만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고 부릅뜨니 늠름한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적의 괴수(魁首)가 그씩씩한 위엄에 압도 되어 감히 접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은 저희집 족보와 읍지(邑誌)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 아비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 전사하여 충효(忠孝)의 두 가지를 모두 온전히 실천하였으니, 저와같이 밝고 높이 빛나는 일은 그 당시 의병(義兵)을 일으킨 여러 현사(賢士)들에게서도 그 비길만한 분은 보기 드문일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집안이 누대(累代)에 걸쳐 후원자가 없이 외롭게 지내 왔으며, 성력(誠歷)이 천박(淺薄)하여 성상(聖上)의 교화가 골고루 널리 미치는 세상에서 아직도 충의로운 죽음을 애통히 여겨 증직가자(贈職加資)해 주시는 광영(光榮)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으니, 저 세상의 영혼과 현세에 살고있는 저희들의 깊은 한탄이 어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정성을 다하여 호소하오니 성상(聖上)께서 사자(死者)를 애도(哀悼)하시어 증직(贈職)하는 예전(禮典)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합하(閤下)께서 가엾음을 굽혀 살피시고 저희들의 억울한 정을 감영(監營)에 다시 보고하여, 성상(聖上)께서 들어 주실수 있도록 아뢰어 주시기를 엎드려 비옵고, 이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05-蔚山士林 呈 本府狀(울산사림 정 본부장)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 top
40쪽)
< 풀이>--- 울산지역 사림(士林)이 경주부에 올린 상소장(上疏狀)의 내용
* 숙종 24년[기묘(己卯)] 5월 일
* 편집자 주(註) : 1699년 5월에 울산지역 선비들이 언복(彦福) 부자(父子)에 대한을 포창(褒彰)을 하도록 상소한 내용 입니다.
엎드려 아뢰옵니다
성상(聖上)의 위대한 교화(敎化)가 밝게 빛나는 이때, 수백년 동안 충의(忠義)에 빛나는 공적(功績)이 그대로 방치 될 것을 근심하던 답답한 원통함을 밝혀내어 표창하는 광영을 입지 않음이 없는데, 본부(本府)(本府) 의사(義士) 전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 박언복(朴彦福)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의 공신(功臣)으로서, 그 가운데 부자(父子) 충효(忠孝)의 높은 절의는 홀로 아직도 성대한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떳떳한 인륜(人倫)이 굳게 지켜지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하여, 감히 이에 성주합하(城主閤下)에게 아뢰오니 밝게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절(忠節)에 목숨바친 신(臣) 언복(彦福)은 밀성(密城)의 명문족으로서 국초의사(國初義士) 휘(諱) 승봉(承奉)의 후손(後孫)입니다.
가정경술년(嘉靖庚戌年) 명종 6년(1550)에 출생하였는데, 그 분은 젊은 나이에 경서(經書) 사서(史書)등 많은 책을 널리 공부하였으며, 또한 용력이 남달리 뛰어나서 기마궁술(騎馬弓術)에 능하였습니다.
임진란(壬辰亂) 때는 본부(本府)가 적군(敵軍)이 침입하는 첫머리가 되어 사람들은 새 짐승이 놀라서 달아나 흩어지고 숨듯이 아무도 감히 적군(敵軍)에 맞서 예봉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언복(彦福)은 대대로 봉록(俸祿)을 받아 온 충신(忠臣)의 후손(後孫)으로서 충의(忠義)의 분기가 북바쳐 참지 못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그의 아들 인립(仁立)과 함께 사력을 다하여 적군(敵軍)을 처부술 것을 맹서(盟誓)하였습니다.
그 후 대천제(大川堤) 아래서 적의 유격부대 수백명을 갑자기 만나 몸을 날려 크게 꾸짖고 활을 쏘아 적을 공격하니, 그의 활시위 소리에 응하여 죽지 않는 자가없었고 또한 소등대교(所等大橋)에서 적군(敵軍)을 방어할 때 수백의 용감한 적의 기병이 돌격해오는 것을 사살하니 적이 흩어져 달아나므로 칼을 뽑아 추격하다가 드디어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戰死)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인립(仁立)은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하늘을 향해 원통함을 울부 짖다가 언덕에 가매장(假埋葬)을 하고, 아비의 원수를 기필코 갚을 것을 맹서(盟誓)하니 피눈물이 흐르고 손과 팔을 떨쳐서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곧바로 적진(敵陣)에 몸을 던져 수백여인의 목을 베었으나 자신도 또한 삼십여 곳에 부상을 하여, 마침내 적군(敵軍)의 창칼에 목숨을 잃었으나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고 오히려 늠름한 생기가 있어 적의 두목이 겁을 내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를 도망치게 했다고 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비는 전란에서 전사(戰死)하고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분전순사(奮戰殉死) 하였으니 부자(父子)의 죽음은 오직 나라를 위하는 같은 일일뿐입니다.
당시의 충절의사(忠節義士) 들은 거의 모두에게 관계(官階)를 올려 위로(慰勞) 하였으나, 언복(彦福) 부자(父子)에 이르러서는 그 충효(忠孝)의 절개가 높고 뛰어나며 또한 웅장하여, 저 중국 촉(蜀)나라의 ①제갈 첨(諸葛 瞻) 및 진(晉)의 ②변호(卞壺)와 더불어 그 뛰어난 충절(忠節)이 천세토록 빛남이 가히 짝할만한데, 홀로 충절(忠節)을 기리어 포창(褒彰)하고 순국(殉國)을 슬퍼하여 증직(贈職)을 내리는 은택을 입지 못하여 구천의 아래에서 한스러운 마음을 머금고 있을것이리니 그 누가 오늘날에 있어서 마음속에 깊이 느끼어 탄식(嘆息)하지 않겠습니까?
애석한바는 언복(彦福)의 후손(後孫)들이 외롭고 곤궁하여 아직도 그 선대의 곧은 충절(忠節)을 드러내어 높이지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호소를 우러러 올림은 언복(彦福)의 후손(後孫)들의 형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언복(彦福) 부자(父子)의 충효대절(忠孝大節)을 드러내는 일이요, 또한 언복(彦福) 부자(父子)의 충효대절(忠孝大節)의 포창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성상(聖上)의 밝으심이 국가에 이바지한 선비의 공훈을 드러내 줌으로써 충성(忠誠)을 장려하는 은전(恩典)이 아직도 빠진 것이 있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오니, ③ 당나라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의 충절(忠節)은 반드시 ④한창려(韓昌黎)를 기린 후에 드러났고 ⑤안진경(顔眞卿)을 받드는 사당은 ⑥매계(梅溪) 왕 십붕(王十朋)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 되었습니다.
언복(彦福) 부자(父子)에 대한 충절을 포창(褒彰)하는 일이 오늘날 합하(閤下)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어찌 알겠습니까? 합아(閤下)의 문장과 도의는 또한 오늘날의 창려(昌黎와 )매계(梅溪)입니다.
업드려 비오니 언복(彦福) 부자(父子)의 충효사적(忠孝事蹟)을 세세히 살피시어 그 공을 낱낱이 사실에 의거 하여 밝히시고, 빠짐없이 감영(監營)에 보고 하여 성상(聖上)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아뢰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빛나는 공훈을 드러내도록 하여, 왕씨(王氏)와 한씨(韓氏)만이 지난날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는 칭송을 듣지 말게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주(註) : ①제갈 첨(諸葛 瞻) - 중국 촉한 때 제갈 량의 아들. 관(官)은 도호위장군(都護衛將軍), 평상서(平尙書) 위(魏)의 항복권유를 거절하고 면죽 (綿竹)에서 전사하였으며, 그 장자 상(尙)도 함께 순절하였음.
②변호(卞壺) - 중국 진대(晉代) 변씨 6룡(卞氏六龍)이라 불이우던 명사 중의 한 사람인 수(粹)의 아들. 소준(蘇俊)의 반란 때 협력을 거부하 고 반군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그 아들 진(畛)과 우(吘)도 함께 순절하였음.
③순원(巡遠) - 안록산(安祿山)의 반란 때 순국한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④한창려(韓昌黎) - 한유(韓愈), 자(字)는 퇴지(退之). 중당(中唐)의 대문호(大文豪), 당송 8대가중(唐送八大家)의 한사람, 창려 선생(昌黎 先生)으로 숭앙 됨. 한 창려 집(韓 昌黎 集) 50권이 있음. 안록산의 난 때 장순(張巡)이 수양태수(首陽太守) 허원(許遠)과 더불어 수 개월 동안 성을 고수하다가 순국한 사실을 찬양하여 더욱 빛나게 하였음.
⑤진경(顔眞卿) - 당(唐)의 충신이며 서도(書道)의 대가인 안진경(顔眞卿). 현종(현종) 때 태원태수(太原太守)가 되어 안록산의 난을 평정하 는데 전공을 세웠고 이 희열(李熙烈)의 반란 때 이를 초유하다가 피살되었음. 노국군공(魯國郡公)으로 봉작되었음. 안노공집(顔魯公集)이 있음.
⑥매계(梅溪) - 송(宋)의 왕십붕(王十朋)의 호. 태자첨사(太子詹事), 용도각 학사(龍圖閣 學士), 매계집(梅溪集)이 있음.
06-蔚山士林 再 本府狀(울산(蔚山)사림(士林) 재 본부(本府)장) <원문보기☞ 원문① > top
* 편집자 주(註) : 1699년 5월에 울산(蔚山)지역 선비들이 언복(彦福) 부자(父子)에 대한을 포창(褒彰)을 하도록 상소한 이후
두 번째로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원문에는 상소자 성명만 보입니다.
07-蔚山士林 三 本府狀(울산(蔚山)사림(士林) 삼 본부(本府)장) <원문보기☞ 06과 동일 원문① > top
* 편집자 주(註) : 울산(蔚山)지역 선비들이 언복(彦福) 부자(父子)에 대한을 포창(褒彰)을 하도록 두 번째로 상소를 한 후 세 번째 같은 내용의 상소 를 올렸습니다. 원문에는 상소자 성명만 보입니다.
08-本孫 擊錚時 上言(본손 격쟁시 상언)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 top
47쪽)
< 풀이>---본손(本孫)들이 순조 31년(임진-壬辰) 9월 일에 능(陵)에 거동(擧動) 하실 때 길목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소연한 말. 본손 사익(思翼)
* 편집자 주(註) : 임진왜란 당시의 울산(蔚山)지방 의사(義士)들은 거개가 관직(官職)과 품계(品階)가 올랐으나, 언복(彦福) 부자(父子) 만이 빠졌음 을 임금에게 직접 상언한 내용입니다.<1832년 9월>
삼가 아뢰옵니다.
감히 절실한 사정을 호소하여 번거롭게 아뢰옴은 분수에 넘치는 일인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성(忠誠)을 굳게 지키는 절개를 숭상하고 장려하는 일은 국가의 성대한 은전(恩典)이옵고 조선(祖先)의 충절(忠節)을 높이 드러내는 것은 자손의 변함없는 간곡한 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밝으신 성상(聖上)의 크신 덕화가 빛나는 세상에 조정에 서는 충절(忠節)을 칭찬하고, 그의 죽음을 가엾게 여겨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을 베풀어 주시고, 그중에 혹시 빠져서 수백년지난 충의(忠義) 업적이 묻혀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밝혀 내어 추가로 높이 포창(褒彰)하고 있습니다.
신(臣)의 6대조 고(故)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 신(臣) 언복(彦福)과, 5대조 훈련원(訓鍊院) 정(正) 신(臣) 인립(仁立)은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아온 밀성(密城)의 명문족으로 국조초(國朝初) 의사(義士) 승봉(承奉)의 후예(後裔)입니다.
임진년 섬 오랑캐의 난리때 부자(父子) 충효(忠孝)의 의절(義節)은 아직도 국가 포상(褒賞)의 빛나는 은전(恩典)을 홀로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臣)은 외람(猥濫)되게도 억울하여 가슴속에 북바쳐 흐느끼는 심정을 감당 할수 없어, 분수를 모르는 죄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성상(聖上)의 수레가 지나 가는 길앞에 호소 하오니, 성상(聖上)의 밝으신 덕으로 자세히 살펴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신(臣)의 6대조는 가정 경술년 명종오년(嘉靖 庚戌年 明宗五年-1550)에 출생하였고, 약관에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두루 공부하였으며 겸하여 남다른 용력이 있어 기마(騎馬)와 궁술(弓術)에 능하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울산(蔚山) 땅은 불행히도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여 본읍이 적군(敵軍)의 침입하는 첫머리가 되어서 백성들은 여럿이 한꺼번에 살해 되거나 도망쳐 숨어서 감히 적군(敵軍)에 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신(臣)의 6대조와 그 자식은 의분이 솟구쳐 신명을 돌보지 않고 분개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의병(義兵) 수백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때 좌도의병장(左道義兵將) 신(臣) 권응수(權應銖)가 의병(義兵)을 일으켰다는 통보를 받고 함께 거사하려고 밤낮없이 달려갔습니다 .
마침 울산항도(蔚山項島)를 지나 갈 무렵 소등대교(所等大橋)아래서 갑자기 적군(敵軍)을 만났습니다. 신(臣)의 6대조는 몸을 빼어 돌격하여 수백의 적군(敵軍)을 처죽이니 적은 모두 도망하여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6대조는 승리한 기세에 힘입어 더욱 용기를 내어 적을 추격하여 참살하니 앞을 가로막는 적군(敵軍)은 아무도 없었으나 불행히도 적의 흉탄에 맞아 마침내 진중에서 전사(戰死)하였습니다.
신(臣)의 5대조는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돌아와 가매장(假埋葬)을 하고는, 아비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몸을 떨치어 칼을 뽑아 적군(敵軍)을 추격하여 대천제(大川堤) 아래에 이르러 수백의 적군(敵軍)을 참살하였으나, 자신도 역시 삼십여 곳의 부상으로 전사(戰死)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눈빛은 살아있는 것 같이 늠름하여 감지 않고 있어서 적군(敵軍)이 모두 두려워 하여 감히 접근을 못하였다고하니,
이 일이야말로 죽은자가 산 사람을 달아나게 한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비는 나라를 위해 전사(戰死)하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순사(殉死) 하였으니 부자(父子)가 이룩한 충효(忠孝)의 늠름하고 빛나는 사적은 공신(功臣)의 부표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읍지와 가첩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여 충의(忠義)의 혼령으로 하여금 저승에서 원통함을 머금게 하고 있으며, 어리석은 자손들은 수백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원통함을 가슴속 깊이 품어왔으니 그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의 의사(義士)들은 거개가 관직(官職)과 품계(品階)가 올랐는데 어찌 신(臣)의 선조만 빠져 버렸습니까?
저의 6대조, 5대조는 3등과 1등 공신(功臣)으로 공신부(功臣簿)에 기록 되었으나 공적(功績)에 따른 포창(褒彰)이 따르지 않아서 그 사적(事蹟)이 소멸 되어 버릴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자손들이 점차 쇠미해져서 사직(社稷)을 보좌(輔佐)한 공적(功績)이 잘못 처리 되었음을 아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부(本府)의 사림(士林)들이 또한 본읍과 감영(監營)에 소장을 올린지가 이미 여러번 있었으나 사안이 중대하므로 마침내 성상(聖上)께 아뢰기가 어려웠습니다.
신(臣)이 만사를 무릅쓰고 울면서 천지간에 있는 만백성의 부모이시고 인덕으로 구재 하신는 전하(殿下)에게 호소하오니 엎드려 성상(聖上)의 밝으신 처결을 비나이다.
09-本孫 呈 禮曹狀(본손 정 예조장) <원문보기☞ 원문① > top
51쪽)
< 풀이> --- 본손이 예조판서 조만영(趙萬永)에게 올린 글. 임진(壬辰-1832년) 11월
* 편집자 주(註) :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언복(彦福) 부자(父子)에게 포상의 은전을 내려달라고 순조 임금에게 직접 상언하자, 상소문은 예조로 내려 갔습니다. 도성 여관에서 3개월째 머물며 회답을 기다려도 예조에서는 아무말이 없다가 본손이 예조판서에게 독촉하는 글을 올리 자 예조에서는 고향에 내려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엎드려 아뢰옵니다.
저의 6대조 고(故) 훈련원(訓鍊院)첨정(僉正) 언복(彦福)과 기자(其子) 고(故) 훈련원(訓鍊院) 정(正) 인립(仁立)은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여 의병(義兵)을 일으켜 부자(父子)가 함께 순국(殉國)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공적(功績)이 거의 소멸되어 아무도 칭송 경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옛 갑년(甲年)이 거듭 돌아오는 때를 당하여 원통한 사정을 참을수 없어, 처음으로 지난 9월 성상(聖上)의 거동때 만사를 무릅쓰고 외람(猥濫)되게 성상(聖上)께 아뢴 일은, 예조에 내려 보냈으므로 여사(旅舍)에 머물러 처결하여 상주(上奏)하기를 우러러 기다린지가 삼삭(三朔)이 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왕명(王命)을 참작하시어 성상(聖上)께 아뢰어 공신(功臣)을 포창(褒彰)하여 높이는 나라의 은전(恩典)을 입도록 하여 주시기를 천만번 간청하옵니다.
* 제음(題音)...소장(疏狀)에 대한 회시문(回示文)
- 본조(本曹)에 내려온 상소문(上疏文)은 마땅히 다시 상주(上奏)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도 적합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니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앞일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10-慶尙道 觀察使 移 慶州府 關辭(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 이 경주부(慶州府) 관사) <원문보기☞ 원문① > top
54쪽)
<풀이>---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 서희순(徐喜淳) 이(移) 경주부(慶州府) 관사(關辭). 계사(癸巳-1833)년 1월
* 편집자 주(註) :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에게 박사익(朴思翼) 공(公)의 상소문에 대한 사실조사보고를 지시했고, 관찰사는 다시 경주부에 공문을 이첩하여 공사문적(公私文籍)에 의한 상세한 조사를 하여 보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관찰사(觀察使) 겸(兼) 순찰사(巡察使)로서 경주부윤(慶州府尹)과 서로 상세히 검토해 볼 일은, 도내 유학(幼學) 박사익(朴思翼)이 성상(聖上)의 거동때 올린 상소문(上疏文)을 예조에 내려 보내온 내용에 관한 공문이 본영에 도착하였는데, 상소문(上疏文)의 내용은 박사익(朴思翼)의 6대조 고(故) 훈련원(訓鍊院)첨정(僉正) 언복(彦福)은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여 그의 자식 인립(仁立)과 함께 의병(義兵) 수백인을 모아 장차 권응수(權應銖) 진으로 가고가자 하였는데,
갑자기 적병을 만나 수백명을 격살하였으나 불행히 적탄에 맞아 전사(戰死)하였으며, 기자(其子) 인립(仁立)이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돌아와 가매장(假埋葬)을 마치고 아비에 대한 복수를 맹서(盟誓)하고 용기를 분발하여 칼을 뽑아 적병을 수백명을 참살하였으며 자신도 또한 삼십여 군대의 상처를 입고 전사(戰死)하였으나, 아직도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이 없으니 품계(品階)를 높여 충절(忠節)에 대한 증직(贈職)을 내려주시는 혜택 있으시기를 삼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
그의 6대조 언복(彦福)부자(父子)의 울산(蔚山)땅에서 함께 순국(殉國)한데 대하여 성상(聖上)이 거동하시는 노상에서 그들에게 증직(贈職)을 하시고 시호(諡號)를 내려주시는 은전(恩典)을 호소한 것은, 사견(私見)에 의한 상소만으로는 불가하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예조에서는 본도(本道)로 하여금 공사문적(公私文籍)에 의한 상세한 조사를 하게 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상소문(上疏文)에 대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아뢰려고 하여 내려주신 상소문(上疏文)을 그대로 두었다고 하니,
성상(聖上)의 하교 취지를 받들어 잘 심사하여 그 일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한 공문에서도 박언복(彦福)(朴彦福) 부자(父子)의 임진란(壬辰亂) 에서의 순국(殉國) 사적을 상세히 조사하라고 하니, 경주부(慶州府)에서 공사문서와 사적에 의하여 사실을 뽑아 모은 보고를 하여 주면 그것을 받아 본 후에 이 일을 다시 예조(禮曹)로 옮겨 보고 하고자 합니다.
11-本孫 呈 慶州府狀(본손 정 경주부장) <원문보기☞ 원문① > top
57쪽)
<풀이>--- 경주부윤 홍종원(洪鍾遠)에게 계사(癸巳) 정월 본손 사익(思翼)이 진정서를 냄.
삼가 아뢰옵니다. 저희들 선조가 임난(壬亂)에 순절(殉節)한 일로써 지난 9월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서울에 머물면서 기다렸다가, 성상(聖上)이 궁궐 밖으로 거동하실 때에 과리를 두드려 호소하였고, 그 상소문(上疏文)을 예조에 내려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여러달 동안 시일을 늦추어서 상소문(上疏文)에 대한 회시를 받지 못하여 예조에 호소장을 올렸습니다.
예조의 회시에 의하여 잠시 고향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예조에서 감영(監營)에 공문이 내려오고 본도의 감영(監營)에서는 본부(本府)에서 공사의 문서와 사적(事蹟)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 하라고 합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저희들 선조의 내력과 문적은 서울에 머물고있는 족인들 거처에 맡겨 두었으며, 다시 종가의 문서와 서책들을 찾아보니 마침 선조가 의병(義兵)을 일으킨 일기의 초본과, 울산부(蔚山府) 사림(士林)의 한 차례 올린 서장이 있으니,
이것 또한 믿을만한 증거가 되는 문안이고, 또한 울산(蔚山)읍지를 살펴보니 선조사적이 소연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리고 공신록(功臣錄)록과 가첩(家牒)에도 모두 참고가 될 기록이 있으므로 이에 감히 보내어 호소하오니, 저희들의 딱한 정상과 처지를 가엾게 여기시어 위에 든 여러 가지 문적을 상세히 조사한 후에, 즉시 보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 견줄데가 없습니다.
제음(題音)--지금의 회시공문(回示公文)이란뜻. <경주부의 회신문 임>
* 증거가 될만한 문적을 하나 하나 모두 받아들여 채택하여 순영에 보고 하였습니다.
12-本孫 呈 巡使狀(본손 정 순사장) <원문보기☞ 원문① > top
59쪽)
<풀이>---순찰사 서희순(徐熹淳)에게 계사(癸巳) 2월에 본손 사익(思翼), 사희(思熙) 등이 진정서를 냄.
삼가 아뢰옵니다. 저의 6대조 훈련원(訓鍊院)첨정(僉正) 언복(彦福), 5대조 훈련원(訓鍊院) 정(正) 인립(仁立)의 임진 순절(殉節)한 일로써, 지난 에 서울에 가서 성상(聖上)의 대가가 거동하실 때를 기다려 꽹과리를 두들겨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였더니, 그 상소문(上疏文)이 예조로 내려왔으나 몇 달동안이나 시일을 끌어서 회보장계를 올리지 않음으로 예조에 소장을 올렸더니, 그 회시공문에 의하여 잠시 고향으로 내려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조로부터 순영에 통첩... 공문이 내려와서 본부(本府)에게 공사문적(公私文蹟)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합니다. 저희들 조선의 충절(忠節)에 대한 내력을 기록한 문적은 서울에 사는 족인에게 맡겨두고 왔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와 책은 다만 선조의 의병(義兵)을 일으켰을 때의 일기와 그 당시 사림(士林)들이 올렸던 서장...
진정서 및 공훈록 이권 그리고 읍지뿐이나, 이것은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을만한 자료이고, 본부(本府)에서도 또한 증거가 될 만하다고 하나하나 모두채택하고 그 결정을 회시 하여 주었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사적(事蹟)을 신중히 심사하여 경솔히 시행하지 않음은 가히 진선진미한 처사라고 할수 있으나, 저희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조의 공훈은 이미 삼등과 일등의 공신(功臣)에 들어있고, 충절(忠節)에 순국(殉國)한 사적은 당시의 일기와 읍지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근거가 분명하여 상세히 고찰할수있으며, 사림(士林)들이 본부(本府)와 감영(監營)에 올린 서장... 진정서 또한 가히 지극히 공평 정당한 여론이니,
또다시 증거로 믿을만한 별도의 문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공훈권 일기와 앞서 회시를 기다리라는 관부의 공문을 증거로 제출하옵고 우러러 호소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데 합하(閤下)는 충성(忠誠)을 숭상하고 절조를 존중하는 도리로서, 높은데서 잘 살피시어 이 애처로운 정상을 가엾게 여기시고, 성상(聖上)께서 윤허하도록 즉시 전보하여 지극히 빈궁한 백성으로 하여금 천리의 먼길을 오고 가는 괴로움과, 선조의 순국(殉國) 충절(忠節)이 소멸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바라오며 송구스러운 심정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13-本孫 再 呈 慶州府狀(본손 재 정 경주부장) <원문보기☞ 원문① > top
62쪽)
<풀이> --경주부윤 홍종원(洪鍾遠)에게 계사(癸巳-1833년) 4월 본손(本孫) 사익(思翼)이 진정서를 냄.
삼가 아뢰옵니다. 저의 6대조 언복(彦福), 5대조 인립(仁立)의 임란 순절(殉節)한 일로 성상(聖上)의 거동때 그 원통함을 진정한 상소문(上疏文)이 예조로 내려가 있어 본읍에서 문적(文蹟)을 조사 하여 보고하라고 하기에 이에 따라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회시문에 증거가 될 수있는 문적은 모두 받아들여 순영에 전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필요한 문적(文蹟)을 서울 거택에 맡겨 두었으므로 이번에 도로 가지고 와서 다시 올리오니, 참작하신 후에 특별히 조사 채택 하시어 순영에 옮겨 보고 하여 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바랍니다.
* 편집자 주(註) : 양세(兩世) 의사(義士)에 대한 은전을 내리도록 임금께 상언한 이래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진 (壬辰-1832년) 9월 서울 친족에 맡겼던 문적을 가져다가 다시 글을 올리는데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문적은 한성 부에서 조사하고 울주의 문적은 경주부에서 조사보고 하여 예조에서 수합 검토 하면 속히 처리되는 일인데 안타깝습니다.
14-本孫 三 呈 慶州府狀(본손 삼 정 경주부(慶州府)장) <원문보기☞ 원문① > top
63쪽)
<풀이>---경주부윤 홍종원(洪鍾遠)에게 계사(癸巳-1833년) 5월 본손(本孫) 사익(思翼)이 진정서를 냄.
삼가 아뢰옵니다. 선조를 포상(褒賞)하여 성상(聖上)께서 증직(贈職)하여 주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번 우러러 호소하여 번거롭게 하였음을 지극히 외람(猥濫)된 일입니다. 풍문에 들으니 합하(閤下)께서 금월말쯤 상경행차하는 의외의 좋은 일이 있다고 하오니, 지금 곧 순영에 전보가 되도록 이에 감히 다시 호소 하옵고 천만번 간절(懇切)히 바랍니다.
* 제음(題陰) --지금의 회시공문이란 뜻.
당위보영향사(當爲報營向事) --곧 당연히 스 일을 순영(巡營)에 보고 할려고 합니다.
15-慶尙道 觀察使 移 禮曹關文(경상도(慶尙道)관찰사(觀察使) 이 예조관문)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l 원문③> top
66쪽)
<풀이>--- 관찰사 서희순(徐熙淳)이 계사(癸巳-1833년) 6월 관련문서를 예조(禮曹)에 이첩함.
* 편집자 주(註) : 양세(兩世) 의사(義士)의 공훈을 인정하는 공문을 관찰사가 예조에 상신합니다.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 겸(兼) 순찰사(巡察使)에게 지난번에 도착한 예조의 공문에 도내경주에 사는 유학 박사익(朴思翼)이 과리를 치면서 아뢴 상소문(上疏文)을 성상(聖上)의 재결을 받아 예조에 내려 보내온 내용에 말하기를 박사익(朴思翼)은 그의 6대조 고(故)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 언복(彦福)이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여,
그의 자식 인립(仁立)과 더불어 수백인을 모병하여 장차 권응수(權應銖) 진으로 가서 합세할려고 했으나, 돌연 나타난 적병을 만나 수백인을 쳐서 죽이고 불행히 탄환에 맞아 전사(戰死)하니, 그의 아들 인립(仁立)이 시신(屍身)을 수습하여 가매장(假埋葬)을 하고난뒤, 아비의 원수를 꼭 갚겠다는 맹서(盟誓)를 하고 몸을 떨쳐 일으켜 칼을 뽑아 적군(敵軍)을 수백이나 참살했지마는, 자신도 삼십여 군데나 상처를 입고 전사(戰死)한 일에 대하여,
아직도 포상(褒賞)을 받지 못하였으니 품계(品階)를 높이고 관직(官職)을 더하며, 시호를 내려주시는 성상(聖上)의 은전(恩典)을 바란다는 것이었는데, 그의 6대조 언복(彦福) 부자(父子)가 임진란(壬辰亂)에 울산(蔚山)에서 함께 순국(殉國)하였으니, 어가(御駕) 앞에 호소하여 관직(官職)을 높여 주시고 시호를 내려 주시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달라는 일은 본손의 상소만으로는 불가 하나.
그 내용이 신빙 할만한데가 있으니 본도에 명령하여 공사문적(公私文蹟)을 상세히 조사한 보고를 받은 후에, 상소한 일에 대한 윤허 여부를 다시 아뢰라는 왕명에 의하여 근본취지를 잘 받을어 심사를 상세히 하여, 그일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것이므로 본도에서는 공문의 내용을 일일이 들어내어 공사문적(公私文蹟)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을 경주부윤(慶州府尹)에게 통고하였더니,
당해부윤(當該府尹) 홍종원(洪鍾遠)의 보고에 박사익(朴思翼)이 증거로 제출한 공사문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자세히 조사하여 보니, 박언복(彦福)은 충절(忠節)을 실행한 의사(義士)로서 무과관적(武科官籍)에 올려 있고, 관계(官階)는 첨정(僉正)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들 인립(仁立)과 더불어 함께 적군(敵軍)을 토벌하여 공훈이 공신(功臣)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와 같았으며,
당해 부읍지(府邑誌)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卷)을 고찰하여 보니, 원정(院正) 박인립(朴仁立)은 1등에 들어있으며 박언복(彦福)(朴彦福)은 3등에 들어 있었으며, 그의 집안에 대대로 간직해온 임진란(壬辰亂) 때 사적으로 기록한 일기를 보니, 동래부성이 함락된 후에 본군인(本郡人) 서인충(徐仁忠), 서몽호(徐夢虎), 박흥춘(朴弘春), 김응충(金應忠),등이 용사를 모집하여 마음속 깊이 적군(敵軍)토벌을 맹서(盟誓)하였으며, 언복(彦福)과 그의 아들 인립(仁立)은 거남방곡(巨南坊谷)으로 도망쳐 숨어서 적군(敵軍)의 창과 칼을 피하고 있던 사람중에서,
장사 수백인을 불러모아 장차 권응수(權應銖) 진으로 달려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적군(敵軍)을 소등대교(所等大橋) 아래서 만나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 성상(聖上)의 신하가 된 자는 이같은 국난을 당하여서는 적군(敵軍)과 함께 살수 없음을 맹서(盟誓)하여야 하나니, 이곳은 내가 목숨을 바쳐 싸울곳이다. 너는 돌아가 처자를 온전히 하여 조선(조선)들의 업적을 잘 계승하고 봉사(봉사)를 잘하라. 내가 소문을 들으니 서인충(徐仁忠), 이응춘(李應春), 장희춘(蔣希春)등 여러 의사(義士)가 류백춘(柳伯春)과 힘을 합쳐서 경주 울산(蔚山)의 적을 막고 있다고 하니, 너가 권응수(權應銖)진에 가지 못하거든 본군 의사(義士) 들과 더불어 군부(君父)의 원수를 가히 갚을수 있을 것이다" 하고,
몸을 빼어 돌격해 나가 수백명을 격살하고 전사(戰死)하니, 이때에 전응충(全應忠), 김흡(金洽), 박손(朴孫)등이 바야흐로 병영을 향해 가다가 인립(仁立)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것을 보고, 탄식(嘆息)하기를 "함께 왜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뛰어난 충절의사(忠節義士)를 잃어 버렸다"고 하고 곧 인립(仁立)에게 말하기를 " 그대의 대인은 이미 가셨으니 함께 산 언덕에 가매장(假埋葬)을 한 후에 우리들과 함께 병영에 가서 부공(父公)의 원수(怨讐)를 갚도록 도모하자"고 하여,
동행하던 중에 대천제(大川堤) 아래 함께 이르렀을때 갑자기 적군(敵軍)이 온 들판을 덮을 듯이 밀려들어 왔는데, 인립(仁立)이 삼의사(三義士) 에게 말하기를 "아비가 나라를 위하여 죽고 자식이 아비를 위하여 죽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어제 대교의 전투에서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 했겠습니까? 아비의 시신(屍身)을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은 어제의 적이다" 라고 하고는, 곧 칼을 뽑아 크게 부르짓기를
"너희 왜적들은 나를 아느냐? 어제 대교아래서 충절(忠節)로 전사(戰死)한 어른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칼을 받아라" 하고, 바로 적진(敵陣)으로 뛰어 들어 수백의 적군(敵軍)머리를 베었으나 자신도 삼십여 군데의 부상을 입어서 전사(戰死)하였으므로, 전응충(全應忠), 김흡(金洽), 박손(朴孫)이 잇달아 돌격해 나가니, 적군(敵軍)이 마침내 패퇴하여 마편방(馬鞭坊)에 머물고 감히 또 다시 침범해 오지 못하였다. 삼의사(三義士)가 인립(仁立)의 시신(屍身)을 수습하니 얼굴빛은 살아있는 것 같고 양쪽눈을 감지 않았으니,
서로 글을 지어 장사를 지냈는데 그 조사(弔辭)를 요약하면, < 오호라! 장하도다! 생각하건데 공(公)의 부자(父子)는 어제는 충의(忠義)로 순국(殉國)하고 오늘은 효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구나! 두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땅에 맹서(盟誓)하며 하늘에 울부짖으니, 그 맹렬하고 장한 기운은 언제까지나 없어지기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익일(翌日)에 삼의사(三義士)가 함께 병영으로 나아가 인립(仁立) 부자(父子)의 적 참살한 상황을 두루 보고하니 장희춘(蔣希春), 서인충(徐仁忠), 윤홍명(尹弘鳴), 류정(柳汀) 등이 듣고 탄식(嘆息)하기를
"우리 고향의 의사(義士)가 그 얼마나 많은가" 하였으며 류백춘(柳伯春), 이눌(李訥)등도 또한 모두 감탄 칭찬하여 초유사(招諭使)에게 사람을 보내오 보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사림(士林)들의 서장과 감영(監營)과 본읍(本邑)의 본손(本孫) 소장(疏狀)에 대한 회시공문은 모아서 서책을 이룰만 하고, 사가소장(私家所藏)의 일기는 비록 관청의 공적(功績)문자는 아니라고 하나 읍지에 실린 기록이 명백하고, 공훈권(功勳卷)에 들어 있는 기록이 의심할바 없으니, 이것은 충분히 증거로 삼을만한 문적(文蹟)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경주부(慶州府) 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에 의거하여 회답 보고하는 공문을 드립니다.
16-本孫 再 呈 禮曹狀(본손 재 정 예조장) <원문보기☞ 원문① > top
73쪽)
< 풀이>---계사(癸巳-1833년) 9월에 본손 인혁(仁赫)이 예조판서 김재창(金在昌)에게 진정서를 냄.
* 편집자 주(註) : 양세(兩世) 의사(義士)에 대한 은전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박사익(朴思翼) 공(公)께서 여러차례 머나먼 서울길을 오가시며 노력 했 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신의 고초로 병이 깊어지자, 아들 인혁(仁赫)께서 직접 서울에 올라가 예조에 진정서를 냈는데,
예조에서는 밀려있는 일이 많은데 그 일과 함께 임금에게 아뢰겠다고 하나 그 날이 언제인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삼가 아룁니다. 저의 7대조 고(故)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 언복(彦福)과 그의 아들 인립(仁立)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부자(父子)가 차례로 충의(忠義)로 순국(殉國)하였으나, 아직도 충신(忠臣)에게 내려주시는 관직(官職) 및 품계(品階)의 높임과 시호를 받는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거년 성상(聖上)께서 궁 밖으로 거동하실 때 저의 아비 사익(思翼)이 만사를 무릅쓰고 성상(聖上)께서 들으시도록 꽹과리를 쳐서 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소문(上疏文)이 예조로 내려 갔으며 본도로 통첩공문(通牒公文)을 보내니 본도(本道)와 본부(本府)에서도 이제 사실에 적합한 증거를 채택하여 자세히 조사보고 하였는데,
처음에 올린 상소문(上疏文)의 근본취지는 본도의 보고 중에 상세히 기재 되어있고, 본읍의 보고 중에도 들어 있어 한번 살펴보면 환하게 알수 있습니다. 저의 노부는 왜란의 주년(周年)이 되는 임진년 동안에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던 중에 공교롭게도 거듭되는 흉년을 만나, 나그네로서 객지생활의 어려움은 걸인 같은 참상을 면하지 못하다가, 그로 인하여 객고에서 오는 병까지 더하여 쓸쓸히 고향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조선(祖先)의 일을 위하여 아득한 도로를 왕래하여 서울에 장기간 머물다가 이와 같은 난치병을 얻었으며, 우리 가문의 대사는 본도 조사결과가 성상(聖上)에게 잘 상달되었는지? 의 여부에 달려 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모르고 있구나! 한 사람의 목숨이 장차 다할려고 하는데 죽기전에 양대의 증직(贈職)과 시호를 내려주시는 은전(恩典)을 보지 못한다면 당연히 원통한 심정을 품고 죽을것이고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 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자식된 자의 정리가 어찌 만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뒤로 가만히 앉아 있을수가 없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에 올라와서 예조에 알아본 바, 본읍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것을 본도에서 받아 들여 예조로 보낸 공문이 이미 올라와 있으므로, 이에 감히 사실을 밝히는 증거에 의하여 호소 하오니,
엎드려 비오니 딱한 사정을 참작하신 후에 특별히 성상(聖上)의 하문에 대한 회답을 올리셔서, 한편으로는 선조에 대한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이 내리시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병든 아비의 목숨이 살아 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천만번 간절히 바랍니다.
* 제음(題陰) --지금의 회시공문이란 뜻.
수년이래 성상(聖上)의 하문에 대한 회답과 상주(上奏)할 일이 쌓이고 막혀서 따라서 그 일도 곧 모두 함께 아뢸려고 합니다.
17-本孫 三 呈 禮曹狀(본손 삼 정 예조장) <원문보기☞ 원문① > top
76쪽)
<풀이> --- 갑오(甲午-1834)년 1월에 본손(本孫) 인혁(仁赫)이 예조판서 정기선(鄭基善)에게 진정서를 냄.
* 편집자 주(註) : 임진(壬辰- 1832)년에 박사익(朴思翼) 공(公)께서 서울에 올라와 양세(兩世) 의사(義士)에 은전을 내려 달라고 상언(上言)하셨는데 그 후 계사(癸巳-183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갑오(甲午-1834년) 1월에 접어들어 공(公) 아들 인혁(仁赫)께서 다시 서울에 올라 가 예조에 호소장을 올렸으나 예조에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저의 7 대조 언복(彦福), 6대조 인립(仁立) 부자(父子)의 순국(殉國) 충절(忠節)에 대하여, 증직(贈職)과 시호를 청한 일은 지난 임진(壬辰) 9월 저의 아비 사익(思翼)이 만사를 무릅쓰고 성상(聖上)이 거동하시는 노상에서 아뢰어, 분수에 넘치는 성은을 입어 성상(聖上)께 통하게 되고 성상(聖上)의 재가를 받은 상소문(上疏文)이 본조(本曹)에 내려왔으며 본조(本曹)의 공문에 대한 본도(本道)의 증거에 의하여 채택한 사실이 본조(本曹)에 보고 되어 있으니,
지금 또다시 거듭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의 아비는 여러해 동안 힘겨운 일을 성취 하고자 힘을 다하여 뛰어 다니다가, 또한 객지에서 병을 얻어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온지가 이미 칠팔삭(七-八朔)이나 경과 되어 마침내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년 구월(去年九月)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경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본조에 호소장을 올렸더니,
회답공문에 수년이래로 성상(聖上)께 회답상주 할 일이 많이 쌓여서 따라서 곧 다른일과 함께 상주할것이라 하였으므로, 또한 성과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서 여러달 동안 병구료를 하였으나 병은 별로 차도가 없고, 죽기전의 지극한 소원은 양대(兩代)에게 내려지는 증직(贈職)과 시호의 은전(恩典)을 보는 것이 라고 하므로, 지금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상경하여 연유를 갖추어 우러러 호소합니다.
엎드려 비오니, 딱한 사정을 참작하신 후에 특별히 성상(聖上)께 상주하시어 생사의 경지를 헤매는 저의 아비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를 혈성을 다하여 천만번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 제음(題陰) --지금의 회시공문이란 뜻.
지금은 이미 해가 지났고, 또한 정기적으로 과거 보는 해에 해당하므로 비록 호소장(呼訴狀)을 올리지 않더라도 자연히 곧 차례대로 그일을 상주할 (上奏)것입니다.
18-本孫 四 呈 禮曹狀(본손 사 정 예조장) <원문보기☞ 원문① > top
79쪽)
< 풀이 >---갑오(甲午-1834)년 4월에 본손(本孫) 사익(思翼)께서 예조판서 박종훈(朴宗薰)에게 진정서를 냄.
* 편집자 주(註) : 갑오(甲午-1834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기다렸으나 회답이 없자 박사익(朴思翼) 공(公)께서 서울에 다시 올라가 예조에 호소 문을 내자 예조에서는 사안이 중대함으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삼가 아룁니다. 저의 6대조 고(故)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 언복(彦福)과 5대조 훈련원(訓鍊院) 정(正) 인립(仁立)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부자(父子)가 용사를 모집하여 의병(義兵)을 일으켜 적군(敵軍)을 토벌하다가, 부공(父公)은 먼저 순국(殉國)하였는데 충절(忠節)이 밝게 빛나고,
아들은 부공(父公)을 본받아 뒤에 순사(殉死)하여 충효(忠孝)가 남다르게 높이 뛰어났는데,
그 때 사적은 울산읍지(蔚山邑誌)와 공신록(功臣錄)에 다 함께 제일등으로 기재 되어 있아오며,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고 파묻혀 그 공훈에 대한 포상(褒賞)을 내려 주시는 성상(聖上)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지난 임진년 9월에 죽음을 무릅쓰고 성상(聖上)의 거동하시는 길앞을 외람(猥濫)되게 어지럽혀 상소하였더니,
특별히 예조에 명령하시고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공사문적(公私文籍)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시었는데, 울읍(蔚邑)의 읍지(邑誌)와 공훈록의 문적이 마치 부절과 같이 들어 맞으므로 본읍의 보고를 본도가 조사하여 진실한 것을 모아서 예조로 회답보고 한지가 양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성상(聖上)의 명령에 의한 예조의 상주(上奏)하는 은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천리 먼 길을 달려와 이유를 밝혀 송구한 마음으로 호소문을 두 번째로 올렸더니 그에 대하여 회시하는 공문을 보내왔었는데,
그 내용에 연래 성상(聖上)의 하문에 대한 상주할 일이 가득 쌓여 있어 모두 함께 곧 상주할것이라고 하였으나, 자손된 자의 답답하고 탄식(嘆息)하는 심정은 실로 가만히 앉아 참고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올 봄 세 번째 올린 호소문에 대한 회답공문에는 지금 해가 지났고 또한 식년(式年)을 당하였으므로, 비록 호소장을 올리지 않더라도 자연히 차례대로 상주할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여관에 머물러 기다린지가 벌써 사개월이 지났으나 끝내 다시 상주하여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을 받잡지 못하였습니다. 전일에 두차례 보내주신 공문을 이에 감히 함께 첨부하여 우러러 호소합니다.
엎드려 비오니, 특별히 정상을 참작하신 후에 저의 6대조 고(故) 첨정(僉正) 언복(彦福), 5대조 고(故) 원정 인립(仁立) 부자(父子)의 충효(忠孝)포창(褒彰)의 뜻을 신속히 성상(聖上)께 아뢰어 특별히 증직(贈職)을 내려 주시는 은전(恩典)을 입을수 있기를 천만번 정성을 다하여 송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 합니다.
* 제음(題陰) --지금의 회시공문이란 뜻.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니 잠시 동안 그 일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82쪽)
< 풀이> --- 예조판서 김난순(金蘭淳) 명의로 갑오(甲午-1834년)에 계(啓)를 올림.
* 편집자 주(註) : 갑오(甲午-1834년) 10월 11일 예조에서 왕에게 직접 상주한 내용입니다. 양의사에게 은전을 내림이 마땅하나 중대한 사안임으로 성상(聖上)의 재가(裁可)를 받아 처리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순조 임금 때는 처결이 되지 않고 헌종 때로 넘어 갔습니다.
예조가 본조에 내려 보내 주신 왕명에 대한 회답 상주(上奏) 상소문(上疏文)의 부록목록(附錄目錄)에 의한 경주 유학(幼學) 박사익(朴思翼)이 과리를 쳐서 상소한 그의 6대조 고(故) 훈련첨정(訓鍊僉正) 언복(彦福)과 그의 아들 훈련원(訓鍊院) 정(正) 인립(仁立)의 임진순절(壬辰殉節) 실적을 당해 도신(道臣)에게 명령하여 상세히 조사한 보고를 받은 후에 성상(聖上)께 상주(上奏)하여 처리할것이므로 회보를 하도록 하였더니,
당해도신(當該道臣)의 회보공문과 그안에 열거한 본읍(本邑) 보고 중의 공사문적(公私文蹟)을 상세히 고찰(考察)해 보오니, 임진 4월 13일 동래부성이 함락된 후에 박언복(朴彦福)이 그 아들 인립(仁立)과 함께 피난백성 중 용사 수백인을 불러모아 의병대(義兵隊)를 조식하고, 장차 권응수(權應銖) 진영으로 가려고 하던중에 갑자기 대교하에서 적군(敵軍)을 만나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신하된 자는 맹서(盟誓)코 적군(敵軍)과는 같은 하늘아래 함께 살수 없으니 여기가 바로 내가 생명을 바칠만한 곳이다. 너는 생명을 보전하여 돌아가서 처자를 잘 거느려서 조선(祖先)의 제사를 받들고 그 유업을 계승하라"고 하고는 곧 적군(敵軍) 수백인을 처죽이고 전사(戰死)하니,
인립(仁立)이 그 시신(屍身)을 안고와 전응춘(全應忠), 김흡(金洽), 박손(朴孫) 등과 함께 가매장(假埋葬)을 하고 병영으로 향하여 가다가,
대천제(大川堤) 아래서 적군(敵軍)을 만나 인립(仁立)이 삼의사(三義士)(義士)에게 말하기를,
" 부공(父公)이 나라를 위하여 전사(戰死) 한것과 자식이 아비를 위하여 전사(戰死)하는 것은 같은일이다. 어제 대교의 전투에서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 했겠느냐? 아비의 시신(屍身)을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고 곧 몸을 날려 돌격하여 적군(敵軍) 수백인의 머리를 베었으나,
자신 또한 삼십여 군데의 상처를 입고 전사(戰死)하였다고 하였삽는 바, 고(故) 첨정(僉正) 박언복(彦福)(朴彦福)과 그 아들 원정(院正) 박인립(朴仁立)은 임진년 왜노(倭奴)가 걷잡을수 없이 날뛸 때,
가장 먼저 앞장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몸을 던저 적군(敵軍)에 항거하여 이미 그 흉악한 침입을 막았으며, 이어서 그들의 대군을 만나 기세를 올려 나아가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충절(忠節)을 지키어 순국(殉國)하여, 아비가 먼저 전사(戰死)하고 자식은 뒤에 목숨을 바치니 곧은 충성(忠誠)과 순수한 효성(孝誠)은 공중에 높이 솟아 하늘을 받치고 태양을 꿰뚫을 만하여, 부자(父子)가 함께 공훈록에 기재되었으며 오랫동안 일반사회의 무성한 공론으로 칭송되어 왔습니다.
또한 당해도(當該道)의 감영(監營)과 울산읍(蔚山邑의) 조사보고에도 다함께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풍기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성품을 교육하고 격려하는 방도가 될 것이므로, 부자(父子) 두 사람에게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추증하여, 그 공훈을 포창(褒彰)하시는 은전(恩典)을 내려 주시는 것이 사리에 마땅하다고 상주하옵니다. 성상(聖上)의 은전(恩典)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조에서 감히 함부로 처결할수없이 성상(聖上)의 재가(裁可) 여부를 앙청하옵니다.
예조에서 회답주청(回答奏請)한 경주 유학 박사익(朴思翼)이 성상(聖上) 거동시에 올린 상소문(上疏文)에 관한 문(問)에 대한 회답(回答)
순조 34년 (1834) ... 도광(道光) 14년 10월 11일(갑오-甲午)
우승지 신(臣) 홍원모(洪遠謨) 담당관(擔當官) 노비(奴婢)가 주인을 위하고 자손이 조선(祖先)을 위하는 일은 모두 성은(聖恩)에 관계되는 사안으로 때마침 향리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시행하지 말라는 조정(朝廷)의 금령이 있으니 받들어 살펴 왕명에 따라 실행하기 바랍니다.
20-綏陵 幸行時 慶尙道 儒生 上言(수능 행행시 경상도 유생 상언)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l 원문③> top
88쪽)
< 풀이>--- 헌종 5년, 기해(己咳-1839년)년에 헌종이 부왕인 익종릉(翼宗陵)에 거동 하실 때 경상도 유생(儒生)들이 올린 말씀.
삼가 아룁니다. 충신(忠臣)들의 절의(節義)를 표창(表彰)함은 국가(國家) 조정(朝廷)의 마땅히 행할 떳떳한 법규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명백(明白)히 밝혀 세상에 드러내고 일은 사림(士林)의 공평한 여론이온데, 신 들이 살고 있는 같은 도내에 고 충절(忠節)에 순국(殉國)한 박언복(朴彦福)은 울산(蔚山)의 의사(義士)로서 무관으로 출사하여 관계가 첨정(僉正)에 이르렀는데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여 동래부가 함락된 후에,
그의 아들 인립(仁立)과 함께 피란 중에 있던 용사 수백인을 일깨워 불러모아 의병대(義兵隊)를 조직하여 권응수(權應銖) 진영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적병을 소등대교(所等大橋)하에서 만나 그의 아들 인립(仁立)에게 말하기를 " 성상(聖上)의 신하된 자는 맹세코 적과는 같이 살수 없으니 이곳이야말로 내가 죽을만한 장소이다. 너는 돌아가서 처자를 온전히 하여 선조(先祖)의 제사를 받들고 가업을 계승하여라" 하고
몸을 날려 돌격하여 수백의 적군(敵軍)을 격살하여 경주 울산(蔚山) 지방의 적군(敵軍)의 진격을 방어하였으나, 불행히도 적탄에 맞아 전사(戰死)하였습니다. 이때 전응충(全應忠), 김흡(金洽), 박손(朴孫)이 나란히 병영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인립(仁立)이 아비의 시신(屍身)을 끌어안고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것을 보고, 탄식(嘆息)하여 말하기를 " 함께 왜적을 물리치는 일을 할수 없게 되었으며 한 사람의 충절(忠節)의사(義士)를 잃게 되었음이 한스럽다" 고 하고
곧 인립(仁立)에게 말하기를 " 그대의 대인은 이미 목숨을 마쳤으니 산언덕에 임시로 매장하고 우리들과 함께 병영으로 가서 부친의 원수 갚기를 도모하자" 고 하여 함께 가던중에. 대천제방(大川堤防) 아래에 이르렀을 때 별안간 많은 적병들이 넓은 들을 덮을 듯이 공격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인립(仁立)이 삼의사(三義士)에게 말하기를 " 부공(父公)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식이 아비를 위하여 죽는 것은 동일한 일이다. 어제 대교의 싸움에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 했겠는가? 부군의 시신(屍身)을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따름이었다" 하고
곧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 왜놈 오랑캐들아 너희들은 나르를 아느냐? 어제 대교아래서 충절(忠節)을 위하여 전사(戰死)한 사람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칼을 받아라" 하고 바로 적진(敵陣)에 뛰어들어 수백의 목을 베고 자신도 또한 삼십여 군대의 상처를 입어서 전사(戰死)하였으나 적군(敵軍)도 또한 마편방(馬鞭坊)으로 퇴각하여 머물고 감히 다시 침범해 오지 못하였습니다.
삼의사(三義士)가 인립(仁立)의 시신(屍身)을 수습하니 안색은 마치 살아 있는 것 같고 양쪽 눈은 감지 않고 있었습니다 . 삼의사(三義士)가 서로 의논하여 조문을 지어 장사지냈으니 그 말을 요약 하오면 " 오호라! 장렬 하도다! 생각하건데 공(公)의 부자(父子)는 어제 충절(忠節)을 실천하여 순국(殉國)하고 지금은 효를위하여 전사(戰死)하였습니다. 두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땅에 맹서(盟誓)하고 하늘을 울부짖으니 그 장렬한 기개는 영원히 가리워지지 않고 살아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부자(父子)가 적군(敵軍)을 토벌하여 세운 그 공훈의 사적은 소연하게 울산읍지(蔚山邑誌)에 기록되어있고, 또한 선무원종공신록(宣武原從功臣錄)에도 상세히 기재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옵건데 우리나라 순조조 임진년에 그의 6대손 박사익(朴思翼)이 실제의 사적을 낱낱이 들어 쇠를 울려 호소한바 있아온데, 성상(聖上)의 명령이 해당 예조에게 내려왔으며 예조는 본도(本道)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 하도록 하였아온데 보고된 내용이 상소한 취지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으므로,
예조가 곧 회답하여 상주(上奏)한 내용에 고(故) 첨정(僉正) 박언복(彦福)(朴彦福)과 그의 아들 고(故) 인립(仁立)은 임진년 왜적이 걷잡을수 없이 미처 날뛸때에 가장 앞장서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적병에 대항하여 이미 그 흉악한 침입을 막았으며, 계속하여 밀어닥치는 적의 대군을 맞이하여 분연히 전장에 나아가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순국(殉國)하였으니, 아비는 앞서 전사(戰死)하고 자식은 뒤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절개가 곧은 충성(忠誠)과 지극하고 순수한 효성(孝誠)은 하늘을 떠받치고 솟아올라 태양을 꿰뚫을만 하여 함께 공훈록에 참여하였고, 오래도록 여러 사람들의 성한 칭송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감영(監營)과 본읍(本邑)의 조사보고에도 명백(明白)한 증거가 갖추어져 있으니, 선량한 풍속을 확립하여 백성들의 충절(忠節)을 숭상하는 기풍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대도를 도우기 위하여 두 사람을 함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높여 그 공적(功績)을 빛내는 은전(恩典)을 내려주시는 일이 사리에 합당할듯하여 외람(猥濫)되게도 주청하옵니다.
은전(恩典)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예조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처리 할수 없어 성상(聖上)의 재결 여부를 아뢴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소문(上疏文)에 대한 성상(聖上)의 명령이 당해 예조에 내려 와서 장차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높이는 충절(忠節)에 대한 은전(恩典)을 의론하고자 하였습삽더니 그 때 조정(朝廷)에서는 본손의 쇠를 울려 호소한 일은 관례상의 격식에 어긋남이 있으니 잠시 내버려 두기로 하였으며 사실만 간단히 기록하여 성상(聖上)께 올린 문서에는 장차 여러 사림(士林)의 상소를 기다려다시 당해예조에서 상주(上奏)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들은 감히 바라오니 도의 조사와 예조의 아뢴 취지를 만사를 무릅쓰고 성상(聖上)의 거동길에 호소하려고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니다. 천지간에 만백성의 부모이신 성상(聖上)꼐서는 담당관에게 빨리 명하시어 지난번에 조사와 상주(上奏)문에 의하여 고(故) 첨정(僉正) 신(臣) 박언복(朴彦福)과 그의 자식 고(故) 정(正) 신(臣) 박인립(仁立)(朴仁立)에게 함꼐 관직(官職)을 높여 주시고, 시호를 내려 주시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충성(忠誠)을 포창(褒彰)하고 효행을 장려하는 거룩한 은택을 입도록 하시옵소서.
성상(聖上)의 은택을 복몽(伏蒙)하여, 바라는일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삼가 아뢰옵니다.
* 편집자 주(註) : 유생명첩(儒生名牒)은 상소를 올린 유생들의 성명임으로 번역을 생략합니다.
95쪽)
< 풀이 >--- 헌종 5년, 기해(己咳-1839년)년 5월에 이조판서 권돈인(權敦仁)이 경상도 유생들의 상소내용을 보고함
* 편집자 주(註) : 양 의사께 은전을 내리는 일은 아직도 격식에 문제있다고 하며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경상도(慶尙道) 유생진사(儒生進士) 권재옥(權載鈺)등이 상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道內) 고 첨정(僉正) 박언복(彦福)(朴彦福)과 그의 아들 고 정 인립(仁立)이 임진년 왜노가 걷잡을수없이 미쳐 날뛸때 가장 먼저 의병(義兵)을 일으키고 몸을 바쳐 앞장서서 적병에 대항하여 이미 그들의 흉포한 공격을 막았으나 계속하여 적의 대군을 만나 아비는 먼저 전사(戰死)하고 자식은 뒤따라 전사(戰死)하였으니
그 절개(節槪)를 지킨 충성(忠誠)과 지극하고 순수한 효성(孝誠)은 하늘에 높이 치솟아 우주를 떠받치고 태양을 꿰뚫을만하니 두 사람 함께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을 내려주십사고 한 것이온데, 박언복(朴彦福)과 그의 아들 인립(仁立)의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순국(殉國)한 상황은 전번에 비록 경상도의 조사와 예조의 전왕조에 올린 회답 장계가 있었다고 하나,
아직도 격식에 잘못이 있다는 논란이 있사오니 그 일을 신중히 심사하는 방도는 다시 본도(本道)로 하여금 실상을 조사 보고 하도록 한 후에 회보 장계를 올리고자 하오니 다시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심이 어떨른지 상주(上奏) 하옵고 윤허에 의거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22-慶尙道 觀察使 査啓(경상도 관찰사 사계)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 top
99쪽)
< 풀이>---헌종 5년, 기해(己咳-1839년)년 11월에 경상도 관찰사 김도희(金道熹)가 장계를 올림.
* 편집자 주(註) : 경상도 관찰사는 양 의사께 은전을 내리는데는 증거가 충분하여 별도의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음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慶尙道) 유생진사(儒生進士) 권재옥(權載鈺) 등의 상소문(上疏文) 내용을 살펴 보면 도내(道內) 고(故) 첨정(僉正) 박언복(彦福)(朴彦福)과 그 아들고 (故) 정(正) 인립(仁立)이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왜적들이 걷잡을수 없이 미처 날뛸 때, 가장 먼저 의병(義兵)을 일으키고 신명을 바쳐 앞장서서 적군(敵軍)에 대항하여 이미 그들의 흉포한 공격을 막았으나, 계속하여 처들어 오는 적의 대군을 만나 아비는 먼저 전사(戰死)하고 자식은 뒤를 따라 순국(殉國)하였으니,
절개(節槪)를 지킨 충성(忠誠)과 지극하고 순수한 효성(孝誠)은 하늘에 높이 치솟아 우주를 떠받치고 태양을 꿰뚫을만 하니, 두 사람 함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높이는 은전(恩典)을 내려 주시도록 상소한것이온데, 박언복(朴彦福)과 그 자식 인립(仁立)의 임진순절(壬辰殉節)한 상황은 먼저번에 비록 경상도의 조사와 예조의 전조시(前朝時)에 올린 답신장계가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격식에 잘못됨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 ,
그일에 대한 신중한 심사의 방도는 다시 본도(本道)로 하여금 실적을 조사 보고 하도록 하지않을수가 없아오니 그 후에 본조에서 답신하는 장계를 올리도록 도신에게 분부하옴이 어떠할지 품신 하는 이조의 상주(上奏)가 있었으며, 도광(道光) 19년 5월 초1일에 에 동부승지 신(臣) 이원경(李源庚) 담당관이 이조(吏曹)에 보내온 윤허에서도 관련사실을 잘 고찰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도(本道)에서도 경주부윤(慶州府尹)에게 박언복(彦福)(朴彦福) 부자(父子)의 순절(殉節)한 일은 공론을 널리 모으고 실적을 상세히 찾아 조리에 맞는 증거에 의하여 보고하라는 분부가 도래 하였음을 통보 하였더니, 경주부윤(慶州府尹) 유장환(兪章煥)의 보고공문서 내용에 의하면,
박언복(朴彦福) 부자(父子)의 순절(殉節)한 사적은 이미 임진년에 박사익(朴思翼)의 과리를 쳐서 올린 상소로 인하여 본부(本府)가 조사보고 하였으며, 공사문적(公私文蹟)을 다시 차례대로 살펴 보니 박언복(彦福)(朴彦福)은 울산(蔚山)에서 충의(忠義)를 실천한 학덕있는 선비로서 무관으로 벼슬하여 첨정(僉正)관위에 이르렀고,
그 아들 인립(仁立)과 함께 적군(敵軍)을 토벌하여 공적(功績)이 당해읍 읍지에 명백(明白)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선무원종공신록권을 고람(考覽)해보니 박언복(彦福)(朴彦福)은 삼등에 들어있고 인립(仁立)은 일등에 들어 있으며, 그 집에 대대로 소장되어 오는 일기를 보니 임진 4월 13일에 동래부가 함락 당한 후에 읍인 서인충(徐仁忠), 서몽호(西夢虎), 박홍춘(朴弘椿), 전응충(全應忠)이 용사를 모집하여 적군(敵軍)을 토벌할 것을 맹서(盟誓)하였고,
박언복(朴彦福)과 그의 아들 인립(仁立)은 거남방곡(巨南坊谷)으로 달려가 적군(敵軍)을 피하여 모여든 용사 수백인을 깨우쳐 불러 모아서 권응수(權應銖) 진영으로 달려 갈려고 하였는데 그 후에 갑자기 소등교 아래서 적군(敵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 이같은 국가(國家)가 뒤흔들리는 난세를 당하여 맹세코 적과 더불어 살수가 없으니, 내가 마땅히 목숨바칠 곳을 얻었다"고 하고는 몸을 빼어 돌격해 나아가 수백인을 처죽이고 전사(戰死)하였습니다.
이 때 전응춘(全應春), 깁흡(金洽), 박손(朴孫)이 바야흐로 병영으로 향해 가다가, 박인립(朴仁立)이 그 아비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것을 보고 탄식(嘆息)하여 말하기를 " 함께 적군(敵軍)을 토벌하는 대사를 할수 없게 되었으며 훌륭한 한 사람의 충의(忠義)로운 선비를 잃어 버렸구나" 고 슬퍼하여 곧 인립(仁立)과 더불어 산 언덕에 가매장(假埋葬)을 한 뒤에 함께 병영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대천제(大川堤) 아래 이르렀을 때는 곧 7월 11일이었는데, 갑자기 적병이 온 들판을 가득히 덮을 듯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인립(仁立)이 삼의사(三義士)에게 말하기를 " 아비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식이 아비를 위하여 죽는 것은 결국 같은 일이니, 어제 대교의 싸움에서는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 했겠느냐? 다만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하고
곧 큰 칼을 빼어 들고 크게 호통쳐 외치기를 " 너희들은 내칼을 받아라" 하고 바로 적진(敵陣)에 들어가 수백의 적병 머리를 베고 자신도 또한 삼십여 군데의 상처를 입어 장렬히 전사(戰死)하였고, 전응춘 김흡(金洽) 박손(朴孫)등이 잇따라 돌진하니 적군(敵軍)은 마편방(馬鞭坊)으로 퇴각 하여 머물고 감히 우리쪽으로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삼의사(三義士)가 인립(仁立)의 시신(屍身)을 수습하니 얼굴 모습은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았으며 두 눈은 감지 않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문을 지어 장사 지내니 그 글을 요약하면 " 오호라! 장렬하도다! 생각하건데 공(公)의 부자(父子)가 어제는 충절(忠節)을 위하여 순국(殉國)하고 오늘은 효성(孝誠)을 실천하여 목숨을 바쳤구나, 땅을치며 맹서(盟誓)하고 하늘을 우러러 외치니 열렬한 기개는 어두워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삼의사(三義士)가 병영으로 함께 달려가 박인립(朴仁立) 부자(父子)의 적병을 처부순 상황을 알리니 장희춘(蔣希春), 서인충(徐仁忠) 윤홍명 (尹弘銘), 류정(柳汀)등이 듣고 탄식(嘆息)하기를 " 우리 고장의 의사(義士)는 그 얼마나 많은가? " 하였고 류백춘(柳伯春), 이눌(李訥) 역시 모두 탄복하여 크게 칭찬하고 초유사에게 옮겨 보고하였다고 하며,
전후 사림(士林)의 소장과 감영(監營)과 읍부의 회시공문이 많이 쌓여서 두루마리나 책을 만들만큼 많아 다시 공론이 모아지도록 기대리지 않더라도 저절로 한가지로 따르게 될것이며 읍지에 기록된바와 훈권에 기록된바가 저와 같이 명백(明白)하오니 사적을 다시 찾아 모으지 않더라도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108쪽)
< 풀이> --- 경자(庚子-1840)년 8월 이조판서 권돈인(權敦仁)이 보낸 첩문(牒文)
* 편집자 주(註) : 경상도 관찰사의 의견을 이조에서 받아들여 임금에게 상주하는데, 박언복(朴彦福)과 그 아들 인립(仁立)의 임난 공훈은 근거자료 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명백함을 아뢰고, 양세 의사에 대한 은전을 베푸는데는 임금의 명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조(吏曹)가 증거로 삼을만한 원본을 등본하여 보내달라는 일에 대하여,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 겸(兼) 순찰사(巡察使) 김도희(金道熹)의 회신보고가 도달하였습니다. 본조(本曹)의 답신장계(答申狀啓)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경상도(慶尙道) 유생진사(儒生進士) 권 재옥(權 載鈺) 등이 올린 상소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道內)의 고(故) 첨정(僉正) 박언복(朴彦福)과 그의 아들 고(故) 정(正) 인립(仁立)이 임진년 왜적이 걷잡을 수 없이 미처 날뛸 때,
가장 먼저 앞장서 의병(義兵)을 일으키고 목숨을 바쳐 적군(敵軍)에 항거하여 이미 그 흉폭한 공격을 막았으나, 계속하여 공격해 오는 적의 대군을 만나 아비는 앞서 전사(戰死)하고 자식은 뒤를 따라 목숨을 바치니, 절개(節槪) 높은 충성(忠誠)과 지극하고 순수한 효성(孝誠)은 하늘높이 치솟아 올라 우주를 떠받치고 태양을 꿰뚫을만 하니, 두 사람 함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높이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박언복(朴彦福)과 그의 아들 인립(仁立)의 임진순국(壬辰殉國)한 상황은, 먼저번에 비록 본도(本道)의 조사와 예조에서 순조조(純祖朝)때 답신한 장계가 있었으나, 관례상의 격식에 어긋난바가 있어 그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신중히 그 일을 심사하는 방도는 본도(本道)로 하여금 다시 실상을 찾아내어 조사한 보고를 들은 후에, 본조에서 답신하는 품고(稟告)를 올리지 않을수 없아오니 이 일을 본도신(本道臣)에게 분부하심이 어떨른지 상주(上奏)하였습니다.
도광(道光) 16년 5월 초 1일, 동부승지(同副承知) 신(臣) 이원경(李源庚) 담당관이 보내온 본조의 장계에 대한 윤허 하신 바는, 그 사안을 잘 고찰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조에서는 본도(本道)에 박 언복(朴彦福) 부자(父子)의 충의(忠義)에 순국(殉國)한 사안에 대하여 널리 공론을 채택하고 상세한 실적을 찾아서 합당한 증거를 들어서 보고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더니, 본도(本道)의 보고에 의하면 경주부윤(慶州府尹) 유 장환(兪章煥)의 보고 내용은
박 언복(彦福) 부자(父子)의 순의 한 일은 이미 임진년에 박 사익(朴思翼)의 과리를 쳐서 상소한바에 의하여 본부(本府)의 조사보고가 있었으며,
공사의 문서와 사적을 차례대로 살펴보니 박 언복(彦福)은 의리를 실행하던 선비로서 무관으로 벼슬이 첨정(僉正)에 이르렀는데, 그의 아들 인립(仁立)과 함께 왜적을 토벌하여 그 공적(功績)이 많아 그의 공훈을 기록한 문서에는 박 언복(彦福)은 3등에 들어 있고 박 인립(仁立)은 1등에 들어 있으며,
그 집에 보존되어온 일기를 가져다 보니 임진 4월13일에 동래부가 함락된 후에 읍인 서 인충(徐仁忠), 서 몽호(徐夢虎), 박 홍춘(朴弘春), 전 응충(全應忠) 등이 용사를 모아 왜적을 토벌 할것을 맹서(盟誓)하였고, 박 언복(彦福)과 아들 인립(仁立)은 거남방골로 달려가서 피난인중에서 용사 수백인을 불러 모아서 의병(義兵)군을 조직하고 권 응수 진영으로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적군(敵軍)을 소등대교(所等大橋) 아래서 만났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같은 " 나라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맹서(盟誓)코 적과는 함께 살수 없으니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 하고 곧 몸을 빼어 돌격하여 수백의 적군(敵軍)을 처죽이고 전사(戰死)하였는데, 이 때 전 응충(全應忠) , 김흡(金洽) 박 손(朴孫) 이 바야흐로 병영으로 향하여 가다가
인립(仁立)이 아비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것을 보고 탄식(嘆息)하기를 " 함께 적군(敵軍) 토벌의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충의(忠義)로운 선비를 잃었구나! " 하고 곧 인립(仁立)과 더불어 산 언덕에 가매장(假埋葬)을 한 뒤 함께 병영으로 향하였습니다.
대천제(大川堤)방 아래에 이르렀을 때는 7월11일이었습니다. 홀연 적병이 나타나 들판을 가득히 덮고 몰려 오는것을 보고 인립(仁立)이 삼의사(三義士)에게 말하기를 " 아비가 나라를 위하여 전사(戰死) 한것이나 자식이 아비를 위해 전사(戰死)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일이다. 지난날 대교의 전투에서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 했겠느냐?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고 하고, 곧 칼을 빼어 크게 외치기를 " 너희들은 내칼을 받아라" 하고 바로 적진(敵陣)으로 처들어가서 백여명을 참수 하였으나,
자신도 삼십여 군데의 상처를 입고 전사(戰死) 하였습니다. 전 응충(全應忠), 김흡(金洽) 박 손(朴孫)이 잇따라 돌진하니 적군(敵軍)은 드디어 퇴각하여 마편방(馬鞭坊)에 머물고 감히 근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삼의사(三義士)가 인립(仁立)의 시신(屍身)을 수습하니 얼굴빛은 살아있는 것 같고 양눈은 감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로 더불어 이론하여 조사를 지어 장사지냈으니, 그 대략은 " 아! 슬프고 장렬하도다! 생각하건데 공(公)의 부자(父子)는 지난날 충성(忠誠)을 위하여 순국(殉國)하고 이제는 효성(孝誠)을 위하여 신명을 바쳤구나! 한손에 칼을 빼어 적군(敵軍)을 처부술 것을 땅에 맹서(盟誓)하고 하늘에 부르짖으니 성대하고 용감하며 굽히지 않는 강한 의기는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고 빛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인립(仁立) 부자(父子)의 적군(敵軍)과 싸우다가 전사(戰死)한 상황을 널리 알리니 장희춘(蔣希春) 서인충(徐仁忠) 윤홍명(尹弘鳴), 유 정(柳汀) 등이 듣고 탄식(嘆息)하기를 " 우리 향토의 의사(義士)가 어찌 그리도 많은가? " 하였으며, 유 백춘(柳伯春), 이 눌(李訥) 또한 크게 탄복하여 칭찬하고 초유사(招諭使)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였고, 전후 사림(士林)의 청원장(請願狀)과 감영(監營)과 읍의 회신서가 두루마리를 만들만큼 많이 쌓여 있으며, 공론을 다시 모으지 않아도 저절로 한가지로 따르며, 읍지의 기록과 훈권의 기록이 이과 같이 명백(明白)하여 사실을 다시 찾아 모으지 않더라도 충분히 증거가 될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도광(道光) 19년 12월 25일 이조(吏曹)에서 올린 회보하는 장계에 붙어이쓴 지난번 본조(本曹)의 장계에 박 언복(彦福)과 그 아들 인립(仁立)의 임진란(壬辰亂)에 순절(殉節)한 상황은, 전자(前者)에 비록 도(道)의 심사와 예조의 답신이 전조(前朝)에 있었습니다마는, 격식과 관례에 어긋남이 있어 그대로 의거하기 곤란하므로 신중히 심사하는 방도는 다시 본도(本道)로 하여금 실상을 조사하도록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성상(聖上)께 아뢰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의사(意思)를 상신하여 윤허를 받아 당해도신(當該道臣)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경상도(慶尙道) 전 감사 김 도희(金道熹)의 장계(狀啓)를 살펴보니, 원정 (院正) 인립(仁立)이 함께 적국을 토벌한 사실은 공훈록권(功勳錄卷)과 읍지(邑誌)의 명백(明白)한 기록과 전후(前後) 사림(士林)의 청원서장(請願書狀)과 감영(監營)과 본읍(本邑)의 회신서가 책과 두리마리를 이룰만큼 많이 쌓여 있으며, 공론을 다시 모으지 않더라도 충분히 증거가 될만하여 명백(明白)한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 명령하여 처리방안을 아뢰라고 하시온 바,
울산(蔚山)의 고(故) 첨정(僉正) 박언복(朴彦福)과 그 아들 고(故) 정(正) 인립(仁立)의 순의(殉義)한 사적이 과연 도신(道臣)의 보고내용과 같으니,
마땅히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되오나 은상(恩賞)에 관계되어 신(臣)이 감히 마음대로 할수 없기에 성상(聖上)의 재가여부를 아뢰오니 장계한대로 실시여부는 명령에 좇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원문 및 번역문>
114쪽)
< 풀이>
* 편집자 주(註) : 나라에서 박언복(朴彦福) 공(公)과 박인립(朴仁立) 공(公)에게 임난 공신의 은전(恩典)이 내려 졌는데, 1832년 9월에 박언복 (朴彦福) 공(公)의 6대손 박사익(朴思翼) 공(公)이 서울에 올라가 순조에게 직접 상언한 이래 임금이 바뀌고 8년만의 일이었습니다.
[贈牒謄本(증첩등본)]
*
교지(敎旨)
行 禦侮將軍
訓鍊院 僉正
朴彦福 贈 嘉善大夫 兵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訓鍊院 都正 /
道光 二十年 八月 日
행 어모장군 훈련원 첨정 박언복 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 도정 /
도광(道光) 이십년 팔월 일<1840년
헌종 6년>
忠節卓異 贈職事承 傳 判下
충절탁이 증직사승 전 판하
◆ 행 어모장군(3품 당하관) 훈련원 첨정(종4품) 박언복에게 가선대부(종2품) 병조참판(병조판서 다음의 직책)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 도정을 증직함. 충절이 특별히 뛰어나 증직한 일을 왕명을 받들어 전함. <판하(判下) ---왕의 재가(裁可)>
*
교지(敎旨)
行
禦侮將軍
訓鍊院 正
朴仁立 贈 通政大夫 兵曹參議者 /
道光 二十年 八月 日
행 어모장군 훈련원 정 박인립 증 통정대부 병조참의자
도광(道光) 이십년 팔월 일 <1840년
헌종 6년>
忠節卓異 贈職事承 傳 判下
충절탁이 증직사승 전 판하
◆ 행 어모장군 훈련원 정 박인립에게 통정대부(3품 당상관) 병조참의(정3품)를 증직함.
충절이 특별히 뛰어나 증직한 일을 왕명을 받들어 전함.
<연이어서>
贈 通政大夫
兵曹參依 朴仁立 贈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 經筵參贊官 / 道光 二十年 十一月
日
증 통정대부 병조참의 박인립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 도광(道光) 이십년 십일월 일
精忠純孝 撑宙貫日 贈職事承 傳 判下
정충순효 탱주관일 증직사증 전 판하
◆ 통정대부 병조참의 박인립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으로 증직 함.
순수한 충성과 지극한 효성이 이 우주를 떠받치고 태양을 관통 할만 하여 증직한 일을 왕명을 받들어 전함.
116쪽)
* 편집자 주(註) : 우여곡절과 천신만고 끝에 나라에서 박언복(朴彦福) 공(公)과 박인립(朴仁立) 공(公)에게 증직의 은전이 내려졌고 그 사실을 고인 의 무덤앞에서 눈믈로 고하는 모습입니다.
< 풀이 >--- 증직(贈職)한 내용을 그대로 황마지(黃麻紙)에 적어 보낸 것을 죽은이의 무덤이나 사우에서 아뢰고 불태우는 글.
전 승지(前 承旨) 여강(驪江) 이진상(李珍祥)이 씀.
삼가 생각하오니 극 선(郤 詵) 같은 훌륭한 시재가 있어 일찍부터 성품이 돈독하였고, 반고(斑固)같은 뛰어난 문장은 그 묘한 이치에 능히 통하여 명성을 떨쳤습니다. 난세를 만나지 않았든들 평소의 충성심(忠誠心)을 어디에다 갚았겠습니까? 임금님께 원수가 있으면 내 몸 또한 살아 있을 수 없다고 맹서(盟誓)하고 큰 칼 빼어들고 외치면서 돌격하니 적대군의(敵大軍) 진격을 머뭇거리게 하였습니다.
진군을 재촉하는 북소리는 바야흐로 용기를 떨치게 하는데 적탄은 어찌하여 의사(義士)의 가슴에 맞았습니까? 치솟아 오르는 용감한 정신은 우주를 떠받치고 하늘을 관통할 것 입니다. 훈권에 기재된 내용은 백년을 어제같이 보존되어 왔으니, 나라의 은상(恩賞)이 없었던 일은 공(公)의 공훈에 손익(損益)됨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둠속에 매몰되어 세상의 공론이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함이 때가 있는 법이온데 태양같은 성은이 다시 밝아져 병조(兵曹)의 차관(次官)에 증직(贈職)한다는 빛나는 조서가 내려,
부자(父子) 함께 포상(褒賞)이 되었으니 영광이 자하의 영위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좋은 날인 정일(丁日)을 가려서 조서의 부본인 황마지(黃麻紙)를 불살라 삼가 고유(告由)를 하옵니다.
못난 후손들은 왕명을 받들게 되어 감격의 눈믈이 절로 흐르고 만감이 가슴에 교차합니다. 삼가 묘역에 와서 깨끗이 쓸고 위대한 공훈에 대한 빛나는 증직(贈職)을 예식에 의하여 아룁니다.
1) 극시((郤詩)...참판공(參判公)의 시(始)에 대한 재능을 중국 진의 극 선극 선(郤 詵)에 비유한 듯?
* 극선(郤 詵) --.진(晋) 무제(武帝)때 현량과에 일등으로 선발 되었으나, 무제의 물음에 대하여 자신은 문사(文士)들 중의 한 나뭇가지와 같으 며. 곤산(昆山)의 옥돌 가운데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겸손하였고 뒤에 명성을 크게 떨쳤음.
2) 반필(班筆)...중국 후한(後漢) 초기의 유명한 역사가이며 문장가인 반고(斑固)의 문장에 참판공(參判公)의 문장재능을 비유한 것.
* 반고(斑固)...당대에 제일가는 역사가 문장가로 이십여년에 걸쳐 한서(漢書)라는 역사책을 저술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옥사하여 그의 누이인 반소(班昭)가 보완하였으며, 백호통(白虎通), 양도부(兩都賦) 등 많은 명저(名著)가 있음.
3) 자고(紫誥)...조서(詔書). 왕명을 적은 글.
4) 황마(黃摩)...조서(詔書). 여기서는 그 부본(副本)
119쪽)
< 풀이 >
삼가 생각하옵니다. 충신(忠臣)은 효자가문(孝子家門)에서 구하고 효자(孝子)는 충신(忠臣) 집안에서 얻는다고 하였으니, 충효(忠孝)가 일치되어야 두 가지가 완전하게 되며 충효(忠孝)는 서로 기운이 통한다고 합니다. 부공(父公)은 나라를 위해 순국(殉國)하였으니 누구를 의지 할 것이며 가매장(假埋葬)을 겨우 끝냈으나 내가 설 땅이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칼을 뽑아 크게 외치고 죽어야 할 때를 구하여 죽음을 얻었으나 적군(敵軍)을 남김없이 모두를 무찌르지 못한것이 원통하여 사후에도 눈을 감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충효(忠孝)는 온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보여 주었건만, 나라의 포상(褒賞)은 서두르지 않아 오랫동안 억울하다는 공론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에 훈권(勳卷)을 고증(考證)하여 예조(禮曹)와 이조(吏曹)가 백세를 기다려 왔는 것 같이 주청하여 성상(聖上)으로부터 병조(兵曹)의 빛나는 관직(官職)을 증직(贈職)하라는 명령이 내렸으며, 또한 높으신 은전(恩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성주(聖主)께서 크개 칭찬하시어 다시 승지로 증직(贈職)하시고 우주를 떠받치고 태양을 관통할만한 충절(忠節)이 높다는 조서(詔書)가 내려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고유(告由)할 길일을 의론하여 맹동(孟冬)의 정일(丁日)에 삼가 묘역(墓域)의 언덕에 오르니 못난 후손(後孫)들 감명이 더욱 깊어집니다.
* 우고(右告) 승지공(承旨公)
26-陵 幸行時 慶尙道 儒生 上言(릉 행행시 경상도(慶尙道) 유생 상언) <원문보기☞ 원문① 원문② > top
122쪽)
< 풀이 >--- 철종 13년, 임술(壬戌-1862) 3월에 경상도 유생(儒牲)들이 상언(上言)한 내용.
* 편집자 주(註) : 경상도 유생들이 증(贈) 참판(參判) 박 언복(彦福), 증(贈) 승지(承旨) 박 인립(仁立)에게 관직(官職)을 더욱 높여 주시는 은전(恩典) 을 베풀고, 푸시고, 고(故) 판관(判官) 김득례(金得禮)에게도 증직(證職)의 은전(恩典)을 내려달라고 상소합니다.
삼가 아뢰옵니다. 충신(忠臣)을 포상(褒賞)하고 절의(節義)를 장려함은 조정(朝廷)의 성대한 의식이고, 숨겨진 선행을 밝혀 내고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충절(忠節)을 드러나게 하는 일은 사림(士林)의 공론 일것입니다. 신들의 살고있는 곳인 도내(道內)에서 고(故) 순절인(殉節人) 증(贈) 참판(參判) 박 언복(彦福)과 그의 아들 증(贈) 승지(承旨) 인립(仁立), 고(故) 판관(判官) 김득례(金得禮) 3인은 의리에 맞도록 행신하는 선비로서, 임진년 왜적들이 미쳐 날뛰던 때를 당하여 3인은 동시에 의병(義兵)을 일으켰습니다.
4월13일 동래부가 함락당한 뒤에는 언복(彦福)과 그의 아들 인립(仁立) 및 김득례(金得禮)는 피란인 중에서 수백인을 불러모아 의병(義兵)을 일으켜 권 응수(權應銖) 진영(陣營)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적군(敵軍)을 소등대교(所等大橋) 아래서 만났습니다.
언복(彦福)이 그의 아들과 김득례(金得禮)에게 말하기를" 신하가 된 자는 맹서(盟誓)코 적군(敵軍)과는 함께 살수 없으니 여기가 우리들의 죽을 곳이라" 하고 모두가 함께 몸을 빼어 돌격하여 수백의 적군(敵軍)을 쳐죽여서 경주 울산(蔚山) 지방에 침입할려는 적을 방지 하였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언복(彦福)은 적탄에 맞아 먼저 전사(戰死)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인립(仁立)이 또한 말하기를 " 부공(父公)은 나라를 위하여 전사(戰死)하였으니 자식이 아비의 원수를 갚고자 죽는것도 또한 동일한 일이라" 하고 곧 칼을 뽑아 크게 외치기를 " 너희들 왜적들아! 나를 알겠느냐? 지난날 대교하에서 순절(殉節)한 분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칼을 받아라" 하고,
곧 바로 적진(敵陣)에 뛰어 들어 백여의 적군(敵軍) 머리를 베고 자신 또한 삼십여 군데의 부상을 하고 전사(戰死)하였으며, 김 득례는 그 부자(父子)가 나란히 목숨바친 것을 보고 실성하도록 통곡하여 말하기를 " 우리 3 인은 사생을 함께 하자고 결의 하였는데, 아아! 슬프도다!!
저 부자(父子)가 함께 적군(敵軍)에게 전사(戰死)하였으니 내 비록 죽지 못하고 구차하게 살았으나 살아서 또 무엇하리요" 하고 적진(敵陣)으로 돌격하여 적군(敵軍)의 머리를 베고 포로로 붙잡은것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으며,
또한 정유재(丁酉再亂)란 때에도 싸우다가 적병중에서 순절(殉節)하였습니다. 대개 박 언복(彦福) 부자(父子)와 김 득례가 순절(殉節)한 실적은 울산읍지(蔚山邑誌)에 소상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선무원종(宣武原從) 1, 3등공신록권(一三功臣錄卷)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박 언복(彦福) 부자(父子)는 아직도 정경(正卿)의 관직(官職)을 받지 못하였으며, 김 득례(金得禮) 또한 증직(贈職)의 은전(恩典)를 입지 못하여 장차 초목과 같이 썩어 없어지고, 또한 중인의 앙모하는바까지 없어지게 된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臣)들은 부월(斧鉞), 도끼로 처 죽이는 형벌을 피하지 아니하며 만번의 죽음과 혹심한 형벌을 무릅쓰고, 삼가 호소문을 백성의 통행을 금하고 있는 행행(行幸) 하시는 길 아래에서 올리오니 엎드려 비옵건데, 천지안의 만백성의 부모이신 성상(聖上)께서는 유사(有司)에게 특명을 내리시어
증(贈) 참판(參判) 박 언복(彦福), 증(贈) 승지(承旨) 박 인립(仁立)에게 관직(官職)을 더욱 높여 주시는 은전(恩典)을 베푸시고,
고(故) 판관(判官) 김 득례(金得禮)에게도 증직(贈職)을 내려 주시는 은전(恩典)을 또한 베푸시어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풍속을 바로 세우고 교화(敎化)를 장려하게 하옵소서! 하늘 같은 성상(聖上)의 은택을 입어 엎드려 아룁니다.
* 유생명첩(儒生名帖)은 성명임으로 번역 생략.
127쪽)
< 풀이 >--- 이조에서 내린 회답 공문
* 편집자 주(註) : 경상도 유생들이 올린 상소문이 가(可) 하다는 판단 아래 이조((吏曹))에서 임금에게 임난공신 3인에 대하여 증직(贈職)의 은전(恩 典)을 내리도록 아룁니다.
성상(聖上)의 재가를 받아 내려 보내신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지난번 청원문을 올린 경상도(慶尙道) 유생(儒牲)등이 기한내에 직접 나와서 호적등본을 제출하였으니 청원한 일은 틀림 없이 확실합니다. 이 청원문을 보니 울산 고(故) 순절인(殉節人) 증(贈) 참판(參判) 박 언복(彦福)과 그의 아들 증(贈) 승지(承旨) 박 인립(仁立)에게 증직(贈職)의 관계를 더 높여 주고,
고(故) 판관(判官) 김 득례(金得禮)에게도 포상(褒賞) 증직(贈職)을 내려 달라는 호소를 한것이었습니다. 박 언복(彦福) 부자(父子)와 김 득례(金得禮) 3인은 임진년 왜적이 미친듯이 날뛰던 때를 당하여, 동시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신명을 받쳐 적군(敵軍)을 방어하여 적의 대군을 만나 용맹을 다하여 적과 싸우다가 언복(彦福) 부자(父子)는 동시기에 전사(戰死)하고 ,
김 득례(金得禮)는 정유재란 때 추후에 순절(殉節)하였으니 영원히 변치 않은 곧은 충성(忠誠)과 높은 절조는 우주를 떠받치고 태양을 관통 할 만하여 함께 공훈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억울하다는 공론이 오래되어 이와 같은 많은 사림(士林)들의 진정이 있게 되었으며 실적이 소상하게 나타나 있음을 볼수 있으니,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풍속을 바로 세우고 교화(敎化)를 장려하는 올바른 길이 되도록 함께 증직증직(贈職)의 관계(官階)를 더욱 높여 주시고 통상의 순서를 뛰어 넘는 높은 관직(官職)에 오르는 증직(贈職)을 주시는 은전(恩典)을 베푸심이 사리에 알맞을 것 같사오나, 은전(恩典)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臣) 이조(吏曹)가 감히 마음대로 처결 할 수 없어 성상(聖上)의 재가여부를 회보 주청하오니 교령(敎令)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원문 및 번역문>
* 편집자 주(註) : 나라에서 경상도 유생들의 상언(上彦)을 받아들여 박 언복(朴彦福), 박 인립(仁立) 양세(兩世) 의사(義士)에게 관직(官職)을 더욱 높여 주시는 은전(恩典)을 베풀었습니다.
[가 증첩등본(加 贈牒謄本)])
*교지(敎旨)
贈 嘉善大夫 兵曹參判 朴彦福 加贈 資憲大夫 兵曹判書 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 都摠官者 / 同治元年 十月 日
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박언복 가증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자 / 동치원년 시월 일<1862년>
壬辰殉義之節施以加 贈正鄕事 判下
임진순의지절시이가 증정향사 판하
◆ 박언복 공을 가선대부 병조참판(종2품)에서 자헌대부 병조판서(정2품)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가증 함.
* 교지(敎旨)
贈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 經筵參贊官 朴仁立 加贈 嘉善大夫 兵曹參判者 / 同治元年 十月 日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박인립 가증 가선대부 병조참판자 / 동치원년 시월 일<1862년>
◆ 박인립 공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서 가선대부 병조참판(종2품)으로 가증 함.
<연이어서>
* 교지(敎旨)
贈 兵曹參判 朴仁立 贈 兵曹判書 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 都摠官者 / 同治二年 十月 日
증 병조참판 박인립 증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자 / 동치이면 시월 일<1863년>
忠節卓異 贈 正鄕事 判下
충절탁이 증정향사 판하
◆ 박인립 공을 병조참판에서 병조판서(정2품)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가증 함.
131쪽)
< 풀이> --- 증직(贈職)한 내용을 그대로 황마지(黃麻紙)에 적어 보낸 것을 죽은이의 무덤이나 사우에서 아뢰고 불태우는 글.
이조판서(吏曹判書) 안동(安東) 김병국(金炳國) 씀.
일반사람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절의(節義)는 충효(忠孝)를 최우선적으로 예거(例擧)합니다. 충효(忠孝)는 비록 두가지 이치가 없지마는 양자를 완전히 실천하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공(公)의 집안은 대대로 번성하여 명망높은 가문이 되었으니 중국 곤륜산(昆崙山)에 있다는 신선집에 진귀한 옥이 쌓여 있듯 고관대작이 배출되었고 전단목(旃檀木)의 높은 향기처럼 명성이 자자 하였습니다.
아아! 저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남방의 왜적이 침입하니 만백성들은 모두가 도망하여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고, 팔도...전국이 무너져서 흉포한 적군(敵軍)의 창칼을 막지 못하여 기와가 부수어지듯 적의 진격이 물밀듯 파급도어 갔습니다. 공(公)은 이런 때에 의병(義兵)을 일으켰는데 아버지의 교시를 자식이 잘 준수하여 분연히 앞장서서 한번 크게 외치니 따르는 용사가 구름같이 많이 모여 들었으며,
대화는 순박하였으나 피는 들끓었고, 무기가 없는 빈주먹이지마는 기세는 드높아 쇠뇌같은 강궁(强弓)을 장치한것 같았으며, 충성(忠誠)을 맹서(盟誓)하여 진중으로 모여든 용사는 고슴도치의 털같이 많았지마는 아무도 발꿈치를 되돌려 떠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싸우는 힘이 다하고 형세가 급박해져서 마침내 신명을 바쳐서 전사(戰死)하니, 병사들은 울부짖으며 통곡하여 곡성이 멀리까지 서로 들렸습니다.
일반백성들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분기가 생겨 났으며, 저 오후(吳侯) 손 책(孫策)이 조 조(曹操)를 쫓아내고 한의 제위를 복위시켜려다가 발각되어 살해당하여 천추에 원한을 품는 것같이 참으로 원통한 순절(殉節)을 하였습니다. 충의심(忠義心)과 용기가 함께 맹렬히 일어나 격노하여 곤두선 머리카락이 갓을 찌를듯 하고, 복수할려는 마음이 급박하여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섶 (땔나무)위에 누워서 맹서(盟誓)하면서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 목적을 달성했다는 고사를 본받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급히 서둘러 임시로 장사를 지내고 즉시 적군(敵軍)진영으로 돌격하여 만나는 적군(敵君)은 반드시 섬멸하겠다고 분을 못이겨 이를 갈면서 진격하였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또한 젊은 연세에 순국(殉國)하는 혼령이 되었습니다. 대천(大川)의 한 처소에 부자(父子)가 나란히 순절(殉節)하였으니 밝은 태양이 빛을 잃고 흘러가는 구름도 슬퍼하며 내리는 비도 어둠침침하였습니다.
만고에 본받을 떳떳한 법이 되고 한 집안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였으니, 그 누가 의사(義士)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누가 인덕있는 선비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고아가 된 자식과 홀로 된 아내는 근근히 살아 남았으니, 조상의 빛나는 공훈을 드러낼 사람이 없어 사적이 파묻혀 일컬어 기리지 않은지가 삼백년이나 되었습니다마는, 그 성대하고 찬란한 빛은 마침내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림(士林)이 탄식(嘆息)하고 억울함을 서로 의론하여 향토(鄕土)에 사당(祠堂)을 세워 부자(父子)를 함께 뫼시니,
의식절차가 정성스러운데 사당(祠堂)의 이름은 반곡사(盤谷祠)라고 하였습니다. 우러러 사모하는 공론이 계속되어온지가 이미 오래되어 청원하는 상소가 성상(聖上)에게 올라가, 조정(朝廷)에서 충의(忠義)의 풍속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융성(隆盛) 포상(褒賞)이 더욱 두터워져 정경(正卿)으로 증직(贈職)하시는 은전(恩典)이 내려 가장 높은 관직(官職)에 오리게 되었으니, 빛나는 은총과 두터운 은전(恩典)을 입어 저 세상의 혼령에게도 다시 알리고 곧 사당(祠堂)을 중수(重修)하여 세대를 이어 영원히 옮기지 않는 신위(神位)로 받을게 되었으니,
호남, 영남 지방에서 명예가 대성하게 떨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훌륭한 업적에는 경사가 후대까지 미쳐지는 법이어서 뛰어난 후손(後孫)들이 남기신 공적(功績)을 이어 받아 무예가 출중하여 서반(西班)의 무관(武官) 관직(官職)에 올라, 국가(國家)의 뛰어난 동량이 되어 선대의 꽃다운 명성을 거듭 드러내었으며, 다시 성은을 입어 그 위에 관계를 더하여 높은 반열에 오르는 왕명이 계속 내리니 그 광영이 이웃과 고을까지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당(祠堂)의 위패(位牌)를 다시 고치고 축문으로 아뢰오니 임금이 없으면 충성(忠誠)을 바칠데가 없고 어버이가 없으면 효성(孝誠)을 드릴데가 없으니 공을 받드는 후인들은 이 사적(事蹟)을 영원히 전할 것입니다.
卷之二(권지이)
<원문>
盤谷祠 常享文(반곡사 상향문) 憲廟六年 庚子 建 0 今(헌조육년 경자 건 0 금) 東萊 鄭宅升(동래 정택승)
鶴山公 倡義殉軀凜 有生氣百世 膽禋享勿替
학산공 창의순구름 유생기백세 담인향물체
135쪽 풀이)
의병(義兵)을 일으켜 순절(殉節)하시니 의젓하고 꿋꿋한 기재는 생동하는 것 같사옵니다. 영원토록 삼가 우러러 뫼시어 정성드려 받드는 제사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원문>
聽水軒公 精忠純孝 流芳誥冊百世之下想像靡
청수헌공 정충순효 유방고책백세지하상상미
前人(전인)
136쪽 풀이)
한결같은 순수한 충성(忠誠)과 지극한 효성(孝誠)은 꽃다운 명성을 후세에 남기고 관직(官職)을 내리는 고척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영원한 후세까지라도 충효(忠孝)에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1)고책(誥冊)...2 품에서 5 품까지의 고급 관직자(官職者)에 주는 사령장(辭令狀)
31-盤谷祠 講堂 上樑文(반곡사 강당 상량문) <원문보기☞ 원문① > top
138쪽)
* 편집자 주(註) : 양세의사(兩世義士)를 봉향(奉饗)하는 반곡사를 창건하고 대들보를 안고서 동서남북 상하(東西南北 上下)를 두루 돌아보며,
의사(義士)님들에게 이 지방에 교화(敎化)의 덕풍(德風)이 흥성(興盛)하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祭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풀이> --- 후손(後孫) 진기(震琦) 씀.
몇 백년 전의 충효(忠孝) 사적(事蹟)이 어둠속에 파묻히지 않고 특별히 증직(贈職)을 내려 주시는 성은의 영광을 받들게 되었으니, 향읍(鄕邑)의 많은 인사들이 감격하고 앙모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 사당(祠堂)을 건립하니, 사적은 오래전에 지나갔지마는 꿋꿋한 장렬한 절개(節槪)는 더욱 환하게 빛나고 의론이 결정되어서 명당 터전에 자리잡은 사당(祠堂)은 훌륭한 모습니다.
삼가 생각하오니 학산공(鶴山公)은 타고나신 자품이 뛰어나 영걸(英傑) 스러웠습니다. 포악한 흉적이 들판을 뒤덮으며 침입을 하는것을 보고서 신명의 죽음을 돌보지 않고 번득이는 칼날을 무릅쓰고 적군(敵軍)의 섬멸...완전소탕을 하늘에 맹서(盟誓)하고 순국(殉國)한것은 오직 의기(義氣)를 평소에 쌓아 온것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청수헌공(聽水軒公)은 인륜(人倫)을 확고하게 세울것을 맹서(盟誓)하고 곧 이어서 적군(敵軍)의 흉포한 창칼날에 운명하였으므로 공훈권(功勳卷)에 명호(名號)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진(晋) 나라 때 변호(卞壺)와 그의 두 아들 '진'과 '우'가 함께 전사(戰死)하여, 흉악한 적군 두목의 간담을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 선열(先烈)의 순국(殉國)한 모습이 공(公)의 부자(父子) 순절(殉節)에 그대로 되살아난것 같습니다.
아! 양세(兩世)의 충의(忠義)로운 명성은 부자(父子)간에 이신전심으로 전해진 한결같은 깊은 충효정신(忠孝精神)에 유래된것이니 지사들의 감개가 더욱 절실하여 마치 한 쌍의 굳세고 씩씩한 혼령(魂靈)이 눈앞에 있는것 같습니다.
성상(聖上)의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이 너무나 늦어서 그 후 이백여년이 흐러 갔습니다. 근자에 와서 못나고 외로운 남은 후손(後孫)들이 과리를 울려 호소한 상소가, 마침내 깊은 궁중에 계시는 성상(聖上)의 은택을 입게 되어 한결같은 충성(忠誠)과 순수한 효성(孝誠)은 환하게 빛나서 우주를 떠받칠만 하다고 칭송하시는 왕명이 내리시고 빛나는 조서(詔書)는 무반(武班)의 가장 높은 관직(官職)으로 증직(贈職)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륜(人倫)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여러 유림(儒林)의 충정은 공(公)의 혼령(魂靈)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는 공론(公論)으로 크게 발전되어,
마치 물 흐르듯 여러 사람의 의론이 결정되었으며, 언양(彦陽) 울주(蔚州)) 지방의 이름난 좋은 곳에 장소를 잡기로 하여, 이에 계산(溪山)의 명승지에 터를 잡았습니다. 이미 높이 받들어 혼령(魂靈)을 편안하게 하는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이 있었으니 어찌 유생(儒生)들의 휴식하고 학문에 힘쓰면서 수양하는 처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잘 손질하여 다음은 대들보를 들어올리게 되어 이에 아랑위(兒郞偉)하고 외치는 축시(祝詩)를 지어 부릅니다.
*********************************************************
대들보를 들어 안고 동(東)쪽을 향하니
한 줄기 귀천(龜川) 시냇물은 변함 없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당시의 순절(殉節)한 꿋꿋하고 높은 절개를 알려고 하니
저 빛나는 태양은 천고에 걸쳐 불은 충성(忠誠)심이 비추고 있네!
대들보를 들어 안고 서(西)쪽을 향하니
산세가 높고 험하여 우뚝 솟은 가파른 바위에는 독수리가 살고 있네!
충절(忠節)을 사모하여 우러러 바라보니
고결한 풍채가 마치 눈앞에 계신 듯하여
가슴속을 가득채운 신령스러운 기운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네!
대들보를 들어 안고 남(南)쪽을 향하니
술을 따루어 가만히 올리고 생각하니 맑은 냇물에 달그림자가 잠기어 있어서
밝고 높은 충절(忠節)은 어름항아리를 언제나 깨끗이 씻어 놓은 것 같아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서로 더불어 본받게 하네!
대들보를 들어 안고 북(北)쪽을 향하니
높고 높은 운문산(雲門山)은 험하고도 웅장하구나!
하늘이 높은 봉우리 처음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높은 충성(忠誠)과 뛰어난 절개(節槪)가 국가(國家)... 대궐의 운명을 영원히 떠받쳐 주는 것 같네!
대들보를 들어 안고 위쪽을 향하니
넓은 하늘에는 해와 달, 별들이 생명을 생성하는 원기를 내보내어
돌고 도는 세상의 도리에는 그 나타나는 징험이 어긋남이 없으니
공적(功績)이 드러나고 숨겨지는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마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네!
대들보를 들어 안고 아래로 향하여 밝은 태양아래 큰길을 바라보니
사람, 수레들의 왕래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사당(祠堂)을 우러러 돌아보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일깨워 주는데, 높은 충절(忠節)에 눈물짓는 호걸남아(豪傑男兒) 들이 그 몇 사람인고?
삼가 바라옵나니, 상량(上樑)한 이후에 의리(義理)의 혼령(魂靈)과 충렬(忠烈)의 혼령(魂靈)은 해마다 드리는 제사(祭祀)를 잘 받드시고,
가정과 사회가 화락하고 평화를 누리며 교화(敎化)의 덕풍(德風)이 이 지방일대에 함께 흥성(興盛)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祭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
1)변호(卞壺)...중국 진(晋) 나라 사람. 시호(諡號)는 충정(忠貞), 젊을 때부터 명성이 높았음. 정사에 힘쓰고 공정하여 세속사에 휩쓸리지 않으니 명제가 깊이 신임하였으며 성제 때 태후가 섭정할 때 잘 보필하였고, 소 준(蘇俊)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거부하고 역전하다가 전사(戰死)하고 두 아들 '진'과 '우'도 동시에 순사(殉死)하였음.
2)위률(偉律)...아랑위(兒郞偉)하고 외치는 노래의 시(詩).
상량(上樑)할 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기 위하여 어기영차하고 부르는 소리. 상량문(上樑文)의 끝에 시(詩)를 붙여 동서남북 상하의 육장으로 하는데 글의 첫머리와 매장의 첫머리에 아랑위의 석자를 붙임. 여기서는 위자만 쓰고 다른 글은 생략되어 있음.
3)금슬시례(琴瑟詩禮)...거문고, 비파,시(詩)와 예의, 백성을 교화(敎化)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화(敎化) 방법(方法).
32-擬疏時 讚賀詩(의소시 찬하시) <원문보기☞ 원문① > top
143쪽)
< 풀이 >
부공(父公)은 충성(忠誠)을 위하여 순국(殉國)하고 자식은 효성(孝誠)을 위하여 순절(殉節)하였다.
천년토록 빛나는 변씨모(卞氏母)는 울면서 슬픈 일이지만 또한 장하다고 하였네!
아! 뛰어난 두 분 조선(祖先)은 그대로 능히 변씨(卞氏)를 본받았다.
멀리 떨어진 광대한 영남에 환하게 빛나는 풍속과 교화(敎化)를 세웠구나!
동시대에 충절(忠節)을 바치던 의사(義士)들은 증직(贈職) 혹은 정문(旌門)의 영전을 받았는데
공적(功績)이 드러나고 감춰짐은 시기가 다르니 못난 후손(後孫) 때문이라고 자책하여 비교 말아라.
그대들의 조선(祖先)은 충심으로 심신을 바쳐 인륜(人倫)을 다함을 즐거워 하였느니라!
---상소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여 찬양하고 축하 하는 시(詩).
대제학(大提學) 안동(安東) 김조순(金祖淳) 씀.
1) 변모(卞母... 앞에 나온 충신(忠臣) 변 호(卞壺)의 부인,
'진'과 '우'의 모인 배씨(裵氏), 두 아들의 시신(屍身)을 어루만지면서 고하여 말하기를 "아비는 충신(忠臣)이 되고 너희들은 효자가 되었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고 하였음.
2) 설도(楔棹)...작설(綽楔)의 착오인 듯? 충신, 효자, 열녀 등의 살던 곳에 그 선행을 표창(表彰)하기 위하여 세운 정문(旌門).
< 원문보기☞ 원문 145 면 / 146 면 / 147 면 >
* 증직(贈職)의 포상(褒賞)이 내려졌을 때 축하시(祝賀詩)
145쪽)
<풀이>
부자(父子)가 고상한 지조를 굳게 지켰으니, 충효(忠孝)는 충심에서 우러난 것이지 꾸민것은 아니었네.
명성과 풍모는 도의를 떠받쳐 일으키고, 높은 영광은 천륜을 지켰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당(祠堂)은 하리(河里)에 자리잡았고, 공훈을 이룬 고적은 항도(項島)의 함선(艦船)에 남아있네.
훌륭한 후손(後孫)들의 성력만으로 이루어졌을뿐만이 아니라 성상(聖上)의 포상(褒賞)으로 영원히 전하여 지리라.
1)경월(卿月)...궁중 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위(侍衛)의 신(臣)
2)항도선(項島船)...항도(項島)는 울산(蔚山)에 있는 섬. 항도(項島)에 있던 함선(艦船).
--- 월성(月城) 최 방(崔 玤)
146쪽)
< 풀이 >
왜적이 그 누구인가?
나의 갑옷을 단단히 하고, 당당한 충효(忠孝)의 양절(兩節)은 남쪽 변방에서 빛났다.
몇 백년 동안 사림(士林)들의 공론(公論)이 한결 같아서 빛나는 증직(贈職)의 천은이 있었네.
역사에 길이 기록될 굳센 정신은 한묘(漢廟)의 충신(忠臣)들과 비슷하고,
대천가에서 세운 공적(功績)은 큰 벽돌에 새길만하다네!
후손(後孫)들은 어진 조선(祖先)을 드러내어, 충효(忠孝)의 가훈을 대대로 빛내리라.
--- 여강(驪江) 이재로(李在潞)
147쪽)
< 풀이 >
충효(忠孝)를 가훈을 대대로 굳게 지켜, 대천변에서 기쁘게 순국(殉國)하였다.
사당(祠堂)을 이 땅에 세워 지극정성 받들고, 공경으로 포상(褒賞)하는 천은이 내렸다.
장사들은 조총에 맞서 싸울줄만 알고 흩어지는 적군(敵軍)은 거북선에 어쩔줄을 몰랐네.
전란의 경위를 익히 알고 있어서, 이백여년동안 그 공적(功績)을 언제나 창송하였네.
--- 완산(完山) 이교정(李敎正)
< 원문보기☞ 원문 148 면 / 149 면 / 151 면 >
148쪽)
< 풀이>
순절(殉節)하는 장부들이 몇사람이나 되겠느냐?
공(公)의 부자(父子) 특출한 충효(忠孝) 동해 변방에서 나타났다네!
성상(城上)에 번득이는 칼날은 위급하기 이를때 없는데,
해바라기 하늘 향하듯 충성(忠誠)에 불타는 신하 있었네.
영혼은 장순(張巡)을 따라 멸적하는 역귀(疫鬼)가 되고
심중은 조적(祖逖)을 좇아서 강중(江中)의 적선(敵船)을 치네
포상하는 은전(恩典)이 내려 가문이 빛나니, 만고에 꽃다운 명성이 역사에 전해 지리라.
--- 정택승(鄭宅升)
1)장 순(張巡)...중극 당(唐) 현종(玄宗) 때의 충신(忠臣).
군서(群徐)에 박통(博通)하고 병법에 능함. 안 록산의 난때 수양성을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어 잡히어 죽음.
2)조 적(祖逖)... 중국 진(晋) 원제(元帝) 때의 예주자사. 석 륵(石勒)이 반락을 일으켰을 때 토벌군을 이끌고 황하를 건널때 중원의 반란군을 평정치 못 하면 다시 황하를 건너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서(盟誓)하니 군중이 그 기개에 감복하였다고 하여 이어서 반란을 평정하였음.
149쪽)
<풀이>
선비는 곤란 할수록 지기(志氣)가 굳어지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이 폭풍우처럼 세차게 닥쳤네.
굳은 절개(節槪)는 이 조국에 갚음이 있었고, 효성(孝誠)은 드높아 태양까지 꿰뚫었네.
진주성(晋州城)을 읊은 시가에는 최장군의 칼날이 번쩍이고,
동래 앞바다에는 충성(忠誠)스런 정공(鄭公)의 함선(艦船) 있었네.
한 집안의 충효(忠孝) 두 절의(節義)는 천추에 빛나고, 높은 직함 특별히 내리시니 영원히 전(傳)하리라.
--- 밀양(密陽) 박상구(朴尙玖)
1) 최장검(崔將劍)---최경회(崔慶會) 절도사(節度使)의 의검(義劍)이라고 임의로 해석하였으며 다음의 정공(鄭公)도 같음.
*최 경회...선조(先祖)때의 문신. 호는 일휴당(日携堂), 시호(諡號)는 충의(忠義).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의병(義兵)을 일으켜 전라우도 의병장(義 兵將)으로 많은 전공을 세웠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戰死)하였음.
2)정공선(鄭公船)...정 발(鄭撥) 공(公)의 함선을 말한 듯?
*정발(鄭撥)...조선(朝鮮) 선조(先祖)때의 무신. 호는 백운(白雲). 시호(諡號)는 충장(忠壯). 임지왜란때 부산진 첨절제사(僉節制使)로 왜적과 싸우다 가 전사(戰死)하였으며, 동래의 낙안서원에 봉향되었음.
151쪽)
< 풀이>
나라위한 곧은 정성은 단단한 돌같은데, 남쪽 왜적이 동해 지방을 어지럽혔다.
일가의 충효(忠孝) 절개(節槪) 지하로 돌아가니, 만고에 빛날 인물 하늘이 내리셨다.
권 장군 진영으로 달려가 싸울일은 생각하였고, 혼령(魂靈)은 충무공(忠武公)의 거북선을 따라 갔다.
지금도 양대의 높은 공훈을 칭송하니, 그 위대한 업적은 영원토록 전해지리라,
---분성(盆城) 김사일(金思馹)
1)화산(花山)...권 응수(權應銖) 장군. 조선(朝鮮) 선조(宣祖)때의 무신. 호는 백운제(白雲齊) 시호(諡號)는 충의(忠毅). 무과에 급제하여 북변수비에 종사하였고 임진왜란(壬辰倭亂) 때는 의병(義兵)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워 선무공신(宣武功臣)에 책록되고 화산군(花山君)에 책봉되었음.
2)대려(帶礪)...영원하다는 말. 황하(黃河)가 띠처럼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처럼 평평하게 됨.
< 원문보기☞ 원문 152 면 / 153 면 / 154 면 >
152쪽)
< 풀이>
수많은 싸움에 호국의지는 더욱 굳어져서, 지금에 이르도록 동해지방에 칭송되고 있네.
왜란을 격퇴기개(擊退氣槪)는 온나라에 넘치고, 양대의 충효(忠孝)심은 태양처럼 밝았다,
나라의 포상(褒賞)이 너무 늦었고, 장렬한 재능은 대천(大川)의 함선(艦船)에도 나타났다.
성상(聖上)의 은전(恩典)이 거듭 증직(贈職)하시니, 차후에는 영광이 사적(思蹟)으로 전(傳)하여지리라.
--- 고창(高敞) 오상립(吳尙立)
1)인각회(麟閣繪)...전한 무제(武帝)가 기린을 얻는 기념으로 세운 집. 선제(宣帝)가 공신(功臣) 118인의 화상을 여기에 걸었음.
153쪽)
< 풀이>
금석을 꿰뚫을 성품과 한결같이 굳어서, 아들은 아비 위해 아비는 나라 위해 다같이 전사(戰死)하니,
인륜(人倫)을 실천함이 더할 수 없으며,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하여 천운에 응하였네!
산비탈은 높고 험한데 부자(父子)가 나란히 말을 달렸고, 흐르는 물소리는 군민의 화락(和樂)을 바라는 것 같네!
새로운 사당(祠堂)에 받들도록 나라에서도 포상(褒賞)을 내리시니, 태산이 평지로 되도록 위대한 공적(功績) 전(傳)해지리라.
--- 최한위(崔漢緯)
154쪽)
< 풀이>
임진왜침(壬辰倭侵)에 충성(忠誠)결의는 더욱 굳세어지고, 부자(父子)가 함께 격퇴한 계책을 의론하였네.
나라위한 정성은 간담(肝膽)을 땅바닥에 바르고, 성심을 다한 공렬은 어버이 은혜를 갚았다.
남겨진 업적(業績)은 반곡사당(盤谷祠堂)에 나타나 있고, 성대한 공훈은 항도(項島)와 대천(大川)에 남아있네!
충효(忠孝)의 포상(褒賞)은 성은의 내리심이고, 공업은 이백년간이나 숨겨지지 않고 전해져 왔네.
--- 한석규(韓錫圭)
< 원문보기☞ 원문 155 면 / 156 면 / 157 면 >
* 중간 전후 편집(重刊 前後 編輯 ) -증직의 포상이 내린 후의 축하시
155쪽)
< 풀이 >
순국(殉國)의 충의기개(忠義氣槪)는 더욱 굳은데, 완악한 적괴(敵魁)가 감히 침입하였네.
도덕의 기본이 되는 삼강(三綱)의 기본도덕(基本道德)이,
나라에 붙들어 세우니 만고에 빛나는 태양처럼 밝게 비치네.
절조가 굳은 사람은 공(公)의 충심을 알고, 황하에서 맹명(孟明)은 죽기를 맹서(盟誓)하였다네.
정경(正卿)의 증직(贈職)으로 두 혼령을 위로하니, 후세 사람들의 큰 감명은 영원히 전해지리라.
--- 제주(濟州) 고상규(高尙奎)
1) 맹명(孟明)...중국 춘추시대의 진인(秦人).
명(名)은 시(視). 정(鄭)을 정벌하다가 진인(晉人)의 공격을 받아 세 번이나 패하였으나, 목공(穆公)은 그를 다시 임용하여 진국(晉國)을 치게 하니 황하를 건넌 후에 타고 온 배를 불사르고 죽기로 맹서(盟誓)하고 싸워서 결국 승리하였음.
156쪽)
< 풀이 >
장사는 신명을 받쳐 충절(忠節)은 더욱 굳어지는데, 피비린내 나는 전운은 변방을 어지럽혔네.
우리 강토 삼천리를 침략에서 회복하니, 태양도 구만리 하늘에 밝게 비친다.
성상(聖上)의 두터운 은전(恩典)이 옛적의 충신(忠臣)에게 내려지고,
세상을 구한 뛰어난 공훈은 대천함선(大川艦船)에서 세웠다네.
두 혼령(魂靈)을 위로하는 노래는 오래도록 끊이지 않으니,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전하게 하라.
--- 여강(驪江) 이용구(李用久)
157쪽)
< 풀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효(忠孝)를 굳게 지키는데, 침략자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날뛰고 있네.
진영에서 달무리를 바라보니 충절의 기개는 더욱 살아나고,
가을의 무지개 기운은 화하여 바로 하늘을 바치는구나.
나라 위한 붉은 마음을 가슴속 깊이 품고 달려 오니, 패배하여 도망치는 적군괴수(敵軍魁首)는 바다의 함선에 있네.
부공(父公)의 충렬을 아들이 계승하여 성은을 입었으니 이 고장의 선비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게 하라.
--- 월성(月城) 최해진(崔海晉)
< 원문보기☞ 원문 158 면 / 159 면 / 160 면 / 161면 >
158쪽)
< 풀이>
특출한 부자도(父子道)는 지조가 굳었으니, 충효(忠孝)를 실천하여 변방에서 순절(殉節)하였네.
한 집안에서 충효(忠孝) 두 절개(節槪)를 지켜 세상에 빛나니, 2 품의 정경(正卿) 벼슬이 성은으로 내려졌네.
타고난 자질은 곧 난세를 평정할만 하였고, 깊은 시름은 항상 절박하여 물이 새는 함선을 보듯이 하였네.
정사(正邪)를 판단하는 군자들이 시문을 지어, 혁혁한 공훈과 명성을 영구히 전하는구나!
--- 고령(高靈) 김상태(金相泰)
1)교재(橋梓) : 교목(橋木)과 재목(梓木). 교목은 부도(父道). 재목은 자도(子道)에 비유. 또는 부자(父子)를 이르는 말.
159쪽)
< 풀이>
세상이 어지러우니 지기 굳음을 바야흐로 알겠고, 현인들은 예부터 한사(恨死)한 사람이 많았다.
군주가 위험에 처했을때 신하가 순국(殉國)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였으나
부자가 함께 순국하니 하늘도 감동하는 바이네.
백세에 빛날 꽃다운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추에 남는 한탄은 적선을 불사르지 못함이었네.
지금에 이르도록 남강에 떠있는 달빛은 공적(功績)의 증거가 되어 언제까지나 전하여 주네.
--- 청안(淸安) 이인혁(李寅赫)
160쪽)
< 풀이>
절개(節槪)와 의리(義理)는 당당하여 철석같이 굳은데, 섬나라 오랑캐가 감히 대천지방을 어지럽히네.
부자(父子)가 한가지로 충효(忠孝)를 다하니, 저 야만인들과는 같은 하늘아래 살수가 없었다네!
병란때는 항상 신명을 바치는 절개(節槪)를 보게 되고, 흉즁은 함선을 포용하는 하해 같았다.
성조(聖朝)에서 은전(恩典)이 성대하게 내리시니, 영남지방의 풍속을 교화(敎化)하여 백세에 전하여 지리!
--- 학성(鶴城) 이수만(李樹萬)
161쪽)
< 풀이 >
만번이나 죽더라고 달갑게 여기는 마음은 한결같아 더욱 굳고,
목숨을 바쳐 대교변(大橋邊)에서 몹시 괴로운 싸움하였네.
지금까지 충효(忠孝) 두 가지를 온전하게 실천하여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세우고 홀로 천륜을 지켰네!
백골은 비록 창해가에 썩은바 되었지마는,
영혼은 후손(後孫)들이 공적(功績)을 판목에 새겨 찬양하고,
성상(聖上)의 교지(敎旨)는 찬란히 빛나니 백세에 전하여지리!
--- 종후생(宗後生) 대진(大鎭)
< 원문보기☞ 원문 162 면 / 163 면 / 164 면 / 166면 >
162쪽)
< 풀이>
부자(父子)의 충효심(忠孝心)은 꼭 같아서 철석같이 굳어으며,
꿋꿋한 기상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한번 태어나서 의롭게 죽는일은 참으로 어려운데, 충효(忠孝)에 죽는 일은 천하에 막중하다.
그 옛날 전란이 있을 때 영걸이 있었으니, 저 바다에는 적군(敵軍)의 함성이 없었다네.
나라의 장서각(藏書閣)에는 공업이 기록되어 있으며, 포상(褒賞)하는 증직(贈職)이 내려 명성은 대대로 전해지리!
--- 파평(坡平) 윤무석(尹武錫)
163쪽)
< 풀이>
당당하게 성은에 보답하는 충의(忠義)심이 굳어, 생사를 함께 하여 같은 싸움터에서 싸웠네.
지략과 용기는 끝간데가 없고, 몸과 마음을 받칠려고 하늘에 굳게 맹서(盟誓)하였네.
어찌 나라위한 충절(忠節)의 굳은 의지가 아니겠느냐?
대천(大川)을 건너서 적을 무찌르려고 한 것에
나라에서 은전(恩典)을 내려 충효(忠孝)에 보답하니, 높은 명성은 천고에 전하리!
--- 경주(慶州) 이규홍(李圭泓)
164쪽)
< 풀이>
죽기를 맹세하니 큰 뜻은 더욱 굳은데, 재앙을 몰고 올 어두운 기운은 성하게 넘쳐 흐르네.
신하와 자식이 되어 그 직분을 다하기는 어려운데, 충효(忠孝)를 다하여 천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은전(恩典)이 골고루 미쳐 해마다 풍성하고, 전대(前代)의 전락을 말하면서 강을 건너가네.
후손(後孫)들이 추모하는 효성(孝誠)을 다바쳐서 가장 좋은 판목(板木)에 새겨 영원히 전하네!
--- 학성(鶴城) 이계수(李繼洙)
165쪽 )
<풀이>)
뛰어난 혼령(魂靈)과 의기(義氣)에 넘치는 영혼은 늠름하며 꿋꿋하여, 대천교(大川橋) 아래 강수(江水)가를 오르내리고 있네.
만고에 지켜야 할 삼강(三綱) 오상(五常)을 붙들어 세우니, 일월이 다시 하늘에서 밝게 돌아갈수 있게 되었네.
몸은 늙은 마씨(馬氏)처럼 시신(屍身)도 마씨(馬氏)처럼 갑옷에 싸일 것을 기약하였고,
조공(祖公)의 무공을 추모하여 함선의 노를 두드렸네.
증직(贈職)하여 태뢰(太牢)의 재물을 바치게 하니 변씨(卞氏)의 충효(忠孝)와 더불어 한가지로 전해지리라.
--- 동래(東萊) 정광호(鄭洸鎬
1) 마로(馬老)...마 원(馬援)의 노년기
*마 원... 중국 후한때 무신. 노년이 되어서도 갑주,갑옷으로 출전하도록 허락을 청하였다고 함. 교지국(交趾國)을 정벌하여 평정하였으며, 신식후 (新息侯)에 봉해지고 시호(諡號)는 충성(忠成).
2)조공((祖公)...중국 진(晉)나라 때의 조적(祖逖. 예주자사. 석륵(石勒)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황하를 건널 때 노를 두드리면서 적군(敵軍)을 토벌 하여 중원을 평정치 못하면 다시 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맹서(盟誓)하였음.
3)변문(卞門)...변 호(卞壺)의 가문.
변호는 중국 진(晉)나라 사람. 시호(諡號)는 충정(忠貞). 관직(官職)은 상서령. 소 준(蘇俊)의 반란을 막다가 전사(戰死)하고
그의 두 아들 '진'과 '우'도 한가지로 전사(戰死)하였음.
166쪽)
< 풀이>
난세를 당하니 애국의 결의가 굳어짐을 알겠고, 특출한 부자(父子)는 남쪽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켰네!
전란에 임하니, 죽음으로 맹서(盟誓)하여 충의(忠義)와 효성(孝誠)으로 천도를 다하였네.
증직(贈職)을 내리시니 성은은 더욱 넉넉하고, 바다 물에 병기 씻어 야만적선(野蠻敵船) 물리쳤네!
임진년의 지나간 사적은 누구에게 물을것이냐?
뛰어난 높은 충절(忠節)은 천추역사(千秋歷史)에 전하여지리!
--- 경주(慶州) 김영택(金永澤)
< 원문보기☞ 원문 167 면 / 168 면 / 169 면 / 170면 >
167쪽)
< 풀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서(盟誓)한 충성(忠誠)은 더욱 굳었고, 포상(褒賞)한 그 공적(功績)은 동해지방에서 떨쳤다네.
부자(父子)의 충효(忠孝)절개(節槪)는 이와 같이 빛나니, 군신사이의 중대한 의리(義理)는 천리 아님이 없네.
위엄이 감도는 진영(陣營) 벽에 걸어둔 칼은 바람결에 울고, 굳세고 씩씩한 혼백은 달빛어린 배위에 머무네.
동고(同苦)하시던 선조(先祖)의 세의((世誼)를 추모하오니, 더욱 교분을 두터이 하여 대대로 전하리!
--- 달성(達城) 서장진(徐章璡)
168쪽)
< 풀이>
곧은 충성(忠誠) 높은 절개(節槪) 빙옥같이 굳었음을, 천추 후에라도 짐작하리라.
의사(義士)들을 격려하여 전투를 할때, 국운을 바로 세우려는 결의는 하늘을 기우렸네!
목숨을 바쳐 충절(忠節)을 이룩한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앙모하니, 의병(義兵)이 두려워 도망치는 적선들 바다를 덮을 듯 하네.
양대에 내려진 성장의 은전(恩典)은 남다른 바 있고, 시중(市中)의 아로 들까지 지금도 공적(功績)을 전하고 있네!
--- 흥여(興麗) 박용건(朴容鍵)
169쪽)
< 풀이>
의사(義士)의 꿋꿋한 정신은 철석같이 굳고, 한 가문에서 충효(忠孝)의 두 절의(節義)를 대교변(大橋邊)에서 이룩하였네.
성심(誠心)은 임금과 어버이에게 바쳐서 남김이 없고, 천지신명이 증명하고 하늘까지도 감동하네.
불타는 정열은 바다를 뒤집어 불태울만 하고, 침몰하는 배위에서 몸을 던지는 일도 피하지 않았네!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은 자색(紫色)종이에 쓴 조서(詔書)에 빛나고,
충신(忠臣)을 표창(表彰)하여 정문(旌門)을 세우니 백세토록 전하여지리!
--- 경주(慶州) 이규원(李圭元)
1) 도설(棹楔)---작설(綽楔)의 오기(誤記)인 듯?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등이 있으면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表彰)함.
170쪽)
< 풀이>
순절(殉節)하는 그 누가 굳은 결의 않으리요? 생각건대 공(公)의 부자(父子)는 특출한 활약이었다.
즐거히 나라 은혜갚고자 살아남을 생각없었고, 흉포한 적군(敵軍)과는 같은 하늘 아래 살수가 없었네!
명성은 온나라에 떨쳐 세상의 기풍을 바로잡고, 위엄은 해변까지 퍼져서 적선을 물리쳤네!
한 가문에서 충효쌍절(忠孝雙節)은 천고에 빛나고, 높은 증직(贈職)을 받은 종적은 역사에 전하여지리!
--- 영산(靈山) 신동봉(辛東鳳)
< 원문보기☞ 원문 171 면 >
171쪽)
< 풀이>
박군(朴君) 병근(炳瑾)이 그의 선조(先祖) 학산(鶴山) 청수헌(聽水軒) 부자(父子) 양공(兩公)의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의병(義兵)을 일으켜 순절(殉節)한 사적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 조정(朝廷-나라)에서 양세(兩世)를 나란히 표창(表彰)하여 정경(正卿) 곧 판서(判書)로 증직(贈職)하시는 은전(恩典)이 내렸고, 또한 이름난 관직(官職)에 있는 귀인과 뛰어난 문장가의 전기(傳記)와 서문이 지난번 출간한 충효록(忠孝錄)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가위 한 벌의 확실히 기록된 서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청에 올린 문서중에 본도(本道) 유림(儒林) 신사(紳士)들의 성함(姓啣)과 증직(贈職)을 내렸을 축하하는 시문들이 우리 종가(宗家)의 책상자 속에 그대로 흩어져 남아 있으니, 이일은 참으로 선조(先祖)의 유업을 이어받아 후손(後孫)들이 넉넉한 복을 받을수 있도록 계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크게 한탄되는 바이다.
장차 이 충효(忠孝)록의 속간(續刊)을 모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한 이 시대 여러 군자의 서문 혹은 시가를 널리 구하여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니 당신은 어찌 한 말씀의 혜택을 베풀어 주지 않을가? " 하였다.
내가 꿇어 앉아 받아서 손을 씻고 삼가 읽어보니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아! 장하도다! 이공(二公)의 충효(忠孝)를 실천한 성대한 공적(功績)과 위대한 행실은 태양과 같이 빛나서, 백세가 지난 후라도 신하와 자식된 자의 마땅히 스승으로 삼고 모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슴 속에 깊이 느기는바 있어 문사가 서투른 것을 감히 잊어버리고 앞 시(詩)의 오운(五韻)에 맞추어 시를 지어 조상을 잘 받드는 후손(後孫)이 찾아 온데 대한 책임을 다만 면할까? 한다.
방패와 성곽이 되고자, 뜻은 철석같이 굳었고, 섬나라 오랑캐는 대양(大洋)가에서 함부로 날뛰네,
붉은 충성심(忠誠心)은 목숨을 돌볼 수가 없었고, 밝은 태양은 알아 줄 것이니 생사는 하늘에 달렸네.
관작(官爵)을 높이시며 화상을 기린각(麒麟閣)에 걸고, 애산(崖山)에서 패하여 함선(艦船)에서 눈물을 흘렸네!
성상(聖上)께서 영광 두 분 절의(節義) 미쳤으니, 역사에 기록 더욱 빛나고 영원히 전하여지리라.
--- 포산(苞山) 곽해진(郭海振)
1) 기란각(麒麟閣)... 중국 전한(前漢)의 7대 무제(武帝)가 기린을 얻었을 때 세운 누각. 9대 선제(宣帝)때 공신(功臣)의 화상을 게시하여
그 공적(功績)을 찬양하였음.
2) 애산(崖山)... 중국 광동성의 남족. 대해중에 있음. 송말(宋末) 장세걸(張世傑)이 제(帝) 병(昺)을 받들어 이 산에서 반군과 싸웠으나 원장(元將)
장홍범(張弘範)에게 패하니 육수부(陸秀夫)가 제(제)를 업고 바다로 들어가 죽었음.
< 원문보기☞ 원문 174 면 / 175 면 / 176 면 / 177면 >
174쪽)
< 풀이>
머나먼 시골에서 태어났으나 특출하여 세운 뜻은 굳었으며, 양공(兩公)의 장렬한 충효(忠孝)는 남쪽에 떨쳤네.
나라에 목숨바칠 굳은 각오 어찌 살아 남을 생각했겠느냐?
원수와는 같은 하늘아래 살수없다고 맹서(盟誓)하였네.
사당(祠堂)의 조성이 오히려 늦었으니,
혼령(魂靈)께서 백천년이 지나가도 떳떳한 법도는 언제나 있으니, 연속되는 축하시처럼 오래 전하여지리라.
--- 익성(益城) 배종택(裵鍾澤)
175쪽)
< 풀이>
삼강오상(三綱五常)은 몇 천년이 지나도 오히려 굳게 지켜, 신민(臣民) 들은 성상(聖上)을 태양 같이 우러러 바라보네!
충의(忠義)로 떨쳐 일어난 기개(氣槪)는 순절(殉節)할 곳을 알았고, 빛나는 증직(贈職)을 받들어 천은에 감격하네.
흰눈은 무덤 앞 송백(松柏)을 안고 있는데, 해 저문 섬의 백사장 저 멀리는 선박이 가물거리네.
효성(孝誠)은 반드시 충절(忠節)로 이어지는 법이라, 목숨을 바쳐 부공(父公)을 본받으니 영원히 전하여지네!
--- 달성(達城) 서장호(徐章顥)
176쪽)
<풀이 >
의사(義士)의 정성어린 마음은 철석같이 굳어서, 당당한 충성(忠誠)의 높은 공적(功績)은 위대하기 짝이 없네.
떳떳한 인륜(人倫) 위하여 부자(父子)와 함께 순절(殉節)하니, 나라에서 포상(褒賞)은 필연적인 갚음이네.
포구에서의 전투는 지난날의 역사가 되고, 위대한 공훈은 함선위의 맑은 달빛처럼 비추었네.
그 누구가 임진란(壬辰亂) 참상에 눈물이 없겠느냐? 조상들은 그 후손(後孫)에 고하여 대대로 전하리라.
--- 경주(慶州) 안효진(安孝進)
177쪽)
< 풀이>
충효(忠孝)의 충효심(忠孝心)은 당당하여 철석같이 굳어서, 대천제(大川堤) 아래 대교변(大橋邊)에서 왜적과 싸웠네.
오백년간 충성심(忠誠心)은 변함 없이 붉었고, 푸른 하늘에 맹서(盟誓)하여 삼천리 강토를 지켰네.
남달리 뛰어나 공적(功績)은 소상하게 역사에 기록되고, 장렬한 충혼은 늠름한 기세로 적선을 물리쳤네.
공(公)의 순국(殉國) 누가 능히 본받을 수 있겠느냐? 입에서 입으로 공경하는 그 마음 전(傳)해지리라.
--- 계림(鷄林) 김교인(金敎人)
< 원문보기☞ 원문 178 면 / 179 면 / 180 면 / 181면 >
178쪽)
< 풀이>
신명을 대의에 바치니 그 마음은 철석같고, 뜨거운 피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장막(帳幕)은 어둡기도 하네.
늠름한 의기(義氣)는 밝은 태양처럼 살아나고, 장렬한 기운은 하늘 가득히 퍼져있네.
가속(家屬)들을 영영 떠나 종묘사직(宗廟) 사직(社稷)을 붇들어 세우고, 의병으로 강상(綱常)을 바로 잡겠다고 맹서 했네.
효에 목숨 바치고 충에 순국하여 잘못된 역사에 기록되니 위대한 공적은 대대로 전하리라!
---
김해(金海) 김봉오(金鳳梧)
179쪽)
< 풀이>
목숨바쳐 죽기를 맹서(盟誓)하니 결심이 더욱 굳었고, 이공(二公)의 뛰어난 공적(功績)은 동해변에서 세워졌다네.
임진(壬辰) 계사(癸巳) 왜란이 국토를 뒤덮었을 때 이공(二公)의 충성(忠誠)은 태양처럼 빛났네.
기린각에 화상을 올려 거는 일은 오히려 늦었지마는, 맹서(盟誓)는 노를 두드린 고사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은전(恩典)이 내려 이제야 추모하는 고사를 지내니, 대대로 그 높은 덕행을 전할 것이리라.
--- 안동(安東) 김석한(金錫漢)
1)각화(閣畵)...전한(前漢)의 무제(武帝)가 기린을 잡은 것을 기념하여 세운 누각에 충신(忠臣) 화상을 선제(宣帝)가 걸었음.
2)격강(擊江)...진(晉)의 조적(祖逖)이 석륵(石勒)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강을 건넜을때 승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맹서(盟誓)
180쪽)
< 풀이>
전란은 갈수록 심하고 뜻은 더욱 굳어, 의기(義氣)가 동해지방에 떨쳤다고 일컬어지네.
성은에 보답하는 충성(忠誠)은 백세에 끝남이 없고, 높은 충절(忠節)은 하늘까지 감동하였네.
진주 성루에는 아직도 최장군 큰칼이 번득이고, 동래 바다엔 천고에 변치 않는 정공(鄭公) 함선이 떠 있다.
영광스런 양세(兩世) 공적(功績)은 역사에 기록되니 유림(儒林)들은 정성모아 받들고 전할 것이리!
--- 동래(東萊) 정경모(鄭敬謨)
1) 최장군...임진왜란(壬辰倭亂)때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戰死)한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 경회(崔慶會)
2) 정공(鄭公)...임진왜란(壬辰倭亂)때 전사(戰死)한 부산진 첨사(釜山鎭 僉使) 정 발(鄭撥)
181쪽)
< 풀이 >
신자(臣子)는 충효(忠孝)를 힘써 닦으니 듯은 굳건하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각지방을 어지럽히네.
붉은 충성심(忠誠心)은 위급한 때도 변치 않아 태양도 빛을 잃고 하늘도 감응하였다.
강상(綱常)을 바로잡아 백성 절개(節槪) 굳세게 하니, 뛰어난 공적(功績)은 냇물을 건너주는 뱃사공도 칭송하네.
성은(聖恩)은 높고 천추에 끝없을 것이니, 역사에 기록되어 영세에 전하리라.
--- 당성(達城) 서대규(徐大圭)
< 원문보기☞ 원문 182 면 / 183 면 / 184 면 / 185면 >
182쪽)
< 풀이>
충효(忠孝)를 평생 지켜 철석처럼 굳었고, 왜적의 전란은 하룻밤 사이 끝없이 번졌다.
국토가 뒤집혀 혼란이 극심하니. 부자양공(父子兩公)은 생사를 하늘에 맡겼네.
육신은 전사(戰死)하여 병마(兵馬)와 함께 하였으나, 충혼(忠魂)은 남도(南島)로 날아가 거북선을 지켰네.
이공(二公)의 뛰어난 공훈에 은전(恩典)을 내리시고, 훌륭한 후손(後孫)들이 공적(功績)을 후세에 전하네!
--- 고령(高靈) 박인엽(朴仁華)
183쪽)
< 풀이>
하늘에 맹서(盟誓)한 충성심(忠誠心)은 가슴속에 굳었고, 포악한 적장을 영남해안에서 베었네.
지하에 묻힌 두 분의 백골 살아 있듯 빛나고, 공적(功績)을 증명하는 사람들 있어 명백(明白)히 밝혔네.
국운이 급박하여 화살 쏘기가 바빴으니 어찌 적정(敵情)을 염탐할 겨를이 있었겠느냐?
충효(忠孝)의 모범으로 백성을 교화(敎化)하니, 빛나는 은총이 몇 차례나 내렸네!
--- 달성(達城) 서병직(徐秉直)
184쪽)
< 풀이>
위급한 국운에 다다라 충절(忠節) 의지는 굳었고, 대의를 위하여 당당하게 의병(義兵)을 일으켰네.
부자(父子)의 꿋꿋한 충성(忠誠)은 붉은 태양에 맹서(盟誓)하였고, 은전(恩典)이 내린 공적(功績)은 하늘도 감동시켰네!
뛰어난 공훈은 원종공신록(原從功臣錄)에 기재되어 있고, 장렬한 영혼은 해상의 함선으로 돌아갔네.
옛날 임진란(壬辰亂) 때의 모질게 고생한 일을 생각하니, 집집마다 원통한 눈물 흘러 지금까지 전하네!
--- 광주(廣州) 안효길(安孝吉)
185쪽)
< 풀이 >
방위하려고 신명을 잊은 떳떳한 마음은 굳었고, 전투는 치열하여 성곽 주변을 들끓게 하네!
충효(忠孝)의 높은 기개 태양빛과 다투고, 생사는 운명을 하늘에 맡겼네.
성은(聖恩)은 공신록(功臣錄)에 그 이름을 기재하였고, 기개(氣槪)는 바다건너는 적함(敵艦)을 압박하였네!
후손(後孫)들의 유지계승(遺志繼承) 마음껏 경하하오니, 위대한 총효법도 언제까지나 전하게 하라.
--- 달성(達城) 서장복(徐章福)
< 원문보기☞ 원문 186 면 / 187 면 / 188 면 / 189면 >
186쪽)
< 풀이>
아비는 충성(忠誠) 자식은 효도(孝道) 인륜도의(人倫道義) 굳었으니, 공명 정대한 기개(氣槪)는 꾸며서 되는 것은 아니다.
천고의 강상(綱床)을 붙들어 태양처럼 빛나니, 충의(忠義) 대절(大節) 위한 혼령(魂靈)을 하늘도 감동하네!
훈공에 대한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은 몇차례나 더하고, 나라 위한 높은 기개(氣槪)는 적들이 물러가는 배를 타게 하였네.
지난날 함께 의거하셨던 일을 사모하여 상심하게 되지마는, 조상의 남기신 정의를 양가(兩家) 더욱 돈독(敦篤)히 하세나!
--- 달성(達城) 서장대(徐章大)
187쪽)
< 풀이>
목숨바쳐야 할 위급한 곳에서 뜻은 더욱 굳었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 티끌을 깨끗하게 씻어 내었네.
삼천리 강토에는 찬란한 문화가 꽃피어서, 건국 이래로 올바른 도리(道理)를 받들어 왔네.
병영에서는 충성(忠誠)의 화살을 태양에 쏘아 올리고, 가슴 속에 나라 구제할 큰 배를 간직한 것 같네.
충신(忠臣) 전각에 걸어둔 화상은 변하지 않고, 양공(兩公)의 뛰어난 공적(功績)은 지금껏 전하여지네!
--- 동래(東萊) 정선호(鄭宣鎬)
188쪽)
< 풀이>
역사에 기록된 붉은 마음은 한결같이 굳어서, 지금껏 동해 남쪽에 그 명성이 퍼져있네.
차라리 화살을 분질러 간덩이를 땅바닥에 칠할지언정, 흉악한 적과 같은 하늘아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반곡(盤谷)에 있는 오래된 반곡사당(盤谷祠堂)에는 풀이 우거져있고, 대천(大川)의 전적지에는 병선(兵船)도 썩어버렸네.
공적(功績)이 숨겨지고 드러남은 원래 다른 것이 아니니, 성은(聖恩)이 거듭되어 영세에 전하여지리라.
--- 학성(鶴城) 이석만(李錫萬)
189쪽)
< 풀이 >
만번 죽기를 기약하니 충성심(忠誠心) 더욱 굳어, 날마다 태양처럼 실제로 나타내었다.
급박한 국운앞에 살아날 여지없고, 대의에 목숨바쳐 하늘 보답있었네.
풍우가 몰아쳐 대마도가 맑아지고, 혼령(魂靈)은 거북선 따라 이 강토를 지켰다.
성은(聖恩)을 입는 일이 어찌 그리 늦었느냐? 충효(忠孝) 가문(家門)의 명성(名聲)은 백세(百世)에 전(傳)해지리!
--- 김해(金解) 김기찬(金琪璨)
191쪽)
< 풀이>
가정(嘉靖) 29년,명종(明宗) 5년 정월 20일에 공(公)은 호남(湖南)湖南) 장성군(長城郡)(長城郡) 하남방(河南坊) 이아리(而莪里) 집에서 태어났다.
8 세에 입학하여 소학(小學)-.어린사람이 배우는 책명)을 통달(通達)하니 고향에서 소학동자(小學童子)라고 칭찬하였고, 13 세부터는 시전(詩傳), 서전(書傳) 주역(周易), 예기(禮記), 춘추(春秋) 등 유교(儒敎) 경전(經典)을 널리 공부하였다.
계해(癸亥)년, 1563년에 청하(淸河) 이씨(李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으며, 갑자(甲子)년, 1564년에 밀양(密陽) 신기리(新基里)로 이거 하였는데, 이 해에 아들 인립(仁立)을 낳았다. 선조(宣祖) 정유(丁卯), 1567년에 초시(初試) 곧 향시(鄕試)에 합격하였으나 복시(覆試)에 낙방한 후로는 무술(武術)을 익히는데 힘써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체력이 과인하더니, 신미(辛未)년, 1571년 22세에 무과(武科)에 올랐다.
갑술(甲戌)년, 1574년에 선고(先考) 봉사공(奉事公)의 상(喪)을 당하여 3년 여묘(勵墓) 살이을 하였다.
선조(宣祖) 갑신(甲申)년, 1584년 35세에는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으로 있었는데, 늙으신 자친(慈親)의 봉양(奉養)이 부족함을 이유로 청원을 올려 자친을 문안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없었으며, 이듬해인 을유(乙酉)년, 1585년에 대부인(大夫人) 숙인(淑人) 서씨(徐氏)의 상을 당하여 3년의 여묘살이를 하였고, 무자(戊子)년, 1588년 39 세에 울산(蔚山)으로 이거하였다.
임진(壬辰)년, 선조 25년 43세, 4월 13일에 외국의 침입으로 인한 병란이 크게 일어나, 동래성(東萊城)이 함락되고 여러 고을이 무너져서 저 왜놈 오랑캐들로 하여금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가는 것 같게 하였으니, 신하(臣下)된 자 자신의 생명만 도모하고 대의를 위하여 떨쳐 일어나서 적군(敵軍)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으며, 마땅히 죽어야 할 곳에서 죽으니 죽는 것 또한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곧 전 판관 김득례(前 判官 金得禮)와 의론을 하여 용감하고 건실한 자 수십백인을 불러 모아 의병(義兵)을 일으키고 , 아들 인립(仁立)으로 하여금 의병데(義兵隊)를 통솔하여 곧 바로 권 응수(權 應銖) 진영(陣營)으로 향하게 하였는데 갑자기, 소등대교(所等大橋) 아래에서 적의 대군을 만나게 되었다.
아들 인립(仁立)을 돌아 보고 말하기를 " 오늘날 같은 나라가 어지러워 흔들릴 때를 당하여 맹서(盟誓)코 적과 더불어 함께 살 수는 없으니, 나라를 위하여 대의에 죽는 것은 신하(臣下)의 절개(節槪)이다. 곧 나의 충절(忠節)을 세우는 때이니 너는 함부로 망령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을 온전히 하여 선조(先祖)의 높은 뜻을 이어받고 제사(祭祀)를 받들도록 하라" 고 하고
곧 몸을 빼어 적진(敵陣)을 향하여 돌격하여 나아가서 크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 무지한 벌레같은 왜놈들아! 나는 전직 첨정(僉正) 박 언복(彦福)이다. 너희들같은 흉악한 도적은 모기와 벌레같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곧바로 적진(敵陣)으로 뛰어 들어가 좌우로 충돌하여 마치 풀줄기를 베듯 수백 적군(敵軍) 머리를 베었고,
그 날랜 기세는 더욱 장렬하여 사방을 마음대로 달리니 적군(敵軍)이 그 뛰어난 용맹을 보고 바야흐로 흩어져 도망가려고 할 즈음에, 홀연히 유탄을 맞아 즉시 절명하니 군중이 모두 울부짖어 실성할 때, 동향의사(同鄕義士) 전 응충(全 應忠) 공(公), 김 흡(金洽) 공(公), 박 손(朴孫) 공(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병영(兵營)으로 향하다가 인립(仁立)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땅을 치면서 울부짖는 것을 보고는 탄식(嘆息)하기를
" 강토를 보위하는 대사(大事)를 더불어 함께 못하고 충절(忠節)의 의사(義士)를 잃은 것이 한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 이어 인립(仁立)과 더불어 산언덕에 임시로 매장하였다는 사적(事蹟)이 학성읍지(鶴城邑誌)에 기재되어 있다.
성상(聖上) 즉위(卽位) 4년, 갑자(甲子), 1804년 정월 상순, 7 세손 사현(思賢) 배수(拜手) 근서(謹書)
197쪽)
< 풀이>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절의(節義)에 목숨바친 사람과 병자호란(丙子胡亂)때 충의(忠義)에 죽은 사람들의 사적(事蹟)이 나란히 전해오는데, 그 충신(忠臣) 효자(孝子)의 높고 큰 업적을 자세히 바라보니, 그 중에 관직(官職)이 높고 사적(事蹟)이 현저한 사람은 국사(國史)에 이것을 기록하고 비석과 목판에 새겨 세상에 알렸으므로 기록되지 않는바가 없으나, 궁벽한 시골이나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서 충의(忠義)를 위하여 나라의 환란을 구하고자 달려나가,
죽는 것을 귀가(歸家)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널리 업적을 찾아내고 증빙(證憑)될 자료를 두루 모아서 그 충효(忠孝)의 절개(節槪)를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지 않으면 유적이 모두 없어질것이고, 만약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후세에 믿을만한 증거(證據)로 삼을것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특별히 전기(傳記)로 나타내는 바이다.
옛날에 ①사마 천(司馬 遷)이 지은 사기(史記)는 개인이 지은 역사 였으나 ②반 고(班 固)가 인용(引用)하여 정사(正史)로 삼았다. 그러나 그 책의
③형 가(荊 軻) 전(傳) 은 ④하 무차(夏 貿且)의 말을 인용 증거(證據)로 삼았고, ⑤항우(項羽) 전(傳)은 ⑥주생(周生)의 말을 증거(證據)로 삼았고, ⑦한 장유(韓長濡) 전(傳)은 ⑧호 수(壺遂)를 증거(證據)로 삼았고, ⑨상군(商君) 전(傳)은 ⑩개색(開塞) 경전(耕戰) 서(書)를 증빙(證憑)으로 삼았다.
나의 학산공(鶴山公) 전기(傳記)가 비록 정사(正史)는 아니지마는 후세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문자가 빠져 부족한 문장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나의 전기(傳記)를 증거(證據)로 삼는 것이 어지 하 무차(夏 貿且), 주생(周生), 호수(壺遂)등의 무리들과 같지 않겠으며, 또한 어찌 개색(開塞) 과 경전(耕戰)의 서책(徐冊)을 증빙(證憑)으로 삼는것과 같지 않겠느냐?
박 언복(彦福)은 호남(湖南) 세족(世族)으로 밍양(密陽)으로 이거(移居)한 후 다시 울산(蔚山)으로 이사하였으며, 자는 이겸(而謙)이오 호는 학산(鶴山)이며 조선국초(朝鮮國初)의 의사(義士)인 휘(諱) 승봉(承奉)의 후손(後孫)이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한 아동들과는 달라서 총명함이 동류 중에서 뛰어 났었다. 8 세에 문장의 뜻을 깨달아 통달하였고, 성인(成人)이 되어서는 체력이 남달리 굳세어 기마(騎馬)와 활쏘기에 능하였으며,
일찍 ⑪손오(孫吳)의 병서(兵書)와 ⑫태공(太公)의 병서(兵書)를 읽어 보고 크게 기뻐하여 이 책은 과연 대장부가 읽을만한 책이라고 하였으니 그 높은 뜻은 이미 억메이는데가 없없다. 임진년에 왜국의 대군이 침입하여 부산, 동래, 기장, 울산(蔚山) 등 네곳의 지방을 수비하던 진영(陣營)이 차례로 함락 당했을때, 병사(兵使) 이 각봉(李 珏奉)은 맨 먼저 도망가고, 부사(府使) 이 언성(李 彦誠)은 싸움에 패하여 전사(戰死)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들판에 시체가 쌓여 피가 냇물처럼 흐르고 국민은 새떼가 흩어지고 짐승무리가 달아나듯 하여, 남족 지방의 주군이 모조리 무너졌으나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에 언복(彦福)은 홀로 떨치고 일어나 신명을 돌보지 않고 이웃에 사는 판관 김 득례(判官 金 得禮)와 의론을 모아 적군(敵軍)을 피하는 여러 사람에게 두루 알리어 말하기를 " 왜적이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는데 우리들이 피하여 숨으면 이 나라는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느냐? " 하고 피란가는 곳마다 찾아 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니 모든 사람들은 감복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드디어 의병(義兵)을 모집하여 수백인에 이르렀고 동남 쪽의 적군(敵軍)을 방어(防禦)하였다. 그리고 그의 자식 인립(仁立)으로 하여금 의병(義兵)을 영솔하여 권 응수(權 應銖) 진영(陣營)으로 향하게 하였는데 갑자기 적군(敵軍)을 소등교(所等橋) 아래 방어(防禦)하던 곳에서 만나 싸우게 되었다.
아들 인립(仁立)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 나라를 위하여 충의(忠義)롭게 죽는 것은 신하(臣下)의 절개(節槪)이고, 적군(敵軍)과는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으니 나의 계책(計策)은 이미 결정되었다. 너는 망령(妄靈)스런 행동을 하지말고 돌아가 처자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조상의 제사(祭祀)를 이어 받아 받들도록 하여라" 하고
곧 칼을 빼어 들고 적진(敵陣)으로 돌격해 나아가 좌우로 충돌하니, 적군(敵軍)으로서 쓸어지지 않는 자 없었고 적군(敵軍)의 머리를 벤 것이 수백이나 되니 기세는 더욱 장렬해져서 사방을 마음대로 유린(蹂躪)하고 돌아 다녔다는데 애석 하게도 유탄에 맞아 전사(戰死)하였다. 그 아들 인립(仁立)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며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군중이 모두 울부짖어서 실성하게 되었을 때,
전응춘(全應春), 김흡(金洽), 박손(朴孫) 공(公)등이 바야흐로 절도사 군영으로 향해 가다가 인립(仁立)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안고 통곡하는것을 보고, 이에 그와 더불어 산 언덕에 임시로 매장을 하고 병영으로 함께 갔다. 그 후 대천제방(大川堤防)아래 이르렀을때, 적병의 대부대가 들판을 덮을 듯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인립(仁立)이 삼의사(三義士)(義士)에게 말하기를
"부공(父公)은 성상(聖上)의 신하(臣下)가 되어 신자(臣子)의 직분을 다하였으니, 내가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자식의 직분을 다하지 않을수 있겠느냐?" 하고 바로 적진(敵陣)으로 돌격하여 수백의 적군(敵軍)을 베었으나 도 또한 삽십여 군데의 창상을 입고 마침내 전사(戰死)하였는데,
진중에서 눈을 아직도 감지 않고 손에 쥔 칼도 놓지 아니하여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이 늠름한 생기가 있으니, 적군(敵軍)이 와서 그를 보고는 또한 그의 혼령(魂靈)을 두려워 하여 감히 그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대저 아비는 충의(忠義)에 목숨을 바치고 자식은 충효(忠孝)를 위하여 순절(殉節)하니 양세(兩世)의 충효(忠孝)는 가히 한 고을을 감동시켜 떨쳐 일어나게 할만하였으며, 그가 의병(義兵)을 일으킨 후에 적군(敵軍)을 살상한바는 오륙백명은 당연히 넘었을것이었다. 그 공적(功績)은 대장군의 진영(陣營)에 상신(上申)하였으며 감사(監司) 김성일(金誠一) 진영(陣營)에 상신(上申)하였으며,
감사(監司) 김성일(金誠一), 병사(兵使) 박진(박진), 어사(御使) 한준겸(韓俊謙)이 아울러 장계(狀啓)로 조정(朝廷)에 아뢰어서, 3 등, 1 등의 공신(功臣)으로 공훈록(功勳錄)에 기재 되었다. 오호라! 부자(父子)가 국사(國事)를 위하여 함께 목숨을 바친 일은 한(限)의 ⑬제갈 첨(諸葛 瞻), 진(晉)의 ⑭변호(卞壺)에 부끄러울 것이 없건마는, 아직도 나라에서 포상(褒賞)하는 성은(聖恩)을 입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들의 형세가 쇠약해 져서 떨치치 못하여 그렇다고 하지 않을수 있겠느냐? 거듭 통탄할 일이다.
찬양하는 글을 지었으니 섬나라 오랑캐가 침입하여 나라를 어지럽힐 때 ⑮조 중봉(趙 重奉)은 칠백의사(七百義士)와 같은 날에 전사(戰死)하였다.
어찌 칠백의사(七百義士)인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겠느냐? 선생께서 대의로서 기개(氣槪)를 북돋운 까닭이리라 . 이제 아비가 나라위해 전사(戰死)하고 자식이 뒤따르니 중봉(重奉)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같은 대의에 격동(激動)된 것은 그 의의(意義)가 한 가지이다.
--- 전 현령 김 홍운(前 顯令 金洪運)
①사마 천(司馬 遷)- 중국 한대(漢代) 사가(史家) 무제(武帝) 때 태사령(太史令)이 되었으며 저서는 사기(史記) 130 권이 있음
②반 고(班 固)- 후한(後漢)의 사가(史家) 아버지 반표(班彪)의 뜻을 이어 이십여년에 걸쳐 한서를 저술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옥사하자, 그의 누이 반소(班昭)가 보완하였음 120권
③형 가(荊 軻) - 전국시대 위(衛)의 자객(刺客) . 연(燕) 소왕(昭王)의 태자인 단(丹)을 위하여 진왕(秦王)을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피살 되었음.
④하 무차(夏 貿且) - 진왕(秦王)의 시의(侍醫) 형가(荊 軻) 가 진왕을 비수로 찌르려고 할 때 손에 들고 있던 약주머니를 던져서 위기를 모면케 하였음 ⑤항우(項羽) - 항적(項籍)의 자(字). 진(秦)나라 말기의 초(楚)의 장수 함양(咸陽)을 불사르고 진왕(秦王)을 죽이고 자립하여 초의 패왕이 되었으나 패공(沛公), 한(漢)의 고조(高祖)에게 해하(垓下)의 싸움에서 패하여 오강(烏江)에서 자살하였음.
⑥주생(周生) - 한(漢)나라 때의 유학자로 이름은 전하여 지지않음 . 순임금의 눈 동자가 아마도 두 개였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사마천이 사기에 인용 하여 강폭한 항우도 눈동자가 두 개라고 하니, 아마도 성인(聖人) 순임금의 후손(後孫)이 아니겠느냐 하였음.
⑦한 장유(韓長濡) - 한(漢 경제(景帝) 때의 어사대부(御司大夫), 한 안국(韓 安國)의 자(字). 큰 계략에 뛰어나고 충후(忠厚)하였으며, 많은 인재를 천 거하였으나 탐심이 많았다고 함.
⑧호 수(壺遂) - 사마천과 함께 율력(律曆), 역법(曆法)을 제정하였고, 관직(官職)은 첨사(詹事). 재상의 물정에 올랐는데 아깝게도 죽고 말았다고 함
⑨상군(商君) - 공손 앙(公孫 鞅). 위왕(危王)의 서공자(庶公子). 진(秦) 효왕(孝王)을 섬겨 상군(商君)에 봉해졌기 때문에 상앙(商 鞅)이라고 함.
형명가(形名價)로서 혹독한 형벌로 나라를 다스려 많은 반항을 받아 결국 역적으로 몰려 죽음.
⑩개색(開塞) 경전(耕戰) - 상앙(商 鞅)이 지은 상자(商子)라는 책가운데의 편명(篇名). 여기에 형벌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함 .
⑪손오서(孫吳書) - 손무(孫武)와 오기(吳起)가지은 병서(兵書). 둘다 병법의 대가임.
⑫태공(太公) 병서(兵書) -주(周)의 강태공(姜公)이 지은 병서(兵書.) 6도(六韜)라고도함. 황석공(黃石公)이 지은 3략(三略)과 아울러 육도(六韜)
삼략(三略)이라함 .
⑬제갈 첨(諸葛 瞻) - 촉한(蜀漢) 제갈 량(諸葛 亮)의 아들. 도호위장군(都護衛將軍). 항복을 권하는 적의 유혹을 물리치고 면죽(綿竹)에서 전사(戰死) 함.
⑭변호(卞壺) - 중국 진(晉)나라 사람. 시호는 충정(忠貞). 관직(官職)은 상서령(尙書令). 소준(蘇峻)의 반란 때 그의 아들'진' ' 우' 와 함께 국난에
순절(殉節)하였음
⑮조 중봉(趙 重奉) - 선조(宣祖)때의 문신. 의병장(義兵將). 명(名)은 헌(憲). 시호(諡號)는 문열(文烈)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고
문묘(文廟)에 배향됨
37-鶴山公 墓誌銘(학산공 묘지명)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 top
207쪽)
< 풀이>
학성(鶴城) - 울산(蔚山)의 남쪽 복천산(洑川山)에 있는 높이가 4척이고 저 명당 자리에 터잡은 봉분은, 그 옛날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충신(忠臣)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 학산(鶴山) 박공(朴公)의 분묘이다 불민한 이 사람이 후세에 태어나서 부로를 따라 그 명성을 전해 듣고 그 충의(忠義) 사모하였으나 생각하여 뒤돌아 보니 그 실제의 공적(功績)을 상세히 밝힐수가 없어 다만 마음만 그 당시를 향하여 생각한지가 오래되었다 .
며칠 전에 공(公)의 10 대손 병근(炳瑾) 씨가 빈번히 나를 방문하여 소매 속에서 한 책자를 내어 주면서 말하기를, " 이것은 우리 선조(先祖) 양세(兩世)의 실록이다 전(傳)해 배낄때의 잘못과 편차의 착오가 매우 많으니, 그대의 비교 교정과 또한 묘지를 지어 주는 은혜를 베풀어 못난 후손(後孫)들로 하여금 무지하여 사리분별을 할줄 모른다는 죄를 면하게 해주면 다행스럽겠다" 고 하였다.
내 비록 문장이 서툴고 학식이 부족하지마는 나의 성명으로 위대한 충효(忠孝)의 업적을 적어 후세에 전하게 됨을 스스로 영광이 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사양하지 않고 묘지(墓誌)를 서술하기로 하였다.
공(公)의 휘(諱)는 언복(彦福)이고 자는 이겸(而謙)이며 학산(鶴山)은 그의 자호(自號)이다.
그의 세계(世系)는 신라 시조왕으로부터 나왔는데 왕씨의 고려조에 이르러 휘(諱)는 언상(彦祥) 관직(官職)은 도평의사(都評義事)가 있었고 5 세를 지나서 휘(諱)는 열(說) 관직(官職)은 찬성(贊成) 시호(諡號)(諡號)는 문정(文靖)이 있었으며, 국조에 들어와서 초기에 휘(諱)는 승봉(承奉)이 있었는데 망국의 백성이라 하여 벼슬하지 않으니 세상에서는 송경의사(松景義士)라고 하였다.
손자인 휘(諱)연생(衍生) 호(號) 돈재(遯齋)에 이르러 단종(端宗)때 대호군(大護軍) 관직(官職)에 있었으나, 세조(世祖)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보고는 산중으로 은거하여 시를 지어 심중을 나타내 보이기를 " ①서산의 고사리는 아직도 캐지 못하였건마는 ②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심정은 오히려 알아차릴 수가 있겠네! " 고하였는데, 공(公)에게는 6대조가 된다.
조부의 휘(諱)는 수량(守良) 호(號)는 아곡(莪谷) 인데 벼슬은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고 청백리(淸白吏)에 기록되어 시호(諡號)는 정혜(貞惠) 였으며, ③하서(河西) 김(金) 문정공(文正公)이 묘비문(墓碑文) 을 지었다.
아버지의 휘(諱)는 사노(思魯)이고 관직(官職)은 풍저봉사(豊儲奉事)였으며, 어머니는 오성(鰲城) 서씨(徐氏) 진사 우녕(禹寧)의 여식으로 학문을 닦아 여성으로 덕망이 높고 행실은 온화하고 착하였다.
가정(嘉靖) 경술(庚戌), 명종 5년, 1550년 정월 20일에 호남(湖南)의 장성(長城) 하남촌(河南村)(河南村) 이아리(而莪里) 집에서 공(公)을 출생하였다.
공(公)은 태어 날 때부터 남다른 자질이 있어 용모가 ④장대(壯大)하고 재지(才知) 국량(局量)이 범상한 아이들과는 달랐다.
7-8 세의 어린 나이에 소학(小學)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끝까지 전편을 아직 배우지 않고서도 이미 근본이 되는 뜻을 환하게 깨달았다.
나이가 20 이 되기도 전에 체력이 과인하고 활쏘는 솜씨가 능하여 표적을 잘 맞추었으며, 또한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두루 읽고 한편으로는 군사상의 책략에 관한 서적에도 널리 퉁달하니 쓸모있는 인물이라고 지목하였다.
신미(辛未), 1571년, 선조(宣祖) 5년, 22세 때 무과(武科)에 등과하여 여러 관직(官職)을 역임한 뒤에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에 이르렀으니 대개 무관(武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
몇해가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밀양(密陽)으로 거처를 옮겼고, 다시 울산(蔚山)으로 이사하여 드디어 울산(蔚山)인이 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크게 일어나 적군(敵軍)이 침입한 일대 여러 읍성이 모두 함락되어 혼란에 빠지니 어찌 할바를 모르고, 울산(蔚山)은 적군(敵軍)의 침입하는 요충지가 되었는데, 병사(兵使)와 군수(軍守)는 적군(敵軍)의 기세에 놀라 도주하니 적군(敵軍)은 승세에 편승하여 마치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달려 들어오는것 같았다.
공(公)과 그의 아들 인립(仁立)은 눈물을 뿌리면서 굳게 맹서(盟誓)하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알아듣도록 깨우치고 타일러서 감히 죽기로 맹서(盟誓)하는 용감한 의사(義士) 수백인을 모아서, 의병장(義兵將) 권 응수(權 應銖) 진영(陣營)으로 달려 갈려고 하였는데, 홀연히 적군(敵軍)을 소등교(所等橋) 아래서 만나게 되었다.
몸을 빼어 돌격하여 적군(敵軍) 수십백인의 머리를 쳐서 베니 적군(敵軍)의 세력이 꺽이어 약간 물러났다. " 인립(仁立)을 돌아 보고 말하기를 우리는 대대로 나라에서 녹봉을 받아온 신하(臣下)의 가문이니 어찌 대장부의 몸으로 초야에 묻혀 살기를 구할수 있겠느냐? 너는 선대의 봉사를 이어 받고 처자를 잘 보전하여 죽음을 결심한 너의 아비로 하여금 지하에서 눈을 감을수 있도록 하여라 " 하고 적을 짓밟고 그 뒤를 좇아 가더니 유탄에 맞아 전사(戰死)하였다.
인립(仁立)이 시신(屍身)을 업고 가서 임시로 장사를 치루었는데, 그후 아비의 원수를 갚고자 울면서 동지에게 맹서(盟誓)하여 말하기를
" 어제의 전투에서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 하여 죽지 않았겠느냐?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고 하고 인하여 칼을 휘두르고 크게 외쳐 말하기를 " 적군(敵軍) 오랑캐들아! 너희들은 나를 알겠느냐? 나는 어제 대교 아래서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의 자식이다. 내가 아버지의 한이 깊은 원수를 갚아야 하니 너희들은 나의 칼을 받아라 " 하고
적진(敵陣) 중에 뛰어 들어가 수백인의 적군(敵軍) 머리를 베어 죽였으나, 자신도 수십군데의 상처를 입고 발꿈치를 돌려 돌아오지 못하고 전사(戰死)하니 7월 11일이었다. 적이 인립(仁立)의 전사(戰死)한 곳에 이르러 보니 눈은 아직도 감겨지지 않고 있었으며 손에서는 칼을 놓지 않고 꼭 거머쥐고 있으니 겁이 나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여러 의병장(義兵將)들이 군사를 이끌고 계속하여 급박하게 공격하니 적군(敵軍)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시신(屍身)을 수습하여 돌아와 조문을 지어 장사지내고 그가 의병(義兵)을 일으켜 충효(忠孝)의 대절에 순사(殉死)한 사실의 대강을 수합하여 상사에 보고하였더니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추가 기재되고 인립(仁立) 또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추가 기재되었다.
그 후 이백여년이 지나서 자손들이 궁문(宮門)에 호소하고 본도(本道)의 유림(儒林)들로 몇 차례나 진정서를 올려 공에게 관위를 더높여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증직(贈職)하도록 청하여 마침내 국가(國家)가 충절(忠節)을 장려하여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을 베푸니 많은 사인(士人)들이 공(公)의 공적(功績)에 관한 논의가 바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에 유감(遺憾)이 없게 되었다.
배위(配位)는 증(贈) 정부인(貞夫人) 청하이씨(淸河李氏)인데, 아들 한 사람을 낳으니 곧 인립(仁立)으로서 충효(忠孝)가 남달리 탁월하여 또한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추증되었다. 판서공(判書公)에게 여섯아들이 있으니 충윤(忠允),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낸 충한(忠漢), 충원(忠元), 충국(忠國),
충룡(忠龍). 충준(忠俊)인데 용(龍)과 준(俊)은 쌍생아 였고, 증현손(曾玄孫) 이하는 많아서 모두 다 기록하지 않는다.
오호라! 장렬하구나! 나의 얕은 생각과 보잘 것 없는 학식으로 어찌 감히 높은 충성(忠誠)과 위대한 절의(節義)를 끌어올려 드날릴수 있겠느냐?
다만 고금의 인물 가운데 그 공적(功績)이 표창(表彰)되고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하여지는 인물들을 예거(例擧) 하노니 중국에 있어서는 한(漢)의 ⑤제갈씨(諸葛氏) 부자(父子)와 진(晉)의 변씨(卞氏) 삼부자(父子)이고, 우리나라에는 ⑥제봉(霽峯) 고선생(高先生) 삼부자(父子)가 있는데 ,
그들의 신명을 바쳐 충효(忠孝)를 성취한 공적(功績)은 하나의 역사책에만 대서(大書) 특서(特書)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호! 장렬하다고 감탄하네! 이로서 명문(銘文)으로 삼는다.
--- 학성(鶴城) 후인(后人) 이석정(李錫井)
①장능(莊陵)...조선(朝鮮) 단종(端宗)의 능
②광묘(光廟)...조선(朝鮮) 세조(世祖)를 말함.
③하서(河西)...조선(朝鮮) (명종(明宗) 때의 대학자 문신(文臣)인 김인후(金麟厚)의 호(號). 시호(諡號)는 문정(文正). 문묘(文卯)에 배향됨. 저서에는 하서집(河西集)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등이 있음.
④괴오(槐梧)...괴오(魁梧)의 착오인 듯?
⑤제갈씨(諸葛氏), 변씨(卞氏).... 앞의 학산공 유사(鶴山公 遺事) (주) ⑬ ⑭ ⑮ 참조
⑥제봉 고선생 삼부자(父子)...고 경명과 그의 아들 종후(從厚)와 인후를 말함.
*고 종후(高從厚)...조선(朝鮮) 선조(宣祖)때의 충신(忠臣). 호(號)는 준봉(準峰) 시호(諡號)는 효렬(孝烈). 24 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이 현령(縣 令)이었음.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아버지와 함께 의병(義兵)을 일으켜 금산에서 적군(敵軍)과 격전 끝에 아버지와 아우는 전사(戰死) 하고, 이듬해 진주성 싸움에 참가하여 분전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투신자살하였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음.
*고인후(高仁厚)...호(號)는 학봉(鶴峰), 시호(諡號)는 의렬(毅烈)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추증(追贈)됨,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官職)은 학유(學 諭). 아버지를 따라 의병(義兵)으로 종군하여 금산싸움에서 선봉에서 교전하다가 아버지와 같이 전사(戰死)하였음.
38-鶴山公 墓碣銘(학산공 묘갈명)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 top
217쪽)
< 풀이>
옛날 섬나라 오랑캐들이 서울과 지방을 어지럽힐 때 국난의 위급함을 순절(殉節)로서 방어(防禦)하는 장렬한 대장부가 없었더라면 국가(國家)의 운명 또한 위태로왔을 것인데, 내가 만년에 들은 학산(鶴山) 박공(朴公) 또한 그러한 인물이었다. 며칠 전에 그 7 세손 선달(先達) 한혁(漢赫)씨가 공(公)에게 조정(朝廷)에서 포상(褒賞)이 내려진 사실을 기록한 것을 소매속에서 꺼내어 나에게 보이면서 분묘앞에 세우는 비문(碑文)을 청하기에 사양하였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삼가 살펴보니 위에 기록한 공(公)의 국난에 순절(殉節)한 사적(事蹟)은 학성읍지(鶴城邑誌)에 기재되어있고, 빛나는 공훈운 선무원종공신록(宣武原從功臣錄)에 기록되어 있으며, 국난을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나 용맹을 떨친 사적(事績)은 김 홍운(金洪運)이 지은 전기에 상세하게 나타나있으니 무엇을 더 보충하겠느냐? 그 대강을 뽑아 간추려 서술하고자 한다.
공(公)의 휘(諱)는 언복(彦福)이고 자는 이겸(而謙)이며 학산(鶴山)은 호(號)이다. 가계는 밀성대군(密城大君)으로부터 이어저 나왔는데, 그 후에 휘(諱)가 언상(彦祥)이란 분이 있어 관이 도평의사(都評義事)로 고려사에 나오니 이 분을 공(公)의 중조로 삼고 있으며, 5세를 지나 휘(諱) 열(說)은 관위(官位)가 찬성(贊成)이고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며, 증손 휘(諱) 승봉(承奉)에 이르러 국가(國家)의 혁명시기를 당하였는데, 망국의 백성으로 자처하여 벼슬을 하지 않으니 세상에서 의사(義士)라고 일컬었으니 공(公)의 8세조이다.
손자인 휘(諱) 연생(衍生) 호(號) 돈재(遯齋)에 이르러 단종(端宗) 때 대호군(大護軍)으로 세조(世祖)가 왕위를 선양 발음에 미쳐 드디어 산에 숨어 시를 지어 맹서(盟誓)하고 조정(朝廷)에서 여러번 불었으나 나아나지 않았으며, 조부의 휘(諱)는 수량(守良)이고 시호(諡號)는 정혜(貞惠)이며, 호(號)는 아곡(莪谷)인데 청백록(淸白錄)에 기재되었고 하서(河西) 김문정공(金文正公) 인후(麟厚)가 그 묘비문(墓碑文)을 찬술하였으며,
고(考)의 휘(諱)는 사로(思魯)이고 관위(官位)는 봉사(奉事)하였으며, 비(妣)는 오성서씨(鰲城徐氏) 이고 진사 우녕(禹寧)의 여식으로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았는데 가정(嘉靖) 경술(庚戌), 명종 5년, 1550년 정월 20일 장성(長城) 하남촌(河南村) 이아리(而莪里) 본제(本第)에서 공(公)을 출생하였다. 공(公)은 7, 8 세의 어린 나이 때부터 범상한 아동들과는 달라서 8 세에 소학(小學-책이름)을 배우기 시작하여 문의(文意)에 통달하였으며
장성함에 따라 체력이 남달리 뛰어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며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두루 읽으면서 또한 병서(兵書)인 ①6도(六鞱)와 6검(六鈐)의 내외제편(內外諸篇)도 연구하였다.
신미년(辛未年-1571), 22세에 무과에 등제하여 관위(官位)가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에 이르렀으며 그 후 울산(蔚山)으로 이사하여 그 그곳에 거주하였다. 임진년에 왜란이 크게 일어나 지방의 여러 진영(陣營)이 적의 기세에 꺽여 모두 무너져 흩어지니, 울산(蔚山)은 그 선두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들판에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백성들은 각각 조수가 달아나듯 도망쳐 숨었다.
공(公)과 그의 아들 인립(仁立)은 홀로 신명을 돌보지 않고 분발하여 일어나서, 방방곡곡을 찾아 다니며 눈물로 충성심(忠誠心)을 일깨워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의사(義士) 수백인을 모아서 권응수(權應銖) 진영(陣營)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소등대교(所等大橋) 아래서 적군(敵軍)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이 몸을 빼어 적진(敵陣)에 돌력하여 수백의 적군(敵軍)을 베어 죽이니 적은 조금 퇴각하였다.
자식 인립(仁立)을 돌아 보고 말하기를 " 국가(國家)가 위급한 이러한 때를 당하여 적군(敵軍)과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없기에 내가 죽을 곳을 얻었으니 나의 계책(計策)은 결정되었다. 너는 돌아가 처자를 온전히 지켜 선조(先祖)들의 제사(祭祀)를 이어 받들도록 하여라 " 하고 드디어 적군(敵軍)을 짓밟고 추격하더니 유탄에 맞아 전사(戰死)하게 되어 인립(仁立)이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나와 산언덕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명일에 인립(仁立)이 아비의 원수 갚을 것을 기약하고 더욱 기운을 내어 적진(敵陣)에 대적하고 여러 의사(義士)들에게 말하기를 " 어제의 전투에서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 하였겠느냐? 아버지의 시신(屍身)을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고 하고 이어서 칼을 뽑아 크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 적군(敵軍)들아! 너희들은 나를 아느냐? 나는 어제 대교(大橋)아래서 순절(殉節)한 어른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적진(敵陣)에 돌격해 들어가 백여인의 머리를 베었으나 자신도 수십군데의 창상을 입고 전사(戰死)하니 때는 7월 11일 이었다.
적이 전사(戰死)한 곳에 와보니 눈은 아직도 감겨지지 않고 손은 칼을 잡고 놓지 않고 있어 두려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여러 의사(義士)들이 계속하여 공격하여 압박하니 적은 드디어 퇴패하고 시신(屍身)을 수습하여 돌아와 조문을 지어 장사지냈다. 의병(義兵)을 일으킨 뒤로 월여(月餘)에 부자(父子)가 적군(敵軍)을 살상한 바가 삼, 사백명이 되며, 공훈이 사령부의 본영에 보고되어 훈공록(勳功錄)에 기재되었다.
묘소는 울산(蔚山) 온산면 산하방 간좌(艮坐)에 있고 배위(配位) 청하이씨(淸河李氏) 증(贈) 정부인(貞夫人)의 묘도 합장 되어 있다. 아들은 한 사람을 두었는데 인립(仁立)이고, 훈련원(訓鍊院)정으로 뒤에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증직(贈職)되었으며, 인립(仁立)은 충윤(忠允),충한(忠漢)과 관이 통정대부(通政大夫)인 충원(忠元) 등을 두었는데, 나머지는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오호라. 장력하도다! 생명을 바쳐 보국하는 일은 고금에 걸쳐 드문 일이거늘 공(公)의 부자(父子)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내온 가문의 후손(後孫)으로 여러 대에 걸쳐 임금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가문의 사람으로서, 적군토벌(敵軍討伐)을 굳게 맹서(盟誓)하고, 천금보다 귀중한 목숨을 몽당비자루를 버리듯이 전쟁터에 바칠 것을 다짐하고, 전사(戰死)를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여, 아비는 나라를 위하여 죽고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죽으니, 한 가문의 부자(父子)가 충효(忠孝)를 위한 순절(殉節)이 천고에 밝게 빛나고 있다.
아아! 세상에서 군부(君父)의 원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명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는 개나 돼지와 다를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공(公) 부자(父子)의 충효대절(忠孝大節)을 사람들은 혹 조중봉(趙重峯)에게 견주어 말하는 이가 있으니 결코 지나친 논의는 아니다. 그러나 수백년을 허송하도록 국가(國家)의 포상(褒賞) 은전(恩典)이 미치지 않아 모두가 이를 원통하게 여겼는데, 헌종 6년, 경자(庚子-1840)에 많은 사람들이 조정에 호소하여 충절(忠節)이 남다르게 뛰어났다고 인정하여 처음으로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증직(贈職)되어
시년(是年)에 사당(祠堂)을 언양(彦陽) 반곡(盤谷)에 건립하여 공(公)의 부자위패(父子位牌)를 편안히 받들게 되었으며, 철종 13년, 임술(壬戌 -1862) 도유(道儒)들의 상소로 병조판서(兵曹判書)에 가증(加贈)되었으니 이것이야 말로 굽혀져서 잘못된 것은 잠시이고 올바르게 펴진 것이 영원하다라는 사건일 것이다. 명문(銘文)을 지어 말하기를 바다의 물은 넘실넘실 흘러 가지만, 암석은 부수어져 훝어지지 않는다.
유택이 오래 보존되기를, 어찌 충심으로 바라지 않겠느냐? 나라를 위한 공적(功績)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성심을 다하여 기록하노라!
--- 월성(月城) 최 세학(崔 世鶴)
①도금(鞱鈐)의 잘못? 옛날 병서(兵書)에 6도(六鞱)와 옥금편(玉鈐篇)이 있었기 때문에 병서(兵書)를 말함.
39-鶴山公 神道碑銘(학산공 신도비명)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 top
225쪽)
< 풀이 >
오호라! 지난 날 임진왜란(壬辰倭亂)의 포학상은 차마 말을 더할수 있겠느냐? 건국후 200여년의 태평성대의 안일함을 즐기고 있던 때에, 갑자기 전쟁을 당하게 되어 여러 고을이 차례로 무너지고 백성들은 새짐승이 도망치듯 사방으로 흩어져 숨으니, 나라의 운명이 계란을 쌓아 올린것 같이 위태로웠다. 이때에 전임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 학산(鶴山) 박공(朴公)이 세신(稅臣)의 후손(後孫)으로서 충절(忠節)을 다하여 흩어진 의사(義士)들을 함께 불러 모아 의군(義軍)을 조직하고 적군이 진격해오는 요충지에 자신을 던져 처들어가 적군을 많이 베어 죽였으나 마침내 흉폭한 적탄에 목숨을 잃었다.
이일이 조정(朝廷)에 보고 되었으나 선무원종공신록(宣武原從功臣錄)에 기록되는데 그치니, 후인들이 그 공로를 포상(褒賞)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였다. 헌종 6년 경자(庚子-1840), 많은 사림(士林)들이 조정(朝廷)에 호소하였더니 충절(忠節)이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여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증직(贈職)되었다. 향인들이 언양현(彦陽縣) 반곡리(盤谷里)에 사당(祠堂)을 세워 제사(祭祀)를 지내고 그의 아들도 아울러 향사하였다.
철종 13년, 임술(壬戌-1862)에 본도(本道)유림(儒林)들이 재차 상소하여 대사마(大司馬)로 증직(贈職)을 더 높이시니, 이제야 아무런 유감이 없게 되었으며, 그가 순절(殉節)한 사적(事蹟)은 본전(本傳)과 일기(日記)등 제편에 모두 기록되어있다.
이제 그 후손(後孫)들이 바야흐로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새기고자 하여 병기(炳琦) 씨로 하여금 나에게 명문(銘文)을 받아 오도록 하였으니,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위촉은 스스로 직분에 힘쓰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족히 눈물을 흘리게 할 만하다.
삼가 살펴보니 공(公)의 휘(諱)는 언복(彦福)이고 자(字)는 이겸(而謙)이며 호(號)는 학산(鶴山)이다. 성은 박씨인데 박 혁거세로부터 세계가 시작되었고 후세에 분파하여 관향(貫鄕)을 밍양(密陽)으로 하였다. 고려조에 미쳐서 휘(諱)는 언상(彦祥) 관(官)은 도평의사(都評義事)에 이른 분이 있었고,
5세 뒤에 이르러 휘(諱)는 열(說) 관(官)은 찬성(贊成)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 있었으며, 조선(朝鮮) 개국초에 휘(諱) 승봉(承奉)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한 백성이라하여 벼슬을 하지 않으니 세인이 송경의사(松京義士)라 칭하였고,
단종조(端宗朝)의 대호군(大護軍)이었으나, 세조(世祖)가 왕위를 물려받는 때를 당하여, 드디어 산에 은퇴하고 < 수양산의 고사리는 캐어 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도 연명(陶 淵明)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율리(栗里)로 돌아가는 심정을 전해주네> 라고 부른 시가 있으며, 호(號)를 돈재(遯齋)라고 하는데 공(公)의 6대조이다.
조부의 휘(諱)는 수량(守良)이고 관은 우참찬(右參贊)이며 청백리(淸白吏)에 기록되었고 호(號)는 아곡(莪谷)인데 시호(諡號)는 정혜(貞惠)이고 하서(河西) 김 문정공(金 文正公) 인후(麟厚)의 묘비문(墓碑文)이 있으며, 고(考)의 휘(諱)는 사로(思魯)이고 관은 봉사(奉事)였으며, 모부인(母夫人)은 오성(鰲城) 서씨(徐氏) 진사 휘(諱) 우녕(禹寧)의 여식이다.
가정경술(嘉靖庚戌), 조선(朝鮮) 명종(明宗) 5년, 1550년 .정월 20일에 호남(湖南)의 장성(長城) 하남방(河南坊) 이아리(而莪里) 본댁에서 공을 출생하였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체구가 건장하며 재능과 기량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서 어린 나이에 학당에 들어가 소학(小學-,책명)을 배웠는데 이미 문장의 이치를 밝게 깨달았다.
연령이 20세에 이르러 체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 나서 중국 전국시대 사람인 손 무(孫武)와 오 기(吳起)가 지은 병서(兵書)를 연구하고, 기마술과 궁술(弓術)에 뛰어나니 사람들이 모두 태평시대나 국가(國家)위급시에 두루 쓰일 인재라고 지목하였다. 밀양(密陽)에 우거하다가 뒤에 울주(蔚州))로 이사하여 드디어 대대로 살게 되었다.
선조 6년 신미(辛未-1571)때 무과(武科)에 등제하여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에 승진되었고, 임진년 여름에 적군(敵軍)을 만나 소등대교(所等大橋)에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전사(戰死)하니 즉 7월 10일 이었고, 아들 인립(仁立)도 또한 무관인 훈련원(訓鍊院) 정(正)으로서 부공(父公)의 의병전진(義兵戰陣)에 종군하였는데 부공(父公)이 전사(戰死)하였을때, 그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통곡하다가 여러 의사(義士)들과 더불어 산언덕에 임시로 장사 지낸 후에 부공(父公)의 원수를 생명을 걸고 갚을 것을 맹서(盟誓)하고 진영(陣營)으로 함께 갔다.
이튿날 용기를 떨쳐 일으켜 칼을 뽑아 들고 적군(敵軍)을 향하여 부르짖어 말하기를 " 나는 어제 대교(大橋) 아래서 충절(忠節)을 위하여 순국(殉國)한 분의 자식이다. 마땅히 너희 들을 모조리 죽여 없앰으로 가슴에 맺힌 깊은 원한을 풀어보겠다 " 하고 적진(敵陣)에 돌격해 들어가 수백인의 적군(敵軍) 머리를 베었으나 자신도 또한 수십군데의 상처를 입고 전사(戰死)하니,
곧 부공(父公)이 전사(戰死)한 익일(翌日)이었는데 눈은 부릅떠서 오히려 감겨지지 않았었고, 칼은 아직도 손에 쥐고 있으니 적군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여러 의사(義士)들이 뒤를 이어 적진(敵陣)으로 공격하여 들어가니 적군(敵軍)이 드디어 퇴각하여 둔소(屯所)로 갔다. 그리하여 조정(朝廷)에서는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기록하고, 또한 조금도 사심이 없는 한결같은 충성과 순수한 효성(孝誠)이 우주를 지탱하여 태양을 관통할 만하다고 하여 부공(父公)에 이어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증직(贈職)하였다.
왜란이 평정된 후에 학산공(鶴山公)의 묘소를 울산군(蔚山郡) 온산면(溫山面) 산하방(山下坊) 간좌(艮坐) 언덕에 정하여 배위(配位)인 증(贈) 정부인(貞夫人) 청하이씨(淸河李氏)의 묘를 합장하였으며, 일남은 즉 인립(仁立)이고 손은 충윤(忠允), 충한(忠漢), 관이 통정대부(通政大夫)인 충원(忠元)과 충국(忠國), 충룡(忠龍), 충준(忠俊)인데 증손(曾孫) 현손(玄孫)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오호라! 이 시대를 당하여 온 가문이 적군(敵軍)의 손에 살해 당한 자 어찌 원한이 없으리오? 마는 공은 능히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쳐 마침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큰 공훈이 있었고, 그 아들 또한 부공(父公)을 위하여 생명을 버렸으니 충효(忠孝)가 한가지로 온전히 갖추어졌다고 하겠으며, 양세에게 내려진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증직(贈職) 은전(恩典)은 지하의 충의(忠義)로운 혼백을 족히 위로 할 수있을 것이리라. 이에 다음과 같은 명문(銘文)을 지어 찬양하고자 한다.
임신(壬申-1932) 3월 상순
통사랑(通仕郞) 권지(權知)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
사량후인(沙梁後人) 최 현필(崔 鉉弼) 근찬(謹撰)
편집자 주(註) → 충효실록의 저자 박문도님의 요청에 의거 사량후인(沙梁後人)을 경주후인 慶州後人으로 정정합니다.
①송경의사(松景義士)의 높은 절조와,
②율리(栗里)로 돌아가는 도잠(陶潛)을 추모하는 시(詩는
③ 빛나는 선조(先祖)들의 충의심(忠義心)을
④영원히 후세에 전한 것이요,
⑤공(公)은 오직 유덕을 모범삼아
⑥충의(忠義)가 밝게 빛나고
⑦아들 또한 순효(殉孝)하여,
⑧함께 증직(贈職) 향사(享祀) 되었네!
⑨온산(溫山) 땅에 비석을 다듬어 세우니
⑩신령스런 혼백은 만민의 본보기가 되네
⑪찬란한 공훈은 빛남을 태양과 다투고
⑫꿋꿋한 절개(節槪)는 무지개를 꿰뚫을 것 같으니, 공을 추모하여 보곺은 자 있거든
⑬바로 여기가 영면(永眠)하는 유택(幽宅)이라네.
40-聽水軒公 遺事(청수헌공 유사)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 top
233쪽)
< 풀이>
가정(嘉靖) 43년, 명종(明宗) 19년 갑자(甲子-1564)에 공(公)은 밀양(密陽) 신기리(新基里) 집에서 출생하였고, 뒤에 대인 학산공(鶴山公)을 따라 울산(蔚山)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공은 타고난 풍채가 크고 훤칠하며 세상의 잘못 됨을 바로잡으려는 의기(義氣)가 넘치는 성품이었다. 어릴적부터 범백사를 처리하는 것이 이미 노성(老成)한 사람같은 기상이 있었고 천성이 지극한 효성(孝誠)이 있어 과실 한 개나 고기 한 조각이라도 얻으면 감히 먼저 먹지 않고 반드시 부모님께 드렸다.
7세 때 역사를 처음 배웠는데 능히 문장의 뜻을 통달하여 어른들이 물으면 막힘없이 재빠르게 대답하기를 마치 물이 흘러가듯 하였으며, 11 세에 서당의 스승에게 나아가 경전을 배웠는데 성심을 다하여 깊이 연구하고 반드시 몸소 실천하는데 힘썼으며, 글을 읽거나 암송할 때는 어버이 곁을 떠나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도록 하였다.
16 세에 언양김씨(彦陽金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21세 때 시전(詩傳) 대아(大雅)에 있는 대명장(大明章)을 읽다가 태사(太師)인 상부(尙負)가 때에 맞추어 매를 날리듯 무왕(武王)을 도와 주왕(紂王)을 공멸(攻滅)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책을 덮고 탄식(嘆息)하기를 " 경서(經書)를 공부하여 군자같은 유자가 되는 것이 진실로 좋은 일이겠으나, 대장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허다한 사업이 있으니 어찌한가지 기예로만 가히 명성을 이룰것이냐? " 하고
드디어 무예와 군략(軍略)을 공부하니 대인공(大人公)도 그가 좋아하는바를 따랐으며, 넘치는 굳센 체력이 과인하며 무예가 여러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니 사람들이 모두 국가(國家)를 지켜줄 훌륭한 재목(材木)으로 지칭하였다. 선조 23년, 경인(庚寅-1590) 27세에 무과(武科)에 등제(登第)하여 충효(忠孝)를 스스로 실천할, 가장 중요한 덕행으로 하였으며 만 사람이라도 빼앗을수 없는 용맹이 있었다.
조정(朝廷)에서도 공(公)의 재덕이 모두 갖추졌다고 인정하여 여러번 천거하여 관직(官職)이 훈련원(訓鍊院) 정(正)에 이르렀다.
여섯 아들이 있었으니 충윤(忠允), 충한(忠漢), 충원(忠元), 충국(忠國), 충룡(忠龍), 충준(忠俊)이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에는 대인공(大人公)을 따라 울산(蔚山)에서 적군(敵軍)을 토벌하였는데 소등대교(所等大橋)의 전투에서 대인공(大人公)이 적의 흉탄에 맞은바 되어 진중에서 전사(戰死)하니,
공(公)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울부짖으며 땅을 치고 통곡하였으며, 군중이 모두 슬피 울었다. 그 때 동향의 의사(義士)인 전공(全公) 응충(應忠), 김공(金公) 흡(洽), 박공(朴公) 손(孫)이 바야흐로 병영으로 향하여 가다가 공(공)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통곡 하는 것을 보고 같이 힘을 합하여 산언덕에 임시로 장사지내고 함께 병영으로 향하여 갔다.
대천제(大川堤) 아래에 이르렀을 때 적병이 들판을 뒤엎을 듯이 수많은 무리가 처들어 오는 것을 보고 공이 삼의사(三義士)에게 말하기를
" 아비가 나라를 위하여 전사 한 것과 자식이 아비를 위하여 죽는 것은 동일한 일이다. 지난 날 대교의 전투에서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 하였겠느냐?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하고 곧 칼을 빼어 들고 크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 오랑캐같은 적군(敵軍)들아! 너희들이 나를 알겠느냐? 나는 곧 어제 대교 아래서 나라위해 전사(戰死) 한 분의 아들이다. 마땅히 너희 무리들을 모조리 처죽여 나의 마음속에 깊이 맺힌 원한을 씻어 버리겠다. 속히 나와 나의 칼을 받아라" 하고
적진(敵陣)에 돌격해 쳐들어가 적군(敵軍) 수백명을 베었으나 자신도 또한 삼십여 군데의 창상을 입고 전사(戰死)하니 때는 7월 11일이었다.
삼의사(三義士)가 계속하여 진격하니 적군(敵軍)은 드디어 퇴각하여 마편방(馬鞭坊)에 모여 수비하였다. 공(公)의 시신(屍身)을 수습하니 늠름한 모습이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아 눈은 아직도 감겨지지 않고 손에는 칼을 놓지 않고 있었다.
서로 의론하여 조문을 지어 장사(葬事)지내니 그 문사(文辭)를 요약하면 " 오호라! 장렬하도다! 생각하건데 공(公)의 부자(父子)는 어제는 충성(忠誠)으로 순국(殉國)하고 오늘은 맹서(盟誓)하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니 그 굽힐줄 모르는 용감한 기개는 사사로운 욕망에 흐려지지 않는 성품이어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고 하였다.
삼의사(三義士)가 공(公)의 부자(父子)가 적군(敵軍)과 싸우다가 전사(戰死)한 상황을 여러 진영(陣營)에 보내어 두루 알렸다. 장공 희춘(蔣公 希春), 윤공, 홍명(尹公 弘鳴), 유공 정(柳公 汀), 이공 응춘(李公 應春), 서공, 인충(徐公 仁忠), 유공 백춘(柳公 伯春), 이공 눌(李公 訥) 등이 모두 듣고 탄복하고 정부에 보고하니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기록되었다.
그 후 자손과 향토의 사림(士林)들이 조정(朝廷)에 호소하는 상소문(上疏文)을 올려 헌종 6년, 경자(庚子-1840)에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증직(贈職) 받았는데 이 때의 나의 선대들이 언양(彦陽)에 우거하고 있었으므로 고향 사림(士林)들이 언양(彦陽) 반곡리(盤谷里)에 사당(祠堂)을 건립하여 공(公)의 부자(父子)를 향사하였으며,
철종 13년 임술(壬戌-1862)에 본도(本道) 유림(儒林)들이 또 다시 조정(朝廷)에 호소하니, 한결같은 순수한 충성(忠誠)과 더할 수 없는 효성(孝誠)은 넓고 높은 우주를 지탱하고 밝은 태양을 꿰뚫을만 하다 하여,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증직(贈職)을 더하였으며, 익년인 계해(癸亥)년에는 병조판서 (兵曹判書) 겸(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충관(都摠官)에 또 다시 증직(贈職)되었으며, 고종 6년, 무진(戊辰-1868)에 향사(享祀)를 폐지하였다.
순의후(殉意后) 340년 신미(辛未-1931) 소춘(小春) , 10세손 기태(基泰) 근서(謹書)
주(註)
1)명종 18년... 이 해는 계해(癸亥)년이므로 갑자(甲子)년은 19 년임.
2)시대명(詩大明)...시전(詩傳) 대아(大雅) 문왕의십(文王之什) 대명장(大明章)을 말함.
유사상부(維師尙負)... 스승이고 아버지 같이 존경하는 강태공이
시유응양(時維鷹陽)... 적시에 매를 날리듯 용맹을 발휘하여
양피무왕(凉彼武王)...무왕을 도와
사벌대상(肆伐大商)...군대를 진렬(陣列)하여 상(商)의 폭군을 정벌하니
241쪽)
< 풀이>
내가 일찍이 본읍지(本邑誌) 충의편(忠義篇)을 열람하여 보니, 박공(朴公) 인립(仁立) 부자(父子)의 전사(戰死)한 사적(事蹟)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일은 우리 고장 선배들이 위대한 업적이지마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는데, 일전에 공(公)의 후손 기태(基泰) 씨가 공(公)의 세계(世系)와 사적(事蹟) 그리고 포상(褒賞) 증직(贈職)에 관한 여러 문책(文冊)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전후의 사정과 차례를 기록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비록 그 일을 감당할만한 재능이 없으나 비로소 내가 평소에 품어 왔던 공(公)의 업적을 확실히 알지 못하여 궁금하였던 한을 풀수 있겠고, 또 향토의 역사를 알수 있는 즐거움도 있어서 이에 감히 문서를 살펴 보고 쓰기로 하였다. 공(公)의 자(字)는 사행(士行)이고 호(號)는 청수헌(聽水軒)이며 그 선조(先祖)는 밀양(密陽) 사람이니 신라 밀성대군(密城大君) 휘(諱) 언침(彦忱)으로부터 세계(世系)가 시작되었다.
그 후 도평의사(都評義事) 휘(諱) 언상(彦祥)과 문정공(文靖公) 휘(諱) 열(說)이 고려때에 가장 드러난 분이고, 고려말에 휘(諱) 승봉(承奉)이었는데
나라가 망한 백상이라고 하여 스스로 근신하였으며, 양세(兩世)후의 휘(諱) 연생(衍生)은 단종(端宗)때에 관직이 대호군(大護軍)에 이르렀으나 세조(世祖)가 왕위를 물려 받았을때 산에 은퇴하니 호(號)는 돈재(遯齋)이고 시를 지어 자기의 숨는 뜻을 나타내 보였는데 실로 공(公)의 7세조이다.
고조(考祖)의 휘(諱)는 종원(宗元)이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증조(曾祖)의 휘(諱)는 수량(守良)이고 호(號)는 아곡(芽谷)이며 관직은 우참찬(右參贊)이고 청백리(淸白吏)에 기록되었으며 시호(諡號)는 정혜(貞惠)이고, 하서(河西) 김 문정공(金文正公) 인후(麟厚)가 그 묘비명을 지었다. 조부의 휘(諱)는 사로(思魯)이고 관직(官職)은 봉사(奉事)였으며 고(考)의 휘(諱)는 언복(彦福)이고 호(號)는 학산(鶴山)이며 관직은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인데, 비로소 이 때 호남(湖南)으로부터 밀양(密陽)으로 이사하여 왔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순국(殉國) 전사하여 여러번 증직(贈職)이 더하여져 관직(官職)이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렀고, 언양(彦陽) 반곡사(盤谷祠)에 봉향되었으며, 모부인(母夫人)은 증(贈) 정부인(貞夫人) 청하이씨(淸河李氏)인데, 명종 19년 갑자(甲子- 1564) 공(公)은 신기(新基)의 우거하는 집에서 출생하였고, 장성하여 부공(父公)을 따라 또 다시 울주(蔚州))로 이사하였다,
공은 타고난 풍채가 장대하고 춴칠하며 품은 뜻이 의기(義氣)가 넘쳐서 유시부터 학문을 좋아 하였고, 천성 또한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새로운 음식이 생기면 어버이에게 바치기 전에 먼저 입에 대는 일이 없었다, 관례(冠例)할 연령을 넘어서는 시전(詩傳)의 대명장(大明章)에 있는 태사이고 아버지 같이 존경하는 강태공(姜太公)이 시기에 맞추어 매를 날리듯 용맹을 발휘하여 상(商)의 폭군 주왕(紂王)을 정벌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책을 덮고 탄식(嘆息)하기를 대장부의 사업이 어찌 다만 유학으로 명성을 이룩하는 일뿐이 겠느냐 하고, 드디어 무예와 전략(戰略)을 공부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니 넘치는 굳센 체력 또한 남달랐다. 선조 23년, 경인(庚寅-1590) 27세에 무과(武科)에 등제(登第)하니 조정(朝廷)에서 국가(國家)를 보위할 수 있는 큰 인재라하여 어러번 자리를 옮겨 훈련원(訓鍊院) 정(正)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본향의 의사(義士) 서공 몽호(徐公 夢虎), 박공 홍춘(朴公 弘春), 전공 응충(全公 應忠)등이 급히 동지를 불러 모으는 격문이 왔으며, 선공(先公)이 몸을 떨쳐 일으켜 김 득례(金得禮)와 더불어 용사를 모으려고 거남곡에 이르러 수십백인의 의사(義士)를 얻었으므로, 선공(先公)이 공에게 명하여 의군을 영솔하여 좌계장(左界將) 권공 응수(權公 應銖) 진영(陣營)으로 달려 가도록 하였는데, 도중의 소등대교(所等大橋) 아래서 적군(敵軍)을 만나게 되었다.
선공先公)이 공을 돌아 보고 이르기를 " 이때가 나의 충절(忠節)을 세울만한 기회이다" 하고 칼을 빼어 돌격하여 바로 적진(敵陣)으로 처들어가 좌우로 적을 무찌르니 적의 머리를 벤 것이 수백이 되었으나 마침내 적탄에 맞아 전사(戰死)하였다. 공(公)이 역전(力戰)하여 적이 물러가기에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울부집을 때, 전공 응충(全公 應忠), 김공 흡(金公 洽), 박공 손(朴公 孫)이 바야흐로 절도사(節度使) 진영으로 가다가 공을 보고 서로 울면서 더불어 산 언덕에 임시로 장사지내고 진영(陣營)으로 향하여 달려갔다.
그리하여 대천제(大川堤)아래서 적군(敵軍)을 만나니 공이 3의사(三義士)에게 말하기를 " 부군이 충절을 위하여 전사(戰死)하셨는데 자식이 효성(孝誠)을 위하여 죽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 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대교(大橋) 아래서 충절(忠節)을 위하여 전사(戰死)한 분의 아들이다". 하고 바로 전직으로 처들어가 적군(敵軍)의 머리를 수백명 베었으나 자신도 삼십여 군데 상처를 입고 전사(戰死)하였으니 7월 11일이다. 3의사(三義士)가 계속하여 돌진하니 적군(敵軍)은 물러가 마편방(馬鞭坊)에 둔치게 되었다.
3의사(三義士)가 공(公)의 시신(屍身)을 수습하니 얼굴 모습은 발끈 크게 성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로 의론 하여 조문을 지어 위로 하고 장사지내니 그곳은 북쪽을 등지고 정남향(正南向)인 자리였다. 공(公)의 부자(父子)가 적군(敵軍)과 싸우다가 전사(戰死)한 상황을 모든 진영(陣營)에 두루 알리니 장공 희춘(蔣公 希春), 윤공, 홍명(尹公 弘鳴), 유공 정(柳公 汀), 이공 응춘(李公 應春), 서공, 인충(徐公 仁忠), 유공 백춘(柳公 伯春), 이공 눌(李公 訥) 등 모두가 그 상황을 듣고는 놀라고 탄복하여 정부에 다투어 보고하여 선무원종(宣武原從) 1등공신(一等功臣)에 기록되었으며,
그 후에 자손들이 왕(王)의 거동하는 길가에서 괭과리를 처서 원함을 호소하고 본도(本道)와 본향의 유림(儒林)인사들이 호소하는 상소가 조정(朝廷)에 올라가 헌종, 철종 양조에 이르러 영원히 변치 않는 한결같은 충성(忠誠)과 지극한 효성(孝誠)은 높고 넓은 우주를 지탱하고 밝은 태양을 꿰뚫을말하다고 하는 포상(褒賞)과 여러 차례 관직을 더하는 증직(贈職)이 있어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 都摠官)의 관직(官職)이 내렸으며 ,
반곡사(盤谷祠)에 배향되었고, 배위(配位)는 증(贈0 정부인(貞夫人) 언양김씨(彦陽金氏)이니 같은 자리에 합장하였다. 6남이 있었는데 충윤(忠允) 충한(忠漢) 통정대부(通政大夫) 충원(忠元), 충국(忠國) 충룡(忠龍) 충준(忠俊)이었고, 충윤(忠允)의 아들은 의범(義範), 의식(義植), 충한(忠漢)의 아들은 진홍(震洪), 진걸(震傑), 호군(護軍) 진준(震俊)이고, 여식은 차 재행(車 載行)에게 출가하였는데 열녀로서 정문이 세워졌고,
충원(忠元)의 아들은 상정(尙貞), 치정(致貞), 무정(武貞)이고, 여식은 최 진한(崔 震漢)에게 출가하였으며, 충국(忠國)의 아들은 인상(寅相), 충룡(忠龍)의 아들은 성화(聖華), 충준(忠俊)의 아들은 이백(以伯)이었는데 증현손(曾 玄孫)은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오호라! 지금은 공(公)의 재세시로부터 300여년이 지났으니, 그 때에 공격해 오는 적군(敵軍)을 방어(防禦)하여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고 흐르는 피로 얼굴을 씻는 전략(戰略)과 의군(義軍)을 초유(招諭)하는 격문의 원고가 전해지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한탄스러원 일이나,
충효(忠孝)는 인도의 가장 중대한 절의(節義)로서 공이 이미 세운 대절이 저와 같이 위대하니 기타의 일들은 다만 자잘구레한것에 불과하여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고, 울주(蔚州))역사의 기록이 천추에 명백(明白)하게 남아있고,
하물며 국가(國家)의 포상(褒賞)하는 증직(贈職)이 있었으며 사림(士林)에서 사당(祠堂)에 뫼시어 향사를 받들고 있으니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이렇듯이 가히 영걸한 혼령(魂靈)을 구천에서 위로하고 후인들에게 영원히 권장할만한 일이나 지금의 세상은 과연 어떤 세태인지? 한숨을 쉬면서 기술하여 군자들에게 발표하여 알리는 바이다.
--- 영천(靈川) 김 상우(金 相宇)
42-聽水軒公 墓誌銘(청수헌공 묘지명)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 top
249쪽)
< 풀이>
사람에게 충효가 있는 것은 하늘에 일월이 있는것과 같다. 일월이 그 빛을 밝게 빛내지 않는다면 하늘은 하늘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충효(忠孝)의 도를 다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없는것이다. 바람과 비가 모질게 불고 내려서 어두워진 연후에야 일월의 밝음을 우러러 보게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진 연후에야 충효(忠孝)의 도를 가히 볼 수 있는 법이어서 대저 좋은일과 나쁜일을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것이다.
부모를 우러러 받들고 처자를 거느려 양육하여야 할 자신이 생명을 창끝과 화살촉이 어지러히 흩날리는 전쟁의 소용들이 속에 내던져서 스스로 후회할 줄 모르는 자도 어찌 그 자신의 생명을 홀로 가볍게 여기겠느냐? 오직 대의(大義)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니 이러한 의절(義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인도가 끊어지지 않겠느냐?
청수헌(聽水軒) 박공(朴公)은 선조 23년, 경인(庚寅-1590), 27세에 무과(武科)에 등제(登第)하여 관직(官職)은 훈련원(訓鍊院) 정(正)이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부공(父公)이 의군을 일으켜 좌계장(左界將) 권 응수(權 應銖)에게 호원하기로 약정하고 향토의 의사(義士) 서 인충(徐仁忠)과 더불어 많은 적군(敵軍)을 강수와 육지에 쓰러뜨려 죽였으나, 마침내 적탄에 맞아 순사(殉死)하였는데,
공이 그때 부공(父公)의 진중에 있다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 적을 물리치고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나와서 전 응춘(全應忠), 김 흡(金洽) 박 손(朴孫)과 더불어 산 언덕에 장사지낸뒤 함께 병영으로 향하여 가다가, 대천제(大川堤) 아래서 적군(敵軍)을 만나 몸을 진중에서 빼어 내어 칼을 휘두르며 적진(敵陣)에 돌입하여 순국(殉國)하였으니
부자(父子)가 전후에 참살한 적의 수는 거의 오육백급에 이르렀다. 3의사(三義士)가 공(公)의 순사(殉死)함을 보고 용기가 세차게 끓어올라 마편방(馬鞭坊)으로 적군(敵軍)을 물리치고 공(公)의 시신(屍身)을 수습하니 안색은 아직도 힘찬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글을 지어 혼령(魂靈)을 위로 하고 정남향(正南鄕) 땅에 장사 지냈는데 그 후 땔나무를 베고 소치는 아이들까지도 지금껏 잘 수호하고 있다.
오호라! 공과 같은 사람들 충효(忠孝)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겠다. 그때를 당하여 김학봉(金鶴峰) 선생, 박병사 진(朴兵使 晉), 한직지 준겸(韓直持 浚兼)이 부자(父子)를 포상(褒賞)하도록 장계를 올려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기재되었으니 울산읍지(蔚山邑誌)에 사적(事績)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 헌종 6년, 경자(庚子-1840)에 향토인사(鄕土人士)들의 상소로 조정(朝廷)에서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증직(贈職)하여 이 때에 언양(彦陽) 반곡에 사당(祠堂)을 세워 공(公)의 부자(父子)를 향사 하였으며, 철종 13년, 임술(壬戌- 1862)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이 이것으로는 공(公)의 공훈에 대한 포상(褒賞)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여, 성상(聖上)께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충성(忠誠)과 지극한 효성(孝誠)은 높은 하늘을 지탱하고 밝은 태양을 꿰뚫을만 하다고 담담관에게 명하시어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증직(贈職)하시고, 익년 계해(癸亥)에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증직(贈職)을 더 하였다.
공은 관향이밀양(密陽)으로 휘(諱)는 인립(仁立)이고 자(字)는 사행(士行)이며 호(號)는 청수헌(聽水軒)이고 밀성대군(密城大君)이 그의 시조이다 .
도평의사(都評義事) 언상(彦祥)과 문정공(文靖公) 열(說)이 고려조에 드러났으며 문정공(文靖公)의 증손 승봉(承奉)은 고려와 조선(朝鮮)이 혁명되는 때를 당하여 망국의 백성이라고 삼가 스스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돈재공(遯齋公) 연생(衍生)은 단종(端宗)때 대호군(大護軍)이었으나 산에 은거하면서 세조(世祖)의 부름에 불응하였다. 증조의 휘(諱)는 수량(守良)이고 호(號)는 아곡(莪谷)이며 관직(官職)은 우참찬(右參贊)이고 청백리(淸白吏)에 기록되었고 시호(諡號)는 정혜(貞惠)이며, 조고의 휘(諱)는 사로(思魯)이고 관직(官職)은 봉사(奉事)이며 고(考)의 휘(諱)는 언복(彦福)이고 호(號)는 학산(鶴山)이며 훈련첨정(訓鍊僉正)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순사(殉死)하여 선무원종(宣武原從) 3등공신(功臣)으로 기록되었고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위비(位妣)는 증(贈) 정부인(貞夫人) 청하이씨(淸河李氏) 학산공(鶴山公)때에 비로소 호남(湖南) 지방으로부터 밀양(密陽)으로 이사하여, 명종 19년, 갑자(甲子- 1564)에 신기리 집에서 공(公)을 출생 하였고, 후에 울산(蔚山)으로 이사하여 자손들이 드디어 울산(蔚山) 사람이 되었다.
배위(配位)는 증(贈) 정부인(貞夫人) 언양김씨(彦陽金氏)로서 공(公)의 묘에 합장하였다. 6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충윤(忠允) 충한(忠漢) 통정(通政)충원(充元), 충국(忠國), 충룡(忠龍), 충준(忠俊)이었으며,
충윤(忠允)의 아들은 의범(義範), 의식(義植)이고, 충한(忠漢)의 아들은 진홍(震洪), 진걸(震傑), 호군(護軍) 진준(震俊)이며, 여식은 차 재행(車 載行)에게 출가하였는데 열녀로서 정문이 세워졌고, 원(元)의 아들은 상정(尙貞), 치정(致貞), 무정(武貞)이고, 여식은 최 경한(崔 震漢)에게 출가하였으며,
국(國)의 아들은 인상(寅相)이며, 용(龍)의 아들은 성화(聖華)이며, (忠俊)의 아들은 이백(以伯)이고 이하는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후손(後孫) 병근(炳瑾) 군이 애통한 모습으로 상복을 입고 나의 집으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 후손(後孫)들이 보잘것없이 쇠락하여 묘소에 아직도 지석(誌石)이 없는데 이제야 선부(先父)의 유지와 문중의 공의(公議)로 그대에게 청하오니, 그대는 우재선생(愚齋先生)의 후손(後孫)이고 나의 선조(先祖) 아곡공(莪谷公)과는 실로 같은 조정(朝廷)에 봉직하였으며, 제문(祭文)이 양가의 선대문집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대가 이일을 하는데 무정하지는 않을 것이라" 고 하니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사람이 못된다고 사양할 수 있겠느냐? 지금으로부터 공(公)의 세대까지는 수백년이 상거(相距)가 있고, 언론이나 행적(行蹟)에 관한 기록이 모조리 없어져서 전하지 않으니 매우 한탄스러운 바이나, 충효(忠孝)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도리이니 그 대본이 먼저 확립되었으면 사소한 일들을 가히 미루어 알수 있을 것이다 명문(銘文)을 지어 추모한다
한(漢)나라 역사에는 섬상(贍尙)이 실려있고, 당(唐)나라에서는 제봉(濟逢)이 저명하다.
이 땅에도 이에 짝할 분 있었으니, 바로 청수헌(聽水軒) 박공(朴公) 일세
신명을 용감히 한번 버려 충효(忠孝) 두 가지를 온전히 하였다.
감사(監司)는 포상(褒賞)을 아뢰고 공훈부(功勳府)는 공적(功績)을 살펴,
왕께서는 벼슬을 높이 내리시고, 사림(士林)은 사당(祠堂)을 지어 받드네!
시호(諡號)를 비석에 크게 새기도록 어찌하여 함께 내리시지 않았을까?
아아! 산하(山河)는 지금도 그대로인데 세월은 흘러 오히려 옛날이 되었구나!
그 광영 드러나지 않더니 하늘이 내린 인륜(人倫)이 이제야 밝아지네 !
효성(孝誠)이 아니면 가문이 없고 충신(忠臣)이 아니면 어찌 나라 있으리요?
대천제산(大川堤山)에 공(公)의 봉분있으니 이묘지는 영원히 보존되리 !
그윽한 황천과 아득한 천상에서도 혼령(魂靈)은 응당 감응하리라.
나의 명문(銘文)으로 징험을 바라오니 공(公)의 영령이여 이루어 나타내소서!
--- 월성(月城) 손 후익(孫 厚翼)
①김학봉(金 學峯) -김성일(金誠一)의 호(號). 조선(朝鮮) 선조(宣祖) 때의 문신 학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초유사(招諭使), 경상우도관찰사(慶 尙右道觀察使)를 역임함. 저서에 학봉집, 상례고증(喪禮考證), 해사록(海槎錄)등이 있음.
②박진(朴晉) -조선(朝鮮) 선조(宣祖) 때의 무신. 시호(諡號)는 의렬(毅烈) , 경상좌도 병마절도(慶尙左道 兵馬節度使), 참판(參判) 역임, 임진왜란(壬 辰倭亂)때 영천 싸움에서 대승하고 경주성을 탈환함 .
③한준겸(韓浚謙) -선조(宣祖) 인조(仁祖)때의 문신.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도체찰사(都體察使) 유성룡(柳成龍)의 종사관(從事官)이 되고 경기관찰사(京畿 觀察使), 대사성(大司成)을 지내고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짐.
④우재(愚齋)- 손중돈(孫仲暾)의 호(號) .시호(諡號)는 경절(景節), 목사(牧使), 관찰사(觀察使), 판서(判書) 우참찬(右參贊) 역임.
⑤첨상(瞻尙) -촉한(蜀漢) 때의 충신(忠臣) 제갈 첨(諸葛 瞻)과 제갈 상(諸葛 尙) 부자(父子). 적군(敵軍)과 싸우다가 모두 전사(戰死) 하였음
* 제봉(濟逢) - 당(唐) 나라의 충신(忠臣). 구체적인 사적(事蹟)을 조사하지 못함.
43-聽水軒公 墓碣銘(청수헌공 묘갈명)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l 원문③> top
259쪽)
< 풀이>
공(公)의 성은 박씨(朴氏) 휘(諱)는 인립(仁立) 자(字)는 사행(士行) 호(號)는 청수헌(聽水軒) 관은 훈련원(訓鍊院) 정(正)이고 밀성대군(密城大君)으로부터 가계가 이어져 왔다. 그후에 휘(諱)는 언상(彦祥) 관(官)은 도평의사(都評義事)가 있었다고 고려사에 나오는데 공(公)의 중조(中祖)이다.
5오세를 지나 휘(諱)는 열(說) 관(官)은 찬성(贊成)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 있었으며, 그의 증손에 이르러 휘(諱)는 승봉(承奉)인데 국가(國家)가 혁명되는 시기를 당하여 은거하고 벼슬을 하지 않으니 세상에서 의사(義士)라고 일컬었으며,
손자 휘(諱) 연생(衍生)에 이르러서는 단종조(端宗朝)에 관직(官職)이 충무시위사(忠武侍衛司) 대호군(大護軍)이고 호(號)는 돈재(遯齋)였는데 세조(世祖)가 왕위를 물려받음에 이르러 드디어 산중에 은거하여 여러번 조정(朝廷)에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시를 지어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을 스스로 맹서(盟誓)하였다.
증조의 휘(諱)는 수량(守良)이고 호(號)는 아곡(莪谷)이며 관은 우참찬(右參贊)이고 청백리(淸白吏)에 기록되고, 시호(諡號)는 정혜(貞惠)이며 하서(河西) 김문정공(金文正公)이 그의 묘비문(墓碑文)을 지었고, 조고(祖考)의 휘(諱)는 사로(思魯)이고 관은 봉사(奉事)이며, 고(考)의 휘(諱)는 언복(彦福)이고 호(號)는 학산(鶴山) 관직(官職)은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 이며 임란때 순절(殉節)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3등에 기록되었는데 그사적(事績)이 학성지에 등재되어있고,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증직(贈職)되었으며, 비(妣)는 증(贈) 정부인(貞夫人) 청하이씨(淸河李氏) 인데 부덕을 깊이 구비 하였으며, 명종 19년, 갑자(甲子- 1564)에 밀양(密陽) 신기리 집에서 공을 출생하였다. 공은 날때부터 타고난 자품이 남달리 뛰어나고 넘치어 유년시절부터 사장(師長)의 독려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성인의 기상이 있었으며 날마다 수신제가(修身齊家)하는 학문과 실천에 힘쓰고 한편으로는 널리 무예에 능통하여 다른사람보다 아주 뛰어났다.
선조 23년, 경인(庚寅-1590)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관직(官職)이 훈련원(訓鍊院) 정(正)에 이르렀고, 충효(忠孝)로서 생활의 신조로 삼았으며, 만부(萬夫)가 빼앗을 수 없는 용맹이 있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 났을 때는 부공(父公)을 따라 울산(蔚山) 소등대교(所等大橋)의 전투에서 적군(敵軍)을 토벌하였는데 대인공(大人公)이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戰死)하니,
군중(軍中)이 모두 실정하도록 울부짖고 있을때, 같은 고장의 의사(義士) 전응춘(全應春), 김흡(金洽) 박손(朴孫)등이 바야흐로 병영으로 향해가 다가 공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함께 산언덕에 임시로 매장한 뒤 같이 병영으로 달려갔다 .
대천제(大川堤) 아래 이르렀을 때 많은 적병이 들판을 뒤덮을 듯이 밀어 닥치니 공이 3의사(三義士)에게 말하기를 " 부군이 나라를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식이 부군을 위하여 죽는 일은 동일한 것이다" 하고
즉시로 적진(敵陣)에 돌격하여 들어가 수백인의 적군(敵軍) 머리를 처서 베었으나 자신도 흉폭한 적군(敵軍)의 창날끝에 찔리어 전사(戰死)하였다.
3삼의사(三義士)가 계속 하여 돌격하여 처들어 가니 적군(敵軍)의 퇴각하여 마편방(馬鞭坊)에 머물렀으므로 드디어 공(公)의 시신(屍身)을 수습하니 얼굴 모습과 기운이 아직도 살아 있는 듯 하며 노기도 아직 풀려지지 않는 것 같았다.
서로 더불어 영혼을 위로 하는 글을 지어 장사지냈으니, 그 사적(事蹟)이 울산지(蔚山誌)에 기재 되어 있으며,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헌종, 철종 양조(兩朝)에 걸쳐 고향의 군과 도에서 사림(士林)들의 공론(公論)이 드세게 일어나서, 공(公) 부자(父子)의 위대한 공적(功績)이 조정(朝廷)에 들리게 되어 윤허 하시기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충성(忠誠)과 지극한 효성(孝誠)은 높고 넓은 우주를 지탱(支撑)하고 밝은 태양을 꿰뚫을만한 하다고 하시고,
여러차례 관계를 높여 증직(贈職)이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렀고, 그후에 고향 인사들이 사당(祠堂)을 세워 공(公) 부자(父子)의 신주를 모시고 향사(享祀)지냈다. 공(公)의 묘는 울산(蔚山) 청량면 대천제(大川堤)하 자좌(子坐)의 언덕에 있으며, 배위(配位)는 증(贈) 정부인(貞夫人) 언양김씨(彦陽金氏)이고 묘는 같은 언덕에 합장되어 있다.
아들은 충윤(忠允), 충한(忠漢), 통정대부(通政大夫) 충원(忠元), 충국(忠國), 충룡(忠龍), 충준(忠俊)이며, 충윤(忠允)의 아들은 의범(義範), 의식(義植)이고, 충한(忠漢)의 아들은 진홍(震洪), 진걸(震傑), 호군(護軍-벼슬이름) 진준(震俊)이고, 여식은 차 재행(車 載行)에게 출가하였는데 열녀로서 정려가 세워졌으며, 충원(忠元)의 아들은 상정(尙貞), 치정(致貞), 무정(武貞)이고, 여식은 최 진한(崔 震漢)에게 출가하였으며, 충국(忠國)의 아들은 인상(寅相), 충룡(忠龍)의 아들은 성화(聖華)이며, 충준(忠俊)의 아들은 이백(以伯)인데 증손(曾孫)과 현손(玄孫)이하는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오호라 ! 신하(臣下)가 되어 충성(忠誠)하고 자식이되어 효성(孝誠)으로 받드는 것은, 본래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실천하여야 할 도리로서 사람마다 모두가 행하고자 하지마는 그것을 능히 행하지 못하는 자가 많은 것은 죽음을 꺼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국왕이 피난길에 오르는 국난을 당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한 오라기의 실보다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적군(敵軍)의 도전을 잠재우는 일을 신하(臣下)된 자의 꼭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몸을 빼내어 적군(敵軍)의 천만 창검 가운데 돌입하여, 국왕의 원통한 한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 분전하다가, 마침내 그 신명을 받치는 일은 범인 들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일을 실제로 행한사람은 오직 공(公) 한사람뿐이라고 하겠다.
부공(父公)은 충성(忠誠)에 죽고 자식은 효성(孝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부자(父子)의 죽음이 모두 마땅히 죽어야 할곳을 얻었으니, 가위 한 가문에서 충효(忠孝)를 나란히 온전하게 하였고 , 한 사람으로서 충효(忠孝)를 모두 구비했다고 하겠다.
그 얼마나 장대하고 그 얼마나 충렬한 일이겠느냐? 오호라 ! 위대하구나!
그 곧은 충성(忠誠)과 위대한 절개(節槪)는 오래될수록 더욱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 조정(朝廷)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 성상(聖上)의 거동하는 길에 꽹과리를 처서 포상(褒賞)없음을 원통해 하는 호소문을 올리는 후손(後孫)과 사림(士林)이 있어서, 공(公)의 부자(父子)로 하여금 성상(聖上)의 특별한 은총을 여러번 입어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이 거듭되었으며,
또한 사당(祠堂)을 지어 신위를 뫼시고 향사를 지내어 앙모하니, 이 어찌 억만세대(億萬世代)에 걸쳐 없어질수 없는 일이 아니겠으냐?
공(公)의 8 세손 재원(在源) 군이 와서 남은 문서를 보이고, 또한 분묘앞에 세우는 비문을 청하였다. 돌아 보건데 나같은 견식이 좁고 얕은 사람이 감히 아주 높고 남다른 공적(功績)에 붓을 함부로 놀릴수 없겠으나,
의기(義氣)가 격렬하게 일어나 한 말씀 드리지 않을수 없고, 또한 여러 군자들의 찬양 하는 문장의 말미에 이름을 붙여 쓸 수 있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삼가 명문(銘文)을 지어서 공적(功績)을 높이 기린다.
지나간 임진년에 섬나라 오랑캐들이 함부로 날뛰었을 때 여러 고을이 도망쳐 숨었으니,
흉폭한 창검을 어찌 대적하겠으냐?
그 때를 당하여 공(公)의 부자(父子)가 충의(忠義)로서 남부(南部)에서 일어 났다네.
부공(父公)이 먼저 하고 자식이 뒤따라서 있는 힘을 다하다가 몸이 쓰러졌다네
한 집안에서 이룩한 충효(忠孝) 두 대의는 억만년에 걸쳐 우주 가득히 빛나리라.
지나간 역사에 찾아 보더라도 누가 우열을 다툴수 있겠느냐?
꽹과리를 처서 궁문에 호소하고 사림(士林)들이 합심하여 상소문(上疏文)을 올렸네.
왕께서 순국(殉國)한일을 가상히 여겨 빛나는 부정경(副正卿) 직함 한가지로 내리셨네.
고향의 사당(祠堂)에 향불(香火)피어 오르는 것은 거룩한 훈공을 정성받쳐 사모함이라 .
냇물이 흐르는 우뚝 솟은 산에는 정의의 굳센 영혼이 잠들어 있는데.
난세를 바로잡던 장렬한 기개는 산, 긴 강 같이 영원히 추모되리라.
--- 가선대부(嘉善大夫) 부호군(副護軍) 월성(月城) 이 정효(李 廷孝) 근찬(謹撰)
44-聽水軒公 神道碑銘(청수헌공 신도비명) <원문보기☞ 원문① l 원문② l 원문③ > top
268쪽)
<풀이>
근간 학성(鶴城) 사인(士人) 박군(朴君) 병근(炳瑾)이 그의 9 대조 청수헌공(聽水軒)公)의 유적을 손수 가지고 와서 나에게 신도비 표면에 새길 글을 부탁하기에 나는 적합한 사람이 못된다고 여러번 사양하였으나 할수 없었다. 살펴보니 공(公)의 휘(諱)는 인립(仁立)이고 자(字)는 사행(士行)이며 호(號)는 청수헌(聽水軒)이다. 성은 박씨로 밀성대군(密城大君) 휘(諱) 언침(彦忱)으로부터 가계가 이어진다.
고려시대에 휘(諱)는 언상(彦祥)이고 관직(官職)은 도평의사(都評義事)를 지낸 분이 있었는데 중조(中祖)로 삼는다. 5 세를 지나 휘(諱) 열(說)이고 관직(官職)은 찬성(贊成)이며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었고, 3전하여 휘(諱) 승봉(承奉)에 이르러 고려 사직이 멸망한 때를 당하여 은거하고 벼슬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의사(義士)라고 칭송하였다.
손자인 휘(諱) 연생(衍生)에 이르러 조선(朝鮮)(祖先) 단종(端宗)조때 관직(官職)이 충무시위사(忠武侍衛沙) 대호군(大護軍)이었는데, 세조(世祖)가 단종(端宗)을 보필한다면서 정권을 마음대로 할 때 산중으로 물러 나와 살면서 조정(朝廷)에서 여라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굳게 다짐하였으니 호(號)는 돈재(遯齋)이다.
증조의 휘(諱)는 수량(守良)이고 관(官)은 우참찬(右參贊)이며 호(號)는 아곡(莪谷)이었는데 청백리(淸白吏)로 기록되었으며, 김 문정공(金文正公)이 그의 묘비명을 지었으며, 조고(祖考)의 휘(諱)는 사로(思魯)이고 관은 봉사(奉事)였고, 고(告)의 휘(諱)는 언복(彦福), 호(號)는 학산(鶴山)이며 관직(官職)은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이었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순절(殉節)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기록되고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증직(贈職)되었으며, 비(妣)는 증(贈) 정부인(貞夫人) 청하이씨(淸河李氏)인데 부덕을 두루 갖추어 부군의 내조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명종 19년, 갑자(甲子-1564)에 밀양(密陽) 신기리 집에서 공을 출생하였다. 공은 타고난 자품이 뛰어 나게 총명하고 일을 성취하려는 의기(意氣)가 북바쳐 넘치며 ,
능히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할 줄 몰라서 어른들의 독려를 기다리지 않고 글을 읽고 외우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 유소년기부터 이미 성인의 기상이 있었다. 부모를 섬기는데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알며 남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널리 무예에 통달하여 기마하는 재주와 할쏘는 솜씨가 남달리 뛰어났다.
선조23년, 경인(庚寅-1590), 27 세에 무과(武科)에 등제(登第)하여 훈련원(訓鍊院) 정(正))에 올랐고 입지를 구차하게 하지 않고 항상 충효(忠孝)를 자기의 소임으로 하여야 한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부공(父公)을 따라 울산(蔚山) 소등대교(所等大橋) 전투에서 적군(敵軍)을 토벌하였는데, 대인공(大人公)이 적군(敵軍)의 총탄에 맞은바 되어 전사(戰死)하니 군중이 몹시 놀라 울부짖었다.
그때 마침 동행의사(義士) 전 응충(全 應忠) 김 흡(金洽) 박손(朴孫)이 절도사 군영으로 향하여 가다가, 공(公)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것을 보고 공(公)과 더불어 부공(父公)의 원수를 꼭 복수할 것을 굳게 다짐한 뒤에, 염습을 하여 산 언덕에 임시로 매장하고 본영으로 함께 달려갔다. 대천제(大川堤) 아래에 이르렀을 때,
탐욕에 가득찬 많은 적군(敵軍)들이 들판을 가득 덮을 듯이 몰려오니 공이 흐르는 눈물을 씻고 분연히 일어나서 삼의사(三義士)에 말하기를
" 아비가 나라를 위하여 죽는것과 자식이 아비를 위하여 죽는 일은 그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하고, 즉시로 적진(敵陣)에 돌입하여 수백의 적군(敵軍) 머리를 베고 마침내 적군(敵軍)의 흉한 창날에 장렬히 전사(戰死)하는바 되었다.
삼의사(三義士)가 잇따라 돌진하니 적군(敵軍)은 마편방(馬鞭坊)쪽으로 후퇴하였다. 공(公)의 시신(屍身)을 수습하니 안색은 마치 살아 있는 것 같고 성난 기세는 아직도 드높이 솟아 오르는 것 같았다. 서로 의론하여 영혼을 위로하고 애석한 정을 적은 조문(弔文)을 지어 장사지냈다. 이러한 공적(功績)은 조정(朝廷)에 보고 되어 선무원종(宣武原從)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기록되었으니 양세(兩世)의 사적(事蹟)은 모두 함께 학성지(鶴城誌)에 기재되어 있다.
헌종6년, 경자(庚子-1840)에 이르러 향내 인사들이 조정(朝廷)에 호소문을 올려 충절(忠節)이 남달리 뛰어나다고 하여 처음으로 병조참의(兵曹參議)의 증직(贈職)이 내렸고. 철종 13년, 임술(壬戌-1862)에 향내와 도내(道內)의 사림(士林)들이 공(公)의 공적(功績)에 대한 포상(褒賞)이 미흡하여 원통하다는 공론(公論)이 크게 일어나 왕에게 호소하였더니, 조정(朝廷)에서는 한결같이 조금도 사심이 없는 충성(忠誠)과 지극히 순수한 효성(孝誠)은 우주를 떠바칠만한 하고 밝은 태양을 꿰뚫을만하다고 하여,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증직(贈職)을 더 높였으며,
철종 14년, 계해(癸亥-1863)에 또한 충절(忠節)이 남달리 뛰어나다고 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 겸(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 都摠官)으로 또 다시 증직(贈職)하였다. 묘지는 울산(蔚山) 청량면 대천제(大川堤) 아래 북쪽을 등지고 정남행인 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배위(配位) 증(贈) 정부인(貞夫人) 언양김씨(彦陽金氏)의 묘소도 같은 자리에 있다.
육남을 출생하였은데 충윤(忠允), 충한(忠漢), 통정대부(通政大夫) 충원(忠元), 충국(忠國), 충룡(忠龍), 충준(忠俊)의 5형제이고, 충윤(忠允)의 두 아들은 의범(義範), 의식(義植)이며, 충한(忠漢)의 세 아들은 진홍(震洪), 진걸(震傑), 호군(護軍-벼슬이름) 진준(震俊)이며, 여식은 차 재행(車 載行)에게 출가했는데 열부로서 정려가 세워졌으며, 충원(忠元)의 세 아들은 상정(尙貞), 치정(致貞), 무정(武貞)이고 딸은 최 진한(崔 震漢)에게 출가 했으며, 충국(忠國)의 아들은 인상(寅相)이고, 충룡(忠龍)의 아들은 성화(聖華)이며, 충준(忠俊)의 아들은 이백(以伯)이며 증손(曾孫), 현손(玄孫)이하는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헌종 이후로 후손(後孫)들이 언양(彦陽)으로 옮겨 살게 되었고, 사당(祠堂)도 반곡에 건립하여 위패를 모시게 되었다. 오호라! 임진의 국난이 그 얼마나 어려운 때가 아니었던가? 위로는 중흥(中興)의 군왕이 계셔서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아래로는 정승과 장수들. 그리고 여러 신하(臣下)들이 나라 안팎의 일에 몸을 받쳐 힘썼고, 의군을 일으킨 여러 신하(臣下)들은 충성(忠誠)을 다하는데 힘썼으니,
고 제봉(高 霽峰)의 삼부자(父子)와 조 문렬(趙 文烈)의 삼부자(父子) 같은 분은 적군(敵軍)의 침입을 방어(防禦)하기 위하여 머리를 나란히 함께 순절(殉節)하여 지금까지 그 빛나는 충성(忠誠)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건마는, 오직 공(公)의 부자(父子)가 펼친 의병(義兵)활동은 왜적이 침입한 해안지방이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있었던 행적이었으며,
다만 한번 공직에 임명되었을 뿐이고 그렇게 드러난 관직(官職)도 아니었으나, 어느 지방 수령의 도움이나 군영의 자그마한 군사적(事蹟) 후원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긂주린 사나운 범이 덤벼 드는 것 같은 적군(敵軍)을 방어(防禦)하다가 부공(父公)은 충성(忠誠)을 위하여 전사(戰死)하고 자식은 효성(孝誠)을 위하여 순절(殉節)하였지마는 조정(朝廷)에 그 공훈이 알려지지 못하는바 되었다.
당(唐)나라때의 유명한 안 진경(顔 眞卿) 같은 충신(忠臣)도 당시의 조정(朝廷)에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니, 국난으로 어지럽던 조정(朝廷)에서 이런 위대한 충절(忠節)을 어찌 다 알수 있었겠느냐?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조정(朝廷)에 알려진 날에 부자(父子)가 함께 판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국가(國家)에서 공훈에 보답하는 포상(褒賞) 또한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다.
하늘의 은택이 밝지 못함은 시대의 운세가 고르지 못함인가?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목숨을 기러기의 털같이 가볍게 여기고 충효(忠孝)와 큰 절의(節義)의 기세(氣勢)를 오늘날에도 바로잡아 회복하지 못하였으니 비통함을 어찌 이길수 있겠느냐? 후손(後孫)들이 이 역사에 골몰하는 것은 참으로 이유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삼가 행장에 의하여 찬문(撰文)을 쓰고 이어서 명문(銘文)을 쓴다.
<귀중한 목숨 깃털처럼 가벼히 여기며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였네.
신명을 바쳐 군왕과 부공(父公)을 모시고
황천(黃泉)에서도 은택에 보답하였네.
천세(千歲)에 이어질 가슴아픈 영예는
현귀(顯貴)한 증직(贈職)을 받아 더욱 빛나는구나.
울산(蔚山)의 청량산 기슭에는
공(公)의 유품을 묻은 묘소가 있었는데
밝게 빼어난 영묘한 혼령(魂靈)은
해와 별같이 하늘에서 빛나네
우주를 떠바칠 당당한 공적(功績)은
비석에 새겨서 후세에 전하네!
임신(壬申-1872)년 4월
통사랑(通仕郞) 권지(權知) 승문원 부정자(承文院 副正字)
---사량 후인(沙梁 后人) 최 현필(崔 鉉弼) 근찬(謹鑽)
* 편집자 주(註) -위의 사량 후인(沙梁 后人)을 충효실록 저자 박문도님의 요청에 의거 경주후인(慶州後人)으로 정정합니다.
* 편집자 주(註) - 위 청색 글씨 부분은 원문일부가 생략되고 번역문 또한 생략되어 있어서 편집자가 글에 맞게 써넣은 것입니다.
1)고 제봉(高 霽峰)... 고경명(高敬命)의 호. 조선(朝鮮) 선조(宣祖)때의 문신, 의병장(義兵將. 아들 인후(因厚)와 함께 금산 싸움에서 순절(殉節)하였고 또한 그의 아들인 종후(從侯)도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殉節)하였음.
2)조 문렬(趙 文烈)...조 헌(趙獻)의 시호(諡號). 호(號)는 중봉 조선(朝鮮)(祖先) 선조(先祖)때의 문신 학자.
의병(義兵)장. 임진왜란(壬辰倭亂)때 금산 싸움에서 칠백의사(義士) 및 아들 완기 완도와 함께 순절(殉節)하였음.
2)안 진경(顔 眞卿)...중국 당(唐) 나라의 충신(忠臣). 서예의 대가. 안 록산(安祿山)의 반란 평정에 공이 많음. 박학하고 충성(忠誠)심이 깊었으나 여러번 모함 을 받아 곤경에 빠졌으며, 반란자 이 희렬(李希烈)을 설득하려 갔다가 피살됨.
277쪽)
< 풀이>
위의 충효록(忠孝錄)은 박군(朴君) 한혁(漢赫)이 그의 선조(先祖) 양세(兩世)의 의병(義兵)을 일으켜 순절(殉節)한 사실과 증직(贈職)을 내릴 때 조정(朝廷)에 아뢰는 글과 회보가 오고 간 경위를 찾아 모아서 기록한것이다. 기록이 이미 완성되었을 때 향내의 인사들이 합의하여 그 책명을 충효록(忠孝錄)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아! 첨정공(僉正公) 부자(父子)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국사를 위하여 머리를 나란히 하여 순사(殉絲)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것이다. 다만 충성(忠誠)이라는 조목에 합당할것인데 충효(忠孝)를 함께 일컫는 것은 어째서일까? 부자(父子)가 비록 군사를 한가지로 하였으나 훈련공(訓鍊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공(父公)에 대한 복수의 대의(大義)를 함께 실행한 공(功)이 두드러져 환하고 밝게 빛났기 때문이다.
유사((遺事)를 살펴보니 첨정공(僉正公)이 소등대교(所等大橋) 아래서 갑자기 적병을 만나 역전하다가 전사(戰死)를 하고 훈련공(訓鍊公)이 시신(屍身)을 수습하여 임시로 매장을 한 뒤에 드디어 적군(敵軍)을 추격하여 대천제(大川堤)에 이르러 크게 부르짖고 적진(敵陣)중으로 돌격해 들어가 수백인을 격살하고 자신도 전사(戰死)하였으니,
오호라! 그 용맹함이 정말로 위대하구나! 왜적이 바다를 건너 침입해온 초기에 동래와 울산(蔚山)이 가장 먼저 적병의 공격을 동시에 받은바 되어,
양읍의 인사들이 의병(義兵)을 일으켜 적군(敵軍)을 토벌한 의사(義士)들이 많지 않음이 아니었지마는 부자(父子)가 국난에 순절(殉節)하여 충의(忠義)의 절개(節槪)를 빛나게 세운 사람으로 공의 부자(父子)같은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부자(父子)가 함께 싸움터에서 전사(戰死)하고 후손(後孫)들 또한 오랫동안 곤궁하여 증직(贈職)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이 오래도록 미치지 못하더니, 헌종 6년, 경자(庚子- 1840)에 본도(本道)를 감사(監司)의 회보하는 장계(狀啓)에 의하여 첨정공(僉正公)에게는 병조참판(兵曹參判)을. 훈령공(訓鍊公)에게는 좌승지(左承旨)를 증직(贈職)하였으며,
철종 14년, 계해(癸亥-1863)에 또다시 증직(贈職)을 더 높여 양세(兩世) 나란히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증직(贈職)을 내리셨으니, 국가(國家)가 충신(忠臣)의 공적에 대하여 포상(褒賞)으로 보답하고 그일을 밝게 빛내는 은전(恩典)이 이로써 유감이 없게 되었다. 한혁 군(漢赫 君)등이 그 사실의 내력과 경위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점차로 사라져 옶오질 것을 오히려 두려워 하여 이것을 책자로 편집하고 나에게 일언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내가 삼가히 받아서 정중히 살펴 보니,
당시에 충의(忠義)를 위하여 세운 공적(功績)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 경탄하여 머리터럭을 곤두세우게 할 뿐만이 아니라, 전후의 유명한 석학들이 그 종적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나의 진술(陳述)하는 문사(文辭)가 번잡하다는 말이 없이 어찌 족히 보탬이 된다고 할수 있겠는가마는, 요청이 더욱 은근하므로 간략히 몇 마디의 말을 기록함 이와 같이 권말(卷말)에 붙여 두기로 하였다.
성상즉위(聖上卽位) 2년, 을축(乙丑-1865) 맹춘(孟春)
--- 여강(驪江) 이종상(李鍾祥) 근발(謹跋)
주(註)
① 철종(哲宗)이 1863년(癸亥-계해)에 하세(下世)하여 그해 12월에 고종(高宗)이 즉위하였으니 을축(乙丑)년은 고종2년이 됨.
286쪽)
<풀이>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있어서 그것을 실천 할려는 마음이 목숨을 살리는 것 보다 더욱 심한 것과, 치욕이 가해져서 그 싫어함이 목숨을 버리는 것 보다 더한 것은 이런 일이 모든 충신(忠臣) 효자(孝子)가 분연히 일어나 자신의 안락을 돌보지 않고 모질게 날카로운 칼날을 무릅쓰고 펄펄끓는 탕안에도 두려움없이 들어가 가게하는 것이다.
임진년에 섬나라가 침입한 난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없었던 변란으로 울산(蔚山) 이남지방은 흉폭한 적군(敵軍)의 칼날과 창날의 해독을 가장먼저 또 많이 입게 되어 그지방의 수령들은 도망쳐서 숨어 버리고 여러읍성들은 한꺼번에 무너졌다.
학산박공(鶴山朴公)은 천부의 남다른 재능과 늠름한 자태로서 일찍이 그 재질을 다스리는데 힘써, 풍후(風后)의 병법과 제갈무후(諸葛武侯)의 팔진법(八陣法)을 남김 없이 두루 익혀 그 정수를 터득하였디만은 끝내 지방을 다스리는 감사(監司), 병사(兵使)나 국경을 수비하는 사령관의 직책은 맡지 못하였다.
충성(忠誠)을 위하여 앞장서 의병(義兵)을 일으키는 것은 귀천을 가리지 않으므로, 이에 눈물을 뿌리면서 말하기를 " 성상(聖上)께서 도성을 떠나 피란을 떠나셨으니 내 생명을 탐내어 구차스러운 안락을 도모 하겠느냐" 하고 드디어 의사(義士)들을 불러모아 합쳐서 의병군단(義兵軍團)을 조직하고 영솔하여 의기(義氣)로서 적진에 돌격하여 적군의 머리를 획득함이 매우 많았으나, 구원군이 없고 또한 힘이 다하여도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끌면서 오히려 도망가지 아니하고 마침내 의병장(義兵將)으로서의 불굴의 의기(義氣)를 진작하였으며,
그의 아들 청수헌공(聽水軒公) 또한 부공(父公)의 복수를 맹서(盟誓) 하고 용맹 스럽게 적진(敵陣)으로 돌입하여 여러번 공격하다가 적군(敵軍)의 창날과 화살촉을 아래 순국(殉國) 하였으니, 충효(忠孝)의 가장 중요한 인륜법도(人倫法道)가 어찌 한 집안에게만 오로지 모이게 되었단 말이냐?
이러한 사례는 옛날부터 아주 있기 어려운 일이다.
혹 읍(邑)을 나란히 하여 일어나거나 이웃 고을에서 생기더라도 오히려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경탄함이 분분할 터인데 하물며 더욱 있기 어려운 부자(父子)의 일이 있겠느냐. 대게 천지간의 순수하고 굳세며 지극히 정대한 기운은 사람이 태어날 때 부여되는 것이지마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존재하는것이며 사람이 죽더라도 함께 없어지지 않으며, 높기는 일월과 같으며, 무겁기는 산악과 같으며, 신속하기는 뇌정(雷霆) 번개와 같아서 만고에 걸쳐서 우주를 지탱하고 있으니, 이것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늘의 도리(道理)이다.
대저 공훈이 드러남과 파묻힘은 시기가 있는 법이어서 공이 몰한지 이백여년이 지나서야 조정(朝廷)에서 증직(贈職)을 내려서 포상(褒賞)하시고 고향인사들이 사당(祠堂)을 세워 향사지내며 사관이 공적(功績)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니, 이것이 말하는바 사는 것은 백세를 넘기기 어렵지마는 사후에 천추에 이름을 빛내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오호라!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무너져서 우리들이 모두 야만인의 풍속을 뒤쫓아 가고있으니, 대대로 국가(國家)의 봉록(俸祿)을 받던 신하(臣下)들이 짐슴을 끌고와서 백성을 잡아먹게하는 것 같은 학정을 하고 유교를 신봉하여 충효(忠孝)를 실천해야 할 가문의 후손(後孫)으로서, 나라의 원수를 섬기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는자 있으니, 어찌 죽어서 무덤에 가더라도 세상을 교화(敎化)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겠느냐?
생각하건데 다행하게도 충효실기(忠孝實記)를 이러한 시대에 다시 간행하게 되었으니, 족히 신하(臣下)와 자식이 된 자에게 충효(忠孝)의 인륜(人倫)을 권장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 몸소 직접 받는 영향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못난 이 사람이 이 향토에 살고 있어서 당당한 공적(功績)과 후세에 미친 교화(敎化)는 많이 들어왔지마는, 그 상세한 경위를 알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더니, 공(公)의 후손(後孫) 병근(炳瑾)씨가 행장(行狀)과 묘갈문(墓碣文)을 소매속에 넣어 가지고 왔으므로 삼가 읽어 보니,
의젓하고 위엄있는 기상이 살아 있는 것 같고 찬란(燦爛)하며, 이름난 여러 석학들이 떨쳐 나타내기를 이미 다하였으니, 다시 어찌 쓸데 없는 말을 용납할까 만은 어리석은 사람의 한 마디 말이 혹여나 가곡의 연주를 완성하는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다. 대저 인류의 후손(後孫)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길 일은 조상의 업적을 법도로 본받아 반드시 충효(忠孝) 2자를 대대로 잘 준수 하여, 그것을 쓸데없는 규범으로 만들지 말것이며 갑자기 하루 아침에 국가(國家)에 환난이 있으면 충의(忠義)에 순국(殉國)하는 일을 서로 계승하여 이 충료록(忠孝錄)에 기록을 첨가 하게 되면 공에게 있어서 영광이 어떠하겠느냐? 밀성씨(密城氏) 제군((諸君)들은 변함없이 힘써야 할 것이다.
---임신(壬申-1932) 중춘(仲春) 학성(鶴城) 이 운락(李 雲洛) 근발(謹跋)
주(註)
① 풍후악기(風后握記)- 황제때의 정승 풍후(風后)가 지은 병서(兵書)
② 무후팔진(武侯八陣)- 제갈량(諸葛亮)의 8진법(八陣法)
290쪽)
< 풀이>
오호라! 이 책은 우리 선조(先祖) 이신 학산부군(鶴山府君) 및 청수헌부군(聽水軒府君)
양세(兩世)의 충효록(忠孝綠)이다.
옛날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 영남지방에서 의병(義兵)을 일으킨 의사(義士)가 손가락을 꼽아 셀수 없을만큼 많았는데 우리 선조(先祖) 양세(兩世)도 EH한 여기에 참여 하셨다.
못나고 어리석은 이 후손(後孫)이 도에 지나치는 말로 감히 찬양하여 드러낼수는 없겠지마는, 다만 충효(忠孝) 두 글자를 생각하여 보니 이일은 우리가문의 교훈으로 전래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대에는 위대한 업적을 쌓은 선조(先祖)와 충의(忠義)에 빛나는 조상들이 충효(忠孝)의 사상을 깨우쳐 진작시켰고, 근대에는 돈재(遯齋) 할아버지와 아곡(莪谷) 할아버지의 사적(事蹟)이 후세에 아름다운 명성으로 남아 있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승된 충효(忠孝)의 정신은 마치 차가운 맑은 물에 밝은 가을달이 비치듯하여,
그 남기신 은덕의 빛이 미치어 본받은자가 오래될수록 더욱 밝게 빛났다. 국가(國家)가 무사태평할 때 관직(官職)에 나아가 현명하고 선량한 명신이 되고 또한 청렴결백한 관리가 되었으며,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환난을 당하였을 당하였을 때는 충신(忠臣)이 되고 효자(孝子)가 되었으니, 소등대교(所等大橋)에서의 싸움과 대천제하(大川堤下)에서의 전투에서 오직 군왕과 부공(父公)이 계심을 알뿐이고, 그 자신의 목숨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죽음을 마치 본가에 돌아 가듯 하였으니,
아아! 성대한 공적(功績)이 구나!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공적(功績)이 드러나고 혹은 감추어지는 것은 시기가 있어서, 200 여년 뒤에 와서야 자손들이 꽹과리를 두드리고 향읍(鄕邑)과 본도(本道)의 인사들이 일제히 호소문을 올리니, 조정(朝廷)에서는 증직(贈職)으로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을 내려주시고, 향읍(鄕邑)의 사림(士林)들은 사당(祠堂)을 세워 봉사(奉事)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으니, 양세(兩世)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던 공적(功績)과 가리워져 있던 덕망이 이제야 대략이나마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선세(先世)의 위대한 공적(功績)이 기재되어 있는 읍지(邑誌)와 선무록(宣武錄) 및 여러 군자들의 시(詩) 혹은 문장들을 모아서 충효록(忠孝錄)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참고하여 증거(證據)로 삼을만 하나, 향내의 인사들이 그 기록이 널리 나누어지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계(契)를 조직하고 자금을 모아 중간(重刊)의 비용을 보조하기에, 불초(不肖)가 족제(族弟) 병근(炳瑾) 더불어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유적을 다시 상세히 고찰하고,
또한 당세 여러 현사의 문장을 구하여 책으로 함께 편찬하여 곧 출판에 부쳐 널리 세상에 나누어 펴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못난 저희들의 능히 감당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여러 현사들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추진한 결과이니, 그 경위를 기록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감히 몇마디 말씀을 부기 한다.
만력(萬曆) 기원후(紀元后) 6년 임신(壬申-1932) 초하(初夏)
--- 후손(後孫) 기태(基泰) 관수( 盥手) 근서(謹書)
* 跋(발) -3 * 跋(발) -2 <원문보기☞ 원문① >
292쪽)
< 풀이>
명예와 절개(節槪)를 태산보다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마음 씀이 강직하고,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의 깃털보다 가엽게 여기는 사람은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용감해지는 것이다. 오호라! 우리 선조(先祖) 학산부군(鶴山府君)은 타고난 자품이 영특하고 의지가 굳세었으며, 춘추의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근본정신을 깊이 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근본정신을 깊이 강구(講究)하고,
손오(孫吳)의 병법에서의 정공법(正功法)과 기습공격하는 여러 가지 용병술을 연구하여, 일찍부터 국사를 근심하고 세상의 잘못됨을 바로잡아 충효(忠孝)의 미풍양속을 확립할려는 큰 뜻이 있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함에 미처서는 앞장서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1여단(一旅團)의 무리를 이끌고 기세를 떨치면서 공격해 오는 수많은 적군(敵軍)에 대항하여 진격하니 몇 차례나 적군(敵軍)을 물리쳐서 점차로 국토를 회복할 기미가 있는 것 같더니 그 어찌하랴?
수양성(首陽城)에서 반란군(叛亂軍)을 막아서 국토를 보존할려고 하였으나, 홀연히 상산성(常山城)이 무너져 마치 늙은 태수(泰守)가 생명을 버렸던 일과 비슷하게 되어서 오랜 후일까지도 지사들로 하여금 한 많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게 할뿐이다. 청수헌공(聽水軒公)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孝誠)스럽고 병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지식 그리고 웅장한 계책(計策)이었다.
맹서(盟誓)하기를 적과 더불어 같은 하늘을 머리 위에 일 수 없다며, 적과 더불어 같은 국토에 살 수 없다고 하여 드디어 여러 의사(義士)를 따라 온갖 곤난을 다 겪으면서 힘을 다하여 쉬지 않고 적군(敵軍)과 싸워 임금과 부공(父公)의 큰 원수를 장차 갚고 큰 공훈을 장차 세울려고 하였으니 국난에 임하여 구차히 피하는 것은 그의 본뜻이 아니었으며 굳은 결의는 불의에 굽히지 않았다.
대저 부자(父子)가 함께 충효(忠孝)의 이대인륜(理大人倫)을 완전하게 수행한 사적(事蹟)은 지나간 기록에도 아주 드물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이니,
오호라! 우주간에 인륜(人倫)이 타락하지 않은 참된 사례라 하겠다. 조정(朝廷)에서는 아주 높은 판서의 관작을 증직(贈職)하시고 사림(士林)에서는 반곡의 사당(祠堂)에서 향사를 지내니 드러나지 않던 거룩한 공적(功績)에 대한 숭상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그러나 조정(朝廷)에 진정하는 사람이 없어 아직도 시호(諡號)를 내려주는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다. 부군(府君)의 몰(歿)하신지가 지금으로부터 이미 삼백여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그동안에 가문이 여러번의 심한 변동을 겪게 되어 임진왜란(壬辰倭亂)때의 고적으로서 근근히 보존된 것이, 다만 선세가 편집한 충효록(忠孝錄) 일부 뿐이고,
그런데도 오히려 미비한 곳이 있으므로, 사종형(四從兄) 기태씨(基泰氏)와 족제(族弟) 병근군(炳瑾 君)이 선인들의 기록한 것을 널리 모으고, 당세제현(當世諸賢) 들의 지은 글들을 합하여 한 질의 책으로 만들어 출판에 부쳐, 오랜 세월에 걸쳐 후세에 전하고자 도모하니 불초한 이사람으로 무슨 군더더기 말을 더할수 있겠는가마는, 지금 세태를 돌아보니 새로운 사상의 흐름이 나날이 사람의 도리를 문란케 하여, 가장 으뜸이 되는 인륜(人倫)을 크게 파괴하여 거의 그것이 멸망될 지경에 이르렀다.
아!슬프다! 혜성이 나타난 뒤에야 일월이 더욱 빛남을 알 수 있고, 쑥의 향기를 맡은 연후에야 지초(芝草)와 난초가 더욱향기로움을 알수 있듯이, 소인들이 있은 연후에 군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유익한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능히 높은 충절(忠節)과 위대한 행적을 보고 들으면 혹 가히 민심을 유지하고 퇴폐한 풍속을 격려할 수 있을른지 모르겠다.
고금의 후사자손(後嗣子孫)들을 차례대로 두루 살펴 보니 그 조상이 이룩한 업적을 보존하여 지키는 자 드물다. 중국의 한말(漢末)에 순씨가문(荀氏家門)의 현명함으로는 오히려 조 조(曹操)를 가까이 따라서 한나라를 배반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니, 하물며 나같은 불초가 마땅히 거울로 삼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매사에 조심하여 마치 깊은 소에 다다른 듯, 얇은 어름을 밟듯이 하고,
깊은 골짜기의 칡덩굴을 찾아서 그 왕성하게 뻗어 나감을 보고 자손들의 번성을 생각하며, 위공(衛公)이 가업을 이어갈 것을 생각하듯이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가훈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조상의 은공에 보답하는 대의에 욕되지 않도록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임신(壬申-1932) 4월 중순(中旬)
--- 후손(後孫) 동하(東夏) 근서(謹書)
①수양(首陽)...지명, 중국 당 현종때 일어난 안 녹산(安錄山)의 반란을 장순(張巡), 허원(許遠)등이 이곳에서 방어(防禦)하여 강소(江蘇), 안휘(安徽) 지방을 보전하였음.
②상산(常山)...지명 중궁 당 현종때 상산태수(常山太守) 안 고경(顔杲卿)이 역적 안 녹산(安錄山)을 끝까지 꾸짖다가 순절(殉節)하였음.
③순씨(荀氏)...순 욱(荀彧)등 후한(後漢)의 신하(臣下)들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조 조(曹操)를 도운 일.
④위공(衛公)...중국 주(周) 나라 때의 위무공(衛武公)은 나이 구십이 넘었는데도 조상의 기업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힘썼다고 함.
297쪽)
< 풀이>
천하에서 마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으니 물질적 욕심도 이것을 빼앗을수 없고, 위력이나 은혜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천길이나 되는 높은 낭떠러지 같이 우뚝 서있으며 가을 날의 서릿발 같이 차갑고 여름 날의 강렬한 햇빛같이 뜨겁게 빛나는 자는 천지가 억만번 개벽(開闢)하는 오랜 세월을 지나더라도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하므로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 보고 그의 공적(功績)을 추모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이다. 오호라! 야만족이 나라를 몹시 어지럽힐 때 임금은 서울을 떠나 피란가고 군현(君縣)은 연달아 무너졌으니, 비록 지방을 지키는 군대의 사령관이나 감사(監司), 부사(府使), 군수(郡守)같은 지방장관이라도 자신의 목숨을 받치는 자가 드물었는데, 단지 훈련원(訓鍊院)의 직위에 있었던 관원으로서 다만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자신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무기를 잡고 뚜어 나가니 온 몸안의 피가 충성(忠誠)심으로 들끓고, 대의를 위한 기개(氣槪)가 하늘에 가득차서 힘을 다해 적군(敵軍)을 토벌하여,
싸움터인 진영(陣營)과 보루에서 여러번 승리를 거두고, 의군의 명성이 크게 떨치어 적장의 간담을 찢어 놓으니, 국토를 회복하는 일을 손꼽아 기대 할수 있었는데, 하늘도 무심함인가?
중국의 오장원(五丈原)에서 별빛이 급히 떨어지듯 제갈 량(諸葛 亮)이 한(漢) 나라를 부흥하는 대업을 이룩하지 못한 채로 사몰하니 천리에 뻗어 있던 굳은 성들도 드디어 텅 비게 되었던 고사와 비슷하다. 웅장한 뜻은 굳었으나 몸은 죽으니 남겨진 원한이 한결같이 슬피 맺혀서 언제나 영웅들로 하여금 옷깃 가득히 눈물을 뿌리게 하는구나!
" 대저 충효(忠孝)에는 두 가지 이치가 없는 법이어서 부공(父公)이 이미 충성(忠誠)에 순절(殉節)하였는데 자식이 어찌 효성(孝誠)에 순사(殉死)하지 않겠느냐? " 이렇게 마음에 맹서(盟誓)하고 적진(敵陣)에 돌격하여 무수히 적군(敵軍)을 무찔렀으나, 운세가 가고 기력이 다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대의를 취한 사람은 바로 우리 선조(先祖) 학산부군(鶴山府君) 부자(父子)이시다.
만고에 지켜야 할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을 빛나게 한 공적(功績)이 그 얼마나 위대하며 또한 성대한가? 이러게 능력이 갖추어진 것은 대저 그 근본이 있는 법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상(聖上)께서 확고하게 세운 교화의 은택을 심신에 젖어 들도록 받았으며, 가정에서의 인의(仁義)의 교훈을 이어 받아 오로지 무엇이 국가(國家) 사회에 더욱 유익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오랜 세월 동안 수양을 쌓아서 특출한 정신과 재능이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하므로 변화에 응하여도 근본정신에는 서로 어긋남이 없어서 일월로 더불어 빛남을 다투게 도니, 앞에 말한바 물질적 용망이 충성심(忠誠心)을 빼앗을 수 없고, 위력을 두려워 하지 않고 사사로운 은혜에도 굴복하지 않음이 아니겠느냐? 옛날 장 순(張巡)과 태수 허원(許遠)의 수양성(首陽城)에서의 순절(殉節)은 그 공훈과 용감한 절개(節槪)가 높이 뛰어남이 의심 할바 없지만은,
오히려 우세에 성하게 전하여지지 않고 한 창려(韓昌藜)가 그 전기를 기술한 후에 이르러 그 명성이 더욱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애석하구나! 지금의 세상에 어찌 다시 창려(昌藜)의 문장을 얻을수 있겠으며, 더불어 장씨와 허씨의 명성이 나란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음과 같은 일을 또다시 얻을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라에서 충신(忠臣)의 정려를 세워 표창(表彰)하고 증직(贈職)의 은전(恩典)으로 내려주신 관직(官職)의 높은 품계(品階)는 빛남을 다하였고 사당(祠堂)에서의 향사와 역사에서의 기록이 유림(儒林)의 신사들에 의하여 공적(功績)이 모두 환하게 드러났으니, 어찌 다시 성상(聖上)께서 사당(祠堂)의 명칭을 지어 현액을 주시는 일과 공신(功臣)의 시호(諡號)를 내려주시는 은전(恩典)이 없음을 개탄하겠느냐?
오호라! 부군(府君)의 세대가 오래 되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만한 꽃다운 사적(事蹟)은 없어지고, 비석과 근거가 될 서책(徐冊)들도 홀연히 없어져서 당시의 문서와 사적(事蹟)들은 모두 없어지니, 마치 중국의 기(杞)나라와 송(宋)나라에서 하(荷)나라와 은((殷)나라의 역사와 유적을 찾아 볼수 없는것과 같이 되었으며 이것은 후손(後孫)들의 고독하고 못난 허물 때문이다.
이에 두려워하고 깊이 느끼는바 있어 모든 후손(後孫)들이 한가지로 정성을 다하고 협력하여 여러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일기(日記)와 기록물과 울주(蔚州))의 역사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수집하고, 아울러 행장(行狀)과 묘갈문(墓碣文), 서문(序文)과 발문(跋文)등을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깃털의 한쌍 중의 한 쪽과 고기의 한 토막과 같아서 완전하지 못하니 어찌 백세의 뒤에라도 유감이 없을것이라고 하겠느냐?
다만 생각하기를 이 한 질(帙)의 서책(徐冊)이 세상에 행하여져서 말세의 풍속을 바로잡도록 갈고 닦아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어버이와 군왕을 섬기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게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 감히 정도에 지나친 말과 근거 없이 꾸며낸 말로 훌륭한 경계의 말을 남긴 군자에게 거듭 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임신(壬申-1932) 4월 16일
--- 후손(後孫) 병기(炳琦) 근서(謹叙)
①기송(杞宋)...중국 주(周)나라 때의 나라 이름. 주(周) 무왕(武王)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하우(夏禹)의 후손(後孫)인 동루공(東樓公)을 봉하여
우왕(禹王)의 제사(祭祀)를 받들게 한 것이 기(杞)나라이고, 미자 계(微子 啓)를 송(宋)에 봉하여 은 왕실(殷王室)의 제사(祭祀)를 받을게 하였음.
303쪽) --- 후기(後記)
< 풀이>
우리 선조(先祖) 양세(兩世)의 높은 충성(忠誠)과 탁월한 효성(孝誠)은 임진 훈권(勳卷)과 학성주지(鶴城州誌)에 이미 기재되어 있으며, 조정(朝廷)의 포상(褒賞)과 이름난 관원들의 충절(忠節)을 기리는 문장과 여러 선비들의 공적(功績)을 드러나게 한 글은 백세에 환하게 빛나고, 또한 먼저 편집한 충효(忠孝)록이 있으니 소자가 무슨 더할 말이 있겠느냐?
그러나 먼저번 책자에 혹 빠진 것이 있고, 또한 널리 반포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상 중간(重刊) 할 일을 마음쓰고 있었다. 지난 신미(辛米)년 겨울에 족형 (族兄) 기태씨(基泰氏)가 눈속을 무릅쓰고 와서 나에게 위촉하기를 " 그대가 선록(先錄) 중간(重刊)에 있어서 시종 힘써주지 않겠느냐? " 하기에 단정히 꿇어앉아 그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물러나와,
여러 현사들의 서술을 모으고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널리 세상에 나누어 펴서 오래오래 전하여지기를 도모 하였으니,
비단 감히 이로써 사적(事蹟)을 기술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先祖) 양세(兩世)의 충효단심(忠孝丹心)이 끼친 향기가 이에 힘입어 사라지지 않는다면 혹 선인에 대한 죄를 조금은 면할수 있을 것인가?
임신(壬申-1932) 4월 하한(下澣)
--- 후손(後孫) 병근(炳瑾) 관수( 盥手) 근식(謹識)
304쪽)
<풀이>
조선(朝鮮) 헌종(憲宗) 6년, 경자(庚子-1840) 언양면(彦陽面) 반곡리(盤谷里)에 반곡사(盤谷祠)를 건립하여 봉향(奉享)하다가, 고종(高宗) 5년, 무진(戊辰- 1868) 철폐령에 의하여 반곡사우(盤谷祀宇)를 철훼하니 봉향(奉享)이 겨우 26 년에 그쳤다.
광복후 병인(丙寅-1986)에 현소재지 상북면 길천리(上北面 吉川里)에 후손(後孫)들의 정성으로 사우(祀宇)를 중건(重建) 하였으니,
이곳은 선무원종(宣武原從) 훈3등(勳三等) 증(贈)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 밀양박공(密陽朴公) 휘(諱) 언복(彦福) 호(號) 학산(鶴山)과 공(公)의 영사(令嗣) 즉, 훈(勳) 1등(一等) 증(贈)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 휘(諱) 인립(仁立) 호(號) 청수헌(聽水軒)의 양세(兩世)를 봉향(奉享)하는 사당(祠堂)이다.
주(註)
①글의 흐름으로 보아 시환(時患)은 고종(高宗) 동치(同治) 7년, 무진(戊辰-1868)에 일어난 사우(祀宇) 철폐령을 뜻하므로, 철종조(哲宗朝)는 고종조 (高宗朝)의 착오인 듯.
②병진(丙辰)은 병인(丙寅)의 착오인 듯?
307쪽)
<풀이 >
밀양박공(密陽朴公) 휘(諱) 언복(彦福) 자(字) 이겸(而謙) 호(號) 학산(鶴山)은 가정(嘉靖) 명종5년, 경술(庚戌-1550)에 출생하였다.
손조 17년, 갑신(甲申-1584) 35 세에 관직(官職)이 훈련원(訓鍊院) 첨정(僉正) 이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아들 인립(仁立)과 함께 의병(義兵)을 모아 동남쪽의 적군(敵軍)을 방어(防禦) 하니 그 의병(義兵)의 기세와 명성이 크게 떨쳤다.
이때 홍의장군(紅衣將軍) 곽 재우(郭再佑)가 공이 오백의 용사들을 불러모아 의병(義兵)대를 조직하여 거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부탁하기를
" 동해연변의 주군(州君)이 적에 함락되고 적군이 깊숙한 곳까지 침입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제 존장(尊丈)께서 신명을 받쳐 적군(敵軍)을 토벌하여 명쾌하게 소탕할 것을 기약한다고 하니, 장군께서는 힘을 다하여 적군(敵軍)과 싸워 끝까지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고 하였다.
공(公)이 이 서신을 정하여 받고 맹서(盟誓) 하기를 "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함께 목숨을 바칠것이고 전투에 승리한다면 반드시 북쪽의 충청, 경기로 나아가 임금님께 신명을 받쳐 왜적을 토벌하여 승라할 것을 아뢸 것이다" 하고 바로 적진(敵陣)으로 뛰어 들어가 좌우로 충돌하니, 마치 풀줄기를 베어 내는 것 같이 적군(敵軍) 수백명을 참수하고 날카로운 기세가 더욱 장성(長盛)하여 사방을 마음대로 내달으니, 적이 그 뛰어난 용맹을 보고 놀라 바야흐로 흩어져 달아날 때,
홀연히 적의 유탄에 맞아 마침내 진중에서 순사(殉死)하여 아들 인립(仁立)과 함께 동향(同享) 의사(義士) 들이 시신(屍身)을 수습하여 산 언덕에 가매장(假埋葬)하였다. 선무원종(宣武原從) 3등공신(三等功臣)에 올랐고, 헌종 6년 경자(庚子-1840)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의 증직(贈職)이 내렸으며, 철종 때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 겸(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使) 오위도총부(五位都摠府) 도총관(都摠館)으로 증직(贈職)이 높여졌으며,
휘(諱) 인립(仁立) 자(字) 사행(士行) 호(號) 청수헌(聽水軒)은 언복(彦福)의 아들인데, 선조 23년, 경인(庚寅-1590) 무과(武科)에 올라 관직(官職)은 훈련원(訓鍊院) 정(正)이고 충효(忠孝)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으며 만 사람으로 빼앗을수 없는 용기가 있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는 부공(父公)을 따라 적군(敵軍)을 토벌하였는데, 대인공(大人公)이 적의 포탄으로 순사(殉死) 하여 모든 군사들이 실성하도록 울부짖고 있을 때, 의사(義士) 김응충(金應忠) 김흡(金洽) 박손(朴孫)이 병영으로 가다가 공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 더불어 산언덕에 가매장(假埋葬)을 한뒤 함께 병영으로 향해갔다.
대천제(大川堤) 아래 이르렀을때 적의 대부대가 들판을 덮을 듯이 몰려 오는 것을 보고 공이 삼의사(三義士)(義士)에게 말하기를 " 아비가 나라를 위하여 전사(戰死)하는것과 자식이 아비를 위해 죽는 것은 인륜(人倫)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절의(節義) 이다" 하고 적진(敵陣)에 돌격해 들어가 수백의 적병을 베었으나 또한 자신도 상해를 입어 애석하게도 전사(戰死)하였다 .
삼의사(三義士)(義士)가 계속 돌진하여 적을 격퇴하고 공(公)의 시신을 수습하니 얼굴빛은 살아 있는 것 같고 노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문(弔文)을 지어 장사지내니 그것을 요약하면 "아! 슬프고 장렬하도다! 생각컨대 공(公)의 부자(父子)는 어제는 충성(忠誠)으로 순국(殉國)하고 오늘은 효(孝)를 위해 순절(殉節)하였구나! 한손에 칼을 뽑아 들어 대지에 맹서(盟誓)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니 열렬한 그 기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러한 사적(事績)은 망우당(忘憂堂) 곽선생(郭先生)의 동고록(同苦錄)에 기재 되어 있다. 선무원종(宣武原從) 1등공신(一等功臣)에 오르고,
헌종 6년, 경자(庚子-1840) 통정대부(通政大夫) 좌승지(左承旨) 겸(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에 증직(贈職) 되었으며, 철종 13년, 임술(壬戌-1862)에 병조참판(兵曹參判), 계해(癸亥-1863)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 겸(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使) 오위도총부(五位都摠府) 도총관 (都摠館)으로 다시 높여 증직(贈職)되고, 한결같은 충성(忠誠)과 순수한 효성(孝誠)은 우주를 떠받쳐 지탱 하고 태양을 꿰뚫을만하다고 국왕께서 인정하셨다.
휘의 모든 사실은 - 창의일기(倡義日記), 선무원종공신록(宣武原從功臣錄), 이조첩문(吏曹牒文), 증첩등본(贈牒謄本)은 박씨충효록(朴氏忠孝錄) 등에 기록(記錄) 되어있다.
50-忠孝祠 崇義堂 上樑文(충효사 숭의당 상량문) <원문보기☞ 원문① > top
312)
<풀이>
선조(先祖)를 위하는 사당(祠堂)을 지어 정성껏 받드는 일은 하늘이 밝힌 인륜(人倫)으로서 곧 자손된 자가 선대조상을 추모하는 뜻이 있으며,
또한 세인들의 도덕성을 순후하게 하는 길이고, 도덕(道德) 충의(忠義) 절개(節槪)와 지조(志操)를 지키는 행실을 추앙하여 높이 공경하는 것은,
모든사람의 본연의 천성에서 그러한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건데 학산(鶴山) 밀양박공(密陽朴公) 증(贈) 병판(兵判) 겸(兼) 오위도총(五衛都摠) 부자(父子) 양세(兩世)가 임란(壬亂)에 순국(殉國)한 충절(忠節)을 역사가 전해주니 " 백세를 사는사람은 없었으나 죽어서 천세를 누리는 사람은 있다" 고 말할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다 .
부공(父公)은 나라 위해 목숨 바치고 자식은 효(孝)를 위하여 순사(殉死)한 사적(事蹟)은 나라에서 포상(褒賞)하여 벼슬을 내리고 선무공훈록(宣武功勳錄)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니 ,
그 나라위한 순절(殉節)은 어찌 경모치기 않으리요? 더 말을 보탤 필요가 없는 일이다. 다만 이 사당(祠堂)의 내력은 양세(兩世)의 충절(忠節)을 높이 우러러 받들기 위하여, 헌종 경자(庚子-1840)에 후손(後孫)들과 사림(士林)들이 의론을 모아 언양(彦陽) 반곡에 처음으로 사우(祀宇)를 세우고 양세(兩世)를 향사(享祀)하였는데, 28년 후에 불행히도 나라의 말기를 당하여 고종 무진(戊辰-1868)에 나라의 명령으로 철폐(撤廢)하니 후손(後孫)과 지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슬퍼하였다.
그후 목욕재계 하여 정성을 드릴 집이 없고 사당(祠堂)의 편액(扁額)을 걸어 둘 곳이 없어서 향사(享祀)를 오래도록 올리지 못함을 모두가 탄식(嘆息)하고 있었는데, 후손(後孫)들이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로 논의가 한가지로 합쳐져서, 이제 새로운 기지(基地)에 다시 사당(祠堂)을 세우게 되었다.
장소가 매우 마땅하고 기반이 튼튼하며 기둥과 서깨래가 잘 갖추어져서 아름답고 높이 우뚝 솟아 훌륭한 구조이다. 충효사(忠孝祠)와 숭의당(崇義堂) 두가지 편액(扁額)을 높이 걸어 다니, 인륜(人倫)의 떳떳한 도리가 해이해지고 번잡한 세상에 드물게 보는 성대한 사업이다.
오직 바라기를 상량(上樑)한 뒤에는 사당(祠堂)이 영원히 보존되어 현판(懸板)이 찬란히 빛나고 향(香)피우고 제사(祭祀)를 바듬이 이 세상과 함께 무궁(無窮) 하옵소서!
광복후 병인(丙寅-1986) 12월 15일
--- 후학(後學) 경주 김지환(金知煥) 근식(謹識)
315쪽)
<풀이>
옛부터 국가(國家)가 위급한 전란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구제하는 일은 신민의 충의(忠義)에 의뢰하게 되나 충절(忠節)을 다하는 것은 생명을 버리고 절의(節義)를 취하는 인륜(人倫)의 중대한 일이니 어찌 쉽게 얻을수 있으리요?
장하다 ! 학산(鶴山) 밀양박공(密陽朴公) 양세(兩世)의 충효(忠孝)를 아울러 완전히 실천하였음은 진실로 인륜(人倫)을 붙들어 세움이고 백세의 모범이 되는 일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국토산천이 뒤흔들리고 울주전역(蔚州全域)이 적침의 요충지점이 되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참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공(公)의 부자(父子)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의병(義兵)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아온 가문의 후손(後孫)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충의(忠義)에 목숨받치는 것은 신민의 가장 중대한 절의(節義)라 하였으니 뛰어난 충렬은 칼날같이 시퍼렇게 빛났다.
바로 적진(敵陣)에 돌격하여 용감히 적군(敵軍)을 격살하여 적군(敵軍)의 진로를 방어(防禦)하다가 갑자기 적탄에 맞아 전사(戰死)하였다.
아들 청수헌공(聽水軒公)이 부공(父公)의 시신(屍身)을 끌어 안고 통곡하며 부공(父公)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쳤다 하고 가매장(假埋葬)을 한 뒤 익일(翌日)에 이를 갈고 피를 뿜으면서 적진(敵陣)에 돌격하여 처들어가 " 왜놈 도적들은 나를 아느냐? 바로 어제 충절(忠節)에 목숨바친 분의 아들이다 나의 가슴 속에 깊이 맺힌 원수를 갚을려고 하니 속히 나와 나의 칼을 받아라" 고
크게 부르짖고 무수히 찔러 죽였으나 자신도 또한 부상을 당하여 마침내 부공(父公)이 전사(戰死)한 것과 마찬가지로 순사(殉死)하였으니, 아비는 충성(忠誠)을 위하여 죽고 자식은 효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그 중 한가지를 실천하는 일도 또한 어려운데 한 집안에서 츙효(忠孝) 두 가지를 다하였으니 어찌 존경하고 숭배 하지 않으리요 ?
나라에서 내리신 은전(恩典)은 전국의 방방곡곡(坊坊曲曲)에 찬란히 빛나고, 주군(州君)과 향리(鄕里)에서 받들어 높인지가 오래되어 사림과 백성들이 모두 감복칭찬(感服稱讚)하던 바이다. 고향 사람들과 후손(後孫)들이 의론하고 협력하여 철조 6년, 갑자(甲者-1840)에 반곡사(盤谷祠)를 창건하여 향화를 피워 제사(祭祀)를 받들게 되니 비단 한 향리의 좋은 사업으로만 끝날 일 이겠느냐?
그러나 고종, 무진(戊辰-1868)에 국명(國命)으로 사당을 철훼(撤毁)하니 향사(香祀)를 받든지가 불과 28 년이었다. 그 후로 정성을 드릴 곳이 없어 모두가 다시 사당(祠堂)을 세워 존경하고 봉사하여야 한다고 의론하여, 후손(後孫)들이 여러 해 동안 마음 아파하고 또한 정성을 다하여 지난해 가을에 이곳 좋은 자리에 다시 사우(祀宇)를 세우고 함께 재실을 지으니, 그 규모가 화려 하고 웅장하여 행인들도 이 재실을 가리키면서 임진왜란(壬辰倭亂)에 대하여 분개하는 마음을 거듭 일으키고 있다.
여러 현사(賢士)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문(記文)을 나에게 부탁 하였으나, 공(公)의 양세(兩世) 행적이 임진훈권(壬辰勳卷), 충효록(忠孝錄), 언울지(彦蔚誌)에 상세히 기록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니 무슨더할 말이 있겠느냐?
다만 사우(祀宇)의 중건(重建)한 내력을 간략히 기록하고 지붕 위의 푸른 기와가 일월(日月)과 같이 오래 빛나며 사당(祠堂)이 영원히 보존되어 향화(享火)와 헌작(獻酌)이 끊이는 일이 없이 이 재실(齋室)에 오르는 사람은 강상(綱常)을 꼭 지키도록 서로 권장(勸奬)하여 예속(禮俗)이 더욱 두터히 실천 되기를 바라며 사양치 못하여 이와 같이 기록(記錄)하는 바이다.
광복후 정묘(丁卯-1987) 2월 경칩일(警蟄日)
--- 계림(鷄林) 김지환(金知煥) 근서(謹書)
서기 2000년 06월 05일 인쇄
서기 2000년 06월 15일 발행
발행인 -밀성박씨 학산공파 종친회(密城朴氏 鶴山公派 宗親會)
원문번역 - 안 병표(安 秉杓)
편집감리 - 박 형구(朴 亨求)
인쇄제본 - 현대기획인쇄(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36-14)
대표 김 규창 (052-273-9339)
<정오표 추가>
|
페이지 번호 |
잘못됨 |
바로잡음 |
페이지 번호 |
잘못됨 |
바로잡음 |
|
16면 01 하 |
大川堤(대천제) |
소등대교(所等大橋) |
20면 11 상 |
史曹 |
吏曹 |
|
21면 01 상 |
史曹 |
吏曹 |
44면 10 상 |
수양태수( 陽太守) |
수양태수(首 陽太守) |
|
213 면 19 상 |
全 麟厚(인후) |
金 麟厚(김 인후) |
219 11 중 |
육금(六鈐) |
육검(六鈐) |
|
230 면 07 하 |
慶州后人 |
沙梁后人 |
246 면 06 중 |
崔 慶漢(최 경한) |
崔 震漢(최 진한) |
|
255 면 13 상 |
海 錄(해사록) |
海槎錄(해사록) |
262 면 02 중 |
支 (지탱) |
지탱(支撑) |
|
268 면 04 하 |
以銘曰~ |
以銘曰~글이 한 줄 빠진듯? |
274 면 17 상 |
쓴다.~ |
쓴다.~글이 한 줄 빠진듯? |
|
288 면 03 상 |
도리(道理)리다, |
도리(道理)이다, |
289 면 06 하 |
(燦爛)한 무 이름난 |
(燦爛)하며. 이름난 |
|
290 면 02 중 |
제갈량⑦諸葛亮⑧의 팔진법⑦八陣法⑧ |
제갈량(諸葛亮)의 팔진법(八陣法) |
290 면 07 중 |
의사( )義士(가 손가락 |
의사(義士)가 손가락 |
|
292 면 09 하 |
壬辰(1932) |
壬申(1932) |
296 면 08 중 |
안 고경(顔 卿) |
안 고경(顔 杲卿) |
|
304 면10 하 |
盤谷祀宇 |
반곡사우(盤谷祀宇) |
|
|
|
|
|
|
|
|
|
|
|
|
|
|
|
|
|
The- End
![]()
Copyright(c) 밀성(밀양))박씨 돈재공파
All
rights reserved. ![]() mail
to webmaster.
mail
to webmaster.